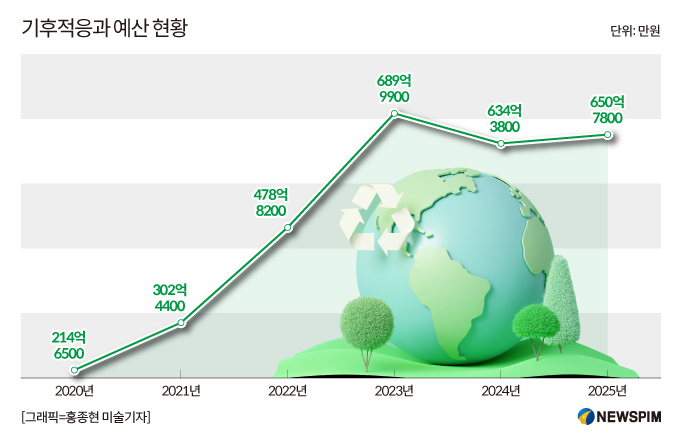[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전 세계적인 수은 배출 억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대기 중 수은 농도가 약 7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톈진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연구소 연구팀은 과학 저널 ACS ES&T Air에 게재한 논문에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주변 고지대의 식물 잎을 분석해 1982년부터의 대기 중 수은 농도 변화를 추적했다. 연구에 사용된 식물은 해발 고도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인 안드로사세 타페테로, 나무의 나이테처럼 매년 새 잎을 형성해 당시의 대기 환경을 기록한다.
이번 연구의 책임 저자인 유동통 박사는 “세계 최고봉 인근에서 40년에 걸친 수은 오염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주로 화석연료 연소, 폐기물 소각, 금속 채굴 등의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며, 메틸수은 형태로 존재할 경우 인체에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2013년 채택된 ‘미나마타 협약’을 포함해 수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국제 규제가 시행돼 왔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대기 중 원소 수은 농도는 70% 감소했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신규 수은 배출보다 토양 등 자연 저장소에서의 재배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토양 등에서의 재배출은 전체 수은 배출량의 약 62%를 차지하며, 인간 활동에서 유래한 수은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식물 잎의 수은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대기 중 수은의 뚜렷한 감소가 인간 유발 배출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북반구 전체에서 관측된 수은 농도 감소와도 일치한다.
연구진은 “그동안의 국제 규제가 수은 배출 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앞으로는 자연 저장소에서의 재배출을 제어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