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후기 화가로 널리 알려진 최북(崔北:1720-1786?)은 조선 영·정조 때 전북 무주 출신이다. 그는 그림을 잘 그려 최칠칠(崔七七), 또 메추라기 그림을 잘 그렸다 하여 최메추라기 그런가 하면 평생을 붓 한 자루에 매달려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여 호생관(毫生館)이라는 별명으로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최북은 김명국, 장승업과 함께 조선의 삼대 광인(狂人)으로 불릴 만큼 기인으로 알려져 있다. 엄격한 신분제도에 대한 반항심과 화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한 번은 금강산을 구경하다가 ‘명인은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며 뛰어 내렸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는 이야기와 ,어느 날 탐탁치 않는 어느 양반이 그림을 달라고 협박을 하자 차라리 내 자신을 자해할망정 남에게 구속 받지 않겠다며 송곳으로 자신의 눈을 찔러 애꾸눈이 되어 전국을 유랑하며 화가로 살아갔다고 한다.
산수화에 대하여 최북은 “무릇 사람의 풍속도 중국 사람들의 풍속이 다르고, 조선 사람들의 풍속이 다른 것처럼, 산수의 형세도 중국과 조선이 서로 다른데, 사람들은 모두 중국 산수의 형세를 그린 그림만을 좋아하고 숭상하면서 조선의 산수를 그리지 않으니, 조선 사람은 마땅히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 한다.”며 한국적 화풍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그림 중 가장 파격적인 느낌을 주었던 것이 최북의 풍설야귀인도(風說夜歸人圖)인데, 이 그림의 화제(畵題)는 당나라 시인 유장경(劉長卿)의 시 ‘풍설야귀인風雪夜歸人(눈보라 치는 밤에 돌아온 사람)’에서 따온 것이다. ‘풍설야귀인(風雪夜歸人)’에서는 사위가 온통 어두워지고, 눈 덮인 험준한 산 아래 나무들이 바람에 꺾일 듯 휘어져 있는데, 눈보라 치는 겨울날 산속 어느 가난한 초가집 앞을 지팡이를 든 노인네와 어린 아이가 쓸쓸히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와 요란스레 짖어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훗날 성곽 모퉁이에서 동사체로 발견된 최북 자신의 삶과 닮아 있다고 평론가들은 말한다. 한눈에 봐도 매우 거칠고 빠르게 그려낸 티가 확연한 이 그림은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린 지두화(指頭畵)다. 지두화는 붓 대신에 손가락이나 손톱에 먹물을 묻혀서 그리는 파격적이고도 대담한 화풍으로 거칠고 억세다.
조선 시대 어느 화가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화풍이다. 먼저 몇 개의 선으로 대충 그린 것 같은 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조선 시대의 산수화들을 보면 대체로 전면의 나무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풍설야귀인도’의 나무들은 몇 개의 굵은 선으로 성기게 묘사했다. 그럼에도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생동감이 넘친다.
‘풍설야귀인도’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등장한다. 하늘과 땅과 나무와 짐승, 그리고 인간이 높고 낮음 없이 공존하고 있다. 거센 눈보라에 나무도 흔들리고 사람도 웅크린다. 어디 한 군데 자연 위에 군림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광대한 자연 앞에 보잘 것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추운 밤중에 그림 한 점을 팔고는 열흘을 굶다가 술에 취해 돌아오는 길에 성곽 모퉁이에 쓰러져 얼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최북의 미술관은 현재 무주읍내에 김환태 문학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김동수 <미담문학회장, 시인, 전라정신연구원 이사장>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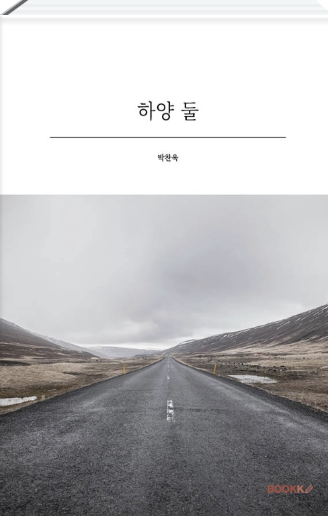



![[소년중앙] 행운·복·사랑…매듭 하나에 마음 엮으며 ‘케데헌’ 팔찌 완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b385a85c-f903-4954-8fa7-a043642c28d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