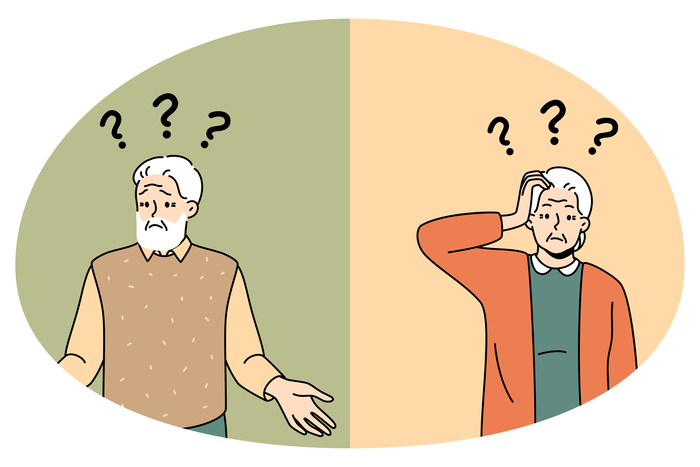
22대 국회 들어 치매 명칭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 조기진단과 치료를 이끌기 위해서다. 21대 국회에서도 명칭 개정 추진이 시도됐지만 무산된 가운데, 사회적 합의와 법안 통과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치매를 '인지증'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이 명칭 변경 법안을 발의한 것은 치매(痴?)라는 단어가 모두 '어리석다'는 의미의 한자를 쓰는 탓이다.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빠른 진단을 방해한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다.
비슷한 이유로 일본은 인지증, 대만은 실지증, 중국·홍콩은 뇌퇴화증 등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정신분열병(현재 명칭 조현병), 간질(뇌전증) 등이 병명 개정으로 선입견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명칭 변경으로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도 치매 용어 개정에 긍정적이다. 복지부는 2020년 9월 발표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용어 변경 검토를 내용에 포함했고, 2023년에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인지저하증과 인지병 등 다양한 대체용어 후보군을 검토했다”면서 “치매안심센터 같은 부차적인 명칭 변경을 고려해 인지증을 우선적인 후보로 도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치매 명칭을 바꾸면 오히려 중증도 구분이 모호해져 환자 조기진단에 혼선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행정 비용도 부담이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개정안 통과시 간판, 홍보물 변경 등에 국비 약 7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비슷한 이유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 치매 명칭을 바꾸는 7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다.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다뤘지만,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PICK! 이 안건] 김윤 등 12인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 선고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5175_819014_41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