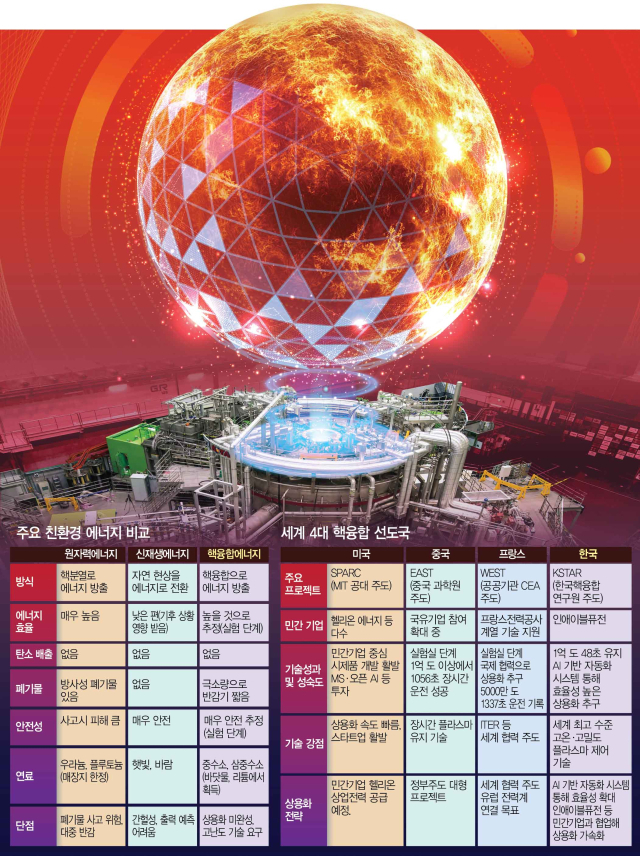글로벌 초고속 교통 시장에서 하이퍼튜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외교, 경제를 통합하는 전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미국의 하이퍼루프 원(Hyperloop One)과 HTT,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프로젝트가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시범 기술 확보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영 모델로 이 기술을 도입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일 하이퍼튜브 열차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를 K하이퍼튜브 원년으로 삼고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하이퍼튜브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지형적 특성상 대규모 지하 굴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시공비 상승과 공기 지연 우려가 크다.
이에 비해 서울-목포-부산을 잇는 해안 축 노선은 서해안 고속도로 등 기존 인프라 위에 지상 고가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해 구조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실제 시공비만 비교해 봐도 차이는 뚜렷하다. 기존 강관을 사용하는 해외 모델은 1㎞당 약 700억~1000억원, 서울~부산 전 구간 기준으로는 30조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강콘크리트 복합관을 적용하면 1㎞당 250억~400억원으로 절감할 수 있고, 서울~목포~부산 전체(600㎞) 노선도 15조~25조원 수준으로 완공할 수 있다. 기술 국산화에 따른 자립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도 큰 장점이다.
뿐만아니라 경영 모델 측면에서도 '한국형 융합 전략'이 필요하다. 하이퍼루트 원의 빠른 기술 실증과 민간 투자 중심 모델, HTT의 글로벌 협업형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의 장점을 결합해야 한다.
한국은 공공기관이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민간은 자본과 응용기술을 담당하며 스타트업과 대학, 국제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PPP+오픈 이노베이션 하이브리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국내 생태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하이퍼튜브를 동아시아 초고속 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서울-목포 구간을 실증한 뒤, 목포에서 대만까지 해저 튜브(약 1시간), 다시 대만에서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약 1시간)까지 확장하는 비전은 단순히 교통 혁신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지형을 바꾸는 일이다.
한국형 하이퍼튜브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다. 수도권 중심의 교통 체계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 수출형 인프라 기술,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까지 아우를 수 있는 미래 플랫폼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첫 경로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목포~부산', 그리고 '목포~대만~아세안'으로 이어지는 길이야말로 한국을 세계의 중심축으로 잇는 미래다. 이제는 교통이 아니라 국토와 외교, 기술이 만나는 전략의 시대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taisik.lee@kofst.or.kr

![15년 뒤 한국은…'전력 부족국가' [AI정부로 가자]](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EA0YJ3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