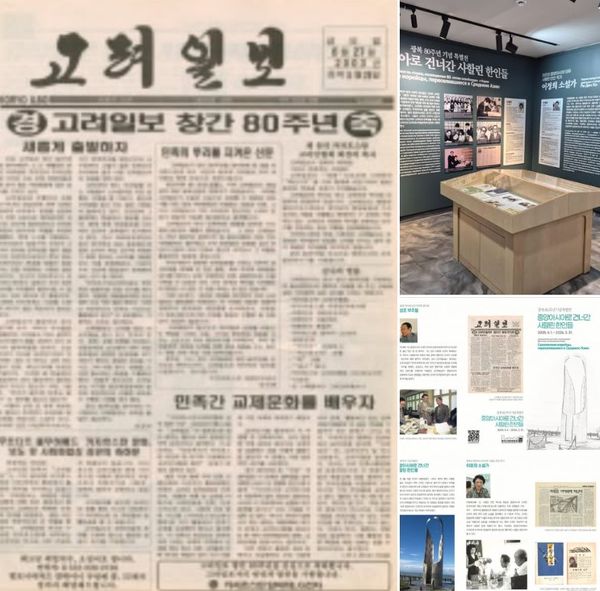3일(현지시각) 노르웨이 트론헤임의 노르덴펠트스케 응용미술관 외벽, 흰 망사 가림막에 선명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수놓았다. “그가 주먹을 쥐는 새 그녀가 매듭을 푸는 한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겠다.” 약한 듯 화려한 망사 위 문장이 강렬하다. 은퇴한 여간호사들로 구성된 밴드가 북을 치며 제4회 한나 리겐 트리엔날레 개막을 알렸다. 외벽 조형물은 오스트리아의 카타리나 치불카의 ’솔랑에‘(독일어로 ’~하는 한‘) 시리즈. “세월이 변해도 우리의 싸움이 여전하다면,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겠다”(2022년 미국 워싱턴DC 국립여성미술관 외벽) 등 세계 곳곳의 가림막에 문구를 새긴 그의 32번째 설치다. 치불카는 “평화를 위해 앞장서 큰 소리를 낸 한나 리겐의 정신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슬로에 ’절규‘하는 화가 뭉크(1863~1944)가 있다면, 트론헤임에는 섬유예술가 한나 리겐(1894~1970)이 있다. 트론헤임은 오슬로ㆍ베르겐에 이은 노르웨이 3대 도시, 전 세계에서 한나 리겐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16년부터 그를 기리는 트리엔날레를 시작했다. 3년마다 4~9월, 트론헤임 곳곳의 미술관ㆍ갤러리에서 한나 리겐과 그의 세계를 이어받은 섬유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올해 주제는 ’엄마(Mater)‘. 트리엔날레 총감독인 잉그리드 루난 응용미술관장은 “마터(Mater)는 라틴어로 엄마를 뜻하며, 여성 보호자부터 창조ㆍ기원ㆍ돌봄ㆍ물질까지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며 “리겐과 그 후예들이 예술과 공예를 통해 어떻게 자신과 세계를 직조했는지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론헤임 미술관에서 연 주제전 ’모성을 넘어서‘에는 케테 콜비츠의 ’죽음, 여자 그리고 아이‘(1910)와 나란히 한나 리겐의 ’그리니‘(1945)가 걸렸다. 1941~45년 나치는 점령 중인 노르웨이에 그리니 수용소를 만들었다. 죄수복을 입고 해골을 그리는 남자는 여기 수감된 남편 한스 리겐, 알몸으로 말을 탄 여자는 딸 모나다. 전쟁 후 다시 세 식구가 함께하는 삶을 꿈꾼 태피스트리(벽걸이 카펫)다. 구소련 여죄수들이 만든 새 모양 공예품, 프랑스 거장 루이즈 부르주아가 분홍 대리석으로 깎은 임신한 여체(2005), 북유럽 선주민인 사미족이 수놓은 신발도 함께 전시됐다.
바늘과 실은 휴대하기 쉽고, 전문 교육 없이도 대대로 전승된다. 섬유예술의 역사는 길지만 주류 미술에 편입된 지는 오래지 않다. 전시는 어디서나 만나기에 하찮게 대접받곤 하는 섬유예술의 너른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894년 스웨덴 말뫼에서 태어난 한나는 1924년 노르웨이 화가인 한스 리겐과 결혼해 외를란트에자리 잡고 딸을 낳았다. 세 식구의 삶은 바닷가 마을에서도 유별났다. 전기ㆍ수도도 없이 닭과 양을 치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자급자족했다. 6년간 그림을 배웠지만 직조기까지 만들어 준 남편의 권유로 직물을 짜기 시작했다. 양모로 색을 내는 데는 현지의 이끼ㆍ잎사귀ㆍ열매, 심지어 발효시킨 소변까지 썼다. 밑그림 없이 짜내려 간 그의 태피스트리 소재엔 터부가 없었다. 소소한 일상부터 신문에서 본 정치적 내용까지 담았다.

엄마이자 예술가로서, 모성의 도전도 겪었다. 이번 트리엔날레의 표제작 ’엄마의 심장‘(1947)은 바로 그 모성의 복잡한 면모를 담았다. 양모로 짠 걸개그림이지만 내용은 그 질감만큼 푸근하지만은 않다. 왼쪽에 하트를 흔드는 아기, ’까꿍‘하는 엄마 모습에 이어 화면 한가운데 수런거리는 마을 사람들, 오른쪽에 알몸으로 우는 엄마, 외면하는 딸의 모습을 새겼다. 뇌전증(간질)에 걸린 딸 모나, 뇌전증 환자를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던 노르웨이 오지의 미신과 싸우는 자기 모습이다. 자녀의 질병 여부와 무관하게 오늘날의 예술가와 엄마들도 겪는 모성의 희로애락이다.

’참수된 리젤로테 헤르만‘(1938)도 조금은 다른 모자상이다. 아기를 먹이는 어머니는 흔한 성모자상의 구도다. 오른쪽 아래엔 아기옷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어머니 모습을 새겼다. 독일에서 반나치 활동을 하다가 갓난아이와 함께 투옥된 유대인 여학생 헤르만을 기린 작품이다. 3년의 투옥 기간 중 유럽 곳곳에서 석방 운동이 있었지만 헤르만의 처형을 막진 못했다. 아기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자 간수가 어린 아들의 옷가지를 던져줬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한나는 이 작품을 만들었다.

끝내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작품은 ’자화상‘(1969~70), 실과 바늘이 그대로 붙어 있다. 그는 마지막 14년을 보낸 트론헤임에 많은 작품을 기증했다. 잊혀 가던 이름은 2012년 독일 카셀 도큐멘타 전시를 계기로 되살아났다. 노르웨이의 외진 피오르에서 카펫을 짜며 나치를 맹렬하게 비판한 여성 예술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독일 관객들이 더 놀랐다. 2017년 영국 옥스퍼드 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도 열었다. "화려한 태피스트리에 짜 넣은 정치"(미국 뉴욕타임스), "히틀러와 처칠을 웃음거리로 만든 여자"(영국 가디언)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름 없는 여성들의 소일거리 취급받던 섬유예술이 부쩍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뉴질랜드 마오리족 여성들로 이뤄진 섬유예술가 그룹인 ’마타호 컬렉티브‘가 최고상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이신자(94) 덕성여대 명예교수가 뒤늦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에 이어 오는 8월 미국 UC버클리 미술관에서 전시한다. 실은 보기보다 질기고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