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87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의회에서 각 주(州) 대표들이 헌법에 서명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특히 식민지 시절 각 주는 자치정부를 운영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독립군 사령관 조지 워싱턴을 보좌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방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군대 조직과 외교 수행에 행정부가 필수적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주저하는 식민지 주민들이 독립혁명을 ‘상식’으로 인식하게 한 토머스 페인의 『상식』(1776)처럼, 연방정부를 상식으로 만든 문헌이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1787~88)이다. 해밀턴은 전체 85편의 에세이 중 51편을 작성해 헌법 찬성 여론을 조성했다. 제임스 매디슨은 29편의 에세이로 분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 주가 협력하는 연방공화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밀턴은 초대 재무장관(1789~95)이 되어 미국을 설계했다. ‘강한 산업기반 위에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창설했다. 세수 확충을 위해 특별소비세를 도입하고 관세 인상도 추진했다.
해밀턴의 ‘연방당’에 맞서 지방 자치를 선호한 ‘민주공화당’이 반발했다. 민주공화당 지도자 토머스 제퍼슨은 엘리트가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제퍼슨은 1801년 대통령에 취임하자 특별소비세를 없애고 관세 인상안도 폐기했다.
민주공화당 창당에 가담한 매디슨은 제퍼슨의 국무장관이 되어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하는 협상을 지원했다. 제4대 대통령에 취임한 매디슨은 제퍼슨의 통치 철학을 이어갔다. 관세도 정부 세수를 충족할 정도면 된다고 보았다. 매디슨은 미·영전쟁(1812~15) 과정에서 관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전쟁이 산업기반을 파괴하자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수입제품에 25%가 넘는 관세를 부과해 ‘보호관세’의 역사를 열었다.
많은 경제학자에게 보호관세가 나쁘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보호관세는 경기침체로 국내산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21세기에 부활한 트럼프의 보호관세도 미국 제조업이 처한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보호관세는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산업화 초기의 ‘유치산업(幼稚産業, infant industry)’이 대표적이다. 19세기 미국 산업의 경쟁력은 초보 단계였다. 21세기 미국 산업은 완숙한 단계의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로 진입했다. 트럼프는 우선 관세로 어떤 산업을 보호할 것인지부터 말해야 한다.
김성재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페드시그널』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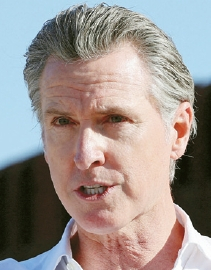





![[한신협 대선주자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 “강하고, 질서 있고, 공정한 국가 만들 것”](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7/.cache/512/2025041758033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