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巫山)은 중국 쓰촨(四川)성에 위치한 산이다. 초(楚)나라 어느 왕이 하루는 무산 근처를 방문했다. 고단한 왕은 낮잠 속에서 기이한 꿈을 꾼다. 무산에 사는 신녀(神女)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여인이 그의 처소에 찾아오는 꿈이었다. 왕은 그녀와 동침한다.

인상적인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나눈 후, 그녀는 왕에게 ‘저는 아침에는 무산의 구름으로 지내다가, 저녁에는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물론 둘이 주고받은 많은 대화 가운데 한 토막이다. 꿈에서 깨어난 왕은 이 말이 기억났다. 그가 아쉬움 가득한 마음으로 무산을 올려다보는데, 과연 신비한 구름이 산허리를 휘감고 있었다.
시인 굴원(屈原)의 제자인 송옥(宋玉)이 쓴 ‘고당부(高唐賦)’에 이 이야기가 실려있다. 비록 꿈이지만 아쉬움과 진한 여운을 남기는 내용인지라, 원진(元稹. 779~831)의 시(詩) ‘초가십수(楚歌十首)’ 등 여러 문인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이번 사자성어는 무산지운(巫山之雲. 무당 무, 메 산, 어조사 지, 구름 운)이다. 앞 두 글자 ‘무산’은 고유명사다. ‘지운’은 ‘~의 구름’이다. 이 두 부분이 만나면, 그냥 평범한 ‘무산의 구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름 이상의 함의(含意)를 갖게 됐다. 초나라 왕의 꿈 이야기에 등장한 그녀가 자연스럽게 연상되기 때문이다. 차츰 ‘무산지운’은 ‘남녀 간의 황홀한 육체 관계’를 비유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로 굳어졌다. 동의어는 무산지몽(巫山之夢)이다.

중당(中唐) 시기에 왕성하게 활동한 시인 겸 관료 원진은 빈곤한 집안에서 출생했다. 그는 조숙하여 9살 무렵부터 완성도 있는 시를 쓸 수 있었다. 15세에 명경과(明經科)에 합격하고, 일찍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평균 수명이 길지 않고 조혼 풍습이 있던 고대 중국에서, 남녀 모두가 10대 후반부터는 성인 대접을 받았다.
원진은 성품이 강직한 편이었다. 교서랑(校書郞) 등 신진 관료 시절부터 감찰어사(監察御史) 시절까지 쓴소리와 직간(直諫)을 주저하지 않았다. 결국 시련이 닥쳤다. 권력을 쥐고 있던 환관, 고위 관료 등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던 원진은 현재 징저우(荊州)시 지방으로 좌천당하는 신세가 된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담담하게 버텨낸다. 관료 경력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이 징저우 시기에 시인 원진은 창작에 오롯이 집중해, 약 300편의 시를 쏟아냈다. ‘시인이 힘들면, 시가 나아진다’란 말도 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5년 가까운 징저우 생활 이후, 원진은 처신에 있어서는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한다. 훗날 중앙 정부로 복귀한 이후엔 순조롭게 승진해 재상급인 동평장사(同平章事)에 올랐다.
그가 세상사에서는 타협했지만, 창작 세계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었다. 과도하게 화려한 문체(文體)를 버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7세 연상인 백거이(白居易. 772~846)와 함께 적극 펼쳤다.
원진과 백거이가 주고받은 시(詩)들을 읽어보면, 그 우애(友愛)의 깊이와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쉽게도, 이 우정의 시간은 짧았다. 원진이 52세에 일찍 세상을 하직했기 때문이다.

원진의 인생엔 유난히 이별이 많았다. 사랑하던 아내와는 일찍 사별했다. 연상의 시인 설도(薛濤)와의 연애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원진의 작품 세계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아쉬워하는 내용이 많은 이유다.
아쉬움과 관련해, 원진의 시 ‘국화(菊花)’의 끝 구절도 꽤 유명하다. ‘많은 꽃들 가운데 내가 국화만 편애하는 건 아니랍니다(不是花中偏愛菊), 이 꽃 시들고 나면 이제 더는 피어날 꽃이 없어서 그래요(此花開盡更無花).’ 천 년 이상의 세월을 건너뛰어, 그 가을 분위기가 후각(嗅覺)으로까지 전해진다.
인생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서 절정의 순간은 짧다. 역설적이게도 회한(悔恨)의 시간은 길다. 이 ‘국화’에서도, 절정의 순간에 오히려 그 이후를 미리 염려하는 원진의 애틋한 시심(詩心)이 엿보인다. 당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한 중당 시기를 지배한 분위기였을 수도 있다.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육본 상황실에 전화가 울렸다"](https://img.newspim.com/news/2025/08/25/2508251328548920.jpg)
![[기고] 복서·바이커·클래식 광의 시집, 박시우 '내가 어두운 그늘이었을 때'](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1584520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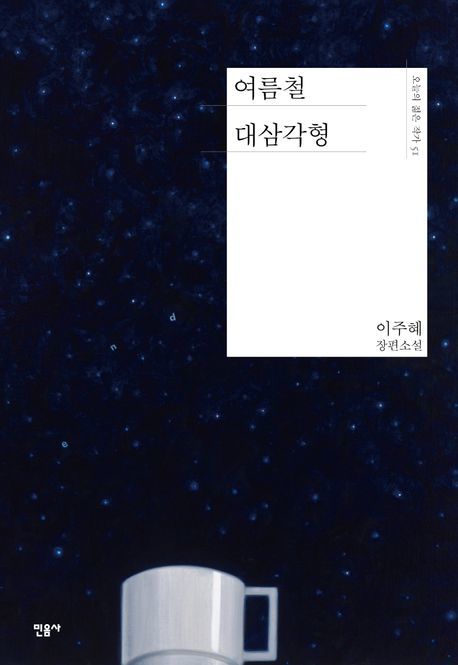
![[이철환의 노트북] 여행을 떠나요!](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6148402027_97c69e.jpg)

![[소년중앙] 판타지 속 판타지를 찾아서 92화. 천고마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5afe88a1-6d11-4bc3-b63b-0945e8b9e7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