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이 취지대로 실수요자간 거래를 촉진했지만, 농촌지역의 농지 거래 절벽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지역별 농지 거래 실태’ 보고서를 내놓고 2013∼2023년 농지시장의 거래 변화를 분석했다.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강화된 농지 규제 효과를 검토하는 내용이 뼈대다.
전국 농지 거래 회전율은 2013∼2021년 2.5∼3.3%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1.7%까지 하락했다. 농지 거래 회전율이란 전체 혹은 지역의 농지 거래량을 농지면적으로 나눈 지표다.
회전율은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감소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평균 농지 거래 회전율이 3%를 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다음 세대에 농지를 승계할 수 있는 최소 농지 거래 회전율을 1.5∼2.0%로 계측했다.
채광석 농경연 연구위원은 “2023년 농지 거래 회전율을 보면 농지 유동화 측면에서 사실상 거래량이 임계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다만 지난 10년간 평균 농지 회전율이 2.7% 수준인 만큼 1∼2년간의 변동만으로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회전율 격차의 원인으로 ‘이자율’과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규제 효과’가 꼽힌다. 농지 규제로 인한 거래량 감소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두드러졌다. ‘농지법’ 개정 뒤 회전율은 도시지역이 6∼8% 하락한 데 그친 반면, 농촌지역은 13∼21%로 격차가 컸다.
이자율 변화는 농촌보다 도시 인접 농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자율이 1%포인트 오를 때 농촌지역의 회전율은 8∼10% 낮아졌지만, 도시지역은 16∼2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 가격이 높은 도시는 이자율이 오르면 농지 투자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채 연구위원은 “특히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농지 규제 효과가 컸다”며 “이자율이 다시 낮아지더라도 농촌지역의 농지 유동성은 도시보다 회복이 더디고 인구소멸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제도개선의 비가역성을 고려할 때 성급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농지법’은 법안 취지대로 실수요 중심의 농지 취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 매수인의 거주지와 거래 농지 간 통작 거리는 2020년 45.1㎞에서 2021년 43.0㎞, 2023년에는 처음으로 30㎞대(36.9㎞)까지 감소했다.
농촌의 농지 거래 절벽이 심화되리라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 단위로 농지 거래 회전율의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제언이 뒤따른다. 농지시장이 정상적인 거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거래량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지역 단위의 임계 회전율을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비축 사업과 연계하자는 제안도 있다. 농지 회전율이 기준선을 밑도는 지역은 농지은행의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매입 대상 농지를 기존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우량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까지 포함하자는 의견이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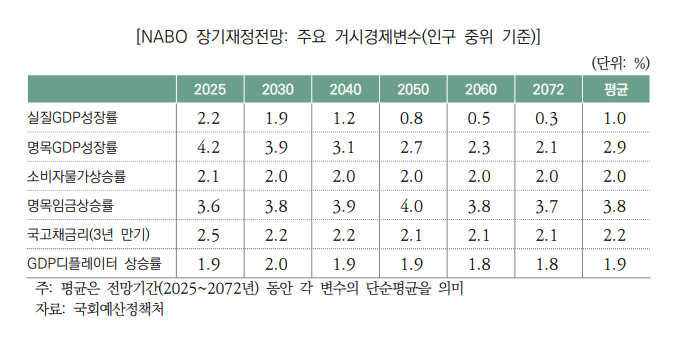



![[다음주 경제] 한은 기준금리 결정…성장률 얼마나 낮출까](https://stock.mk.co.kr/photos/20250222/PYH2025011602760001300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