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9%. 교육부가 집계한 지난달 31일까지의 의대생 등록 비율(1일 기준)이다. 사실상 전국 40개 의대생 대부분이 '데드라인' 전에 1학기 등록을 마친 셈이다. 불과 일주일 전, 의대생 단체 등이 자체 취합한 연세·고려대 등록률 15~20%와는 정반대 수치다. 유일하게 미등록 입장을 고수했던 인제대 학생들도 2일 들어 복귀로 선회했다. 등록 후 휴학계 제출 같은 '수업거부' 움직임은 있지만, 이전의 미등록 투쟁보다 동력이 크게 약해졌다.
단일대오가 흔들리자 의료계 내부에선 '벼랑 끝 투쟁' 일선에 섰던 두 강경파 대표의 책임론이 커진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이다.
한 의대 본과 학생은 "전공의들에 휘둘린 의대협 지도부가 일단 등록부터 하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해왔다. 이선우 위원장 등이 잘못된 투쟁 방향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에 대한 수업거부 압박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다. 박단 부회장 등이 나중에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려 하나"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박단 부회장은 '아군' 의대생들의 벼랑 끝 투쟁을 제3자 입장에서 부추긴 모양새다. 유급·제적을 막을 대안 제시 없이 "팔 한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죽거나 살거나" 등의 표현을 담은 페이스북 글만 올렸다.
하지만 '누울 자리'(의사 면허)가 있는 박 부회장은 제적되면 빈손인 의대생들과 출발점부터 다르다. 그의 강경론에 의료계 대표 단체라는 의협도 방향을 잃고 "의대생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말았다. 결국 벼랑에 떠밀린 의대생들은 팔 한짝을 내놓기보단 일단 사는 길을 택했다.
의대생 당사자인 이선우 위원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끝까지 미등록 휴학 원칙을 고수하면서 복귀 움직임을 보인 학교들을 압박해왔다. 서울대·연세대가 선제적으로 복귀 움직임을 보이던 지난달 27일,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대협 입장문을 내고 두 학교를 명단에서 제외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곧바로 상당수 의대가 흔들렸고, 결국 '복귀 후 투쟁'으로 방향을 틀었다.

고려대는 의대생 전원이 등록 신청을 했다. 고려대 학생인 이 위원장도 지난달 29일 마감 시한 전에 복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강조해온 미등록에 따른 제적 대신, 상처뿐인 복귀를 택한 것이다. 결국 의대협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단일대오 붕괴를 인정했다.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지속하는 동안, 의대 증원을 내세운 정부가 세게 나가면 두 강경파 대표도 되레 힘을 받는 '강대강' 구조가 반복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초 교육부와 의대 총장·학장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
증원 저지란 제일 큰 명분이 사라진 상황, 그래도 벼랑 끝 투쟁 방식을 놓지 못한다. 2일 의대협은 이선우 위원장 명의로 '교실은 비어있다'는 강경 입장을 또 냈다. 한 의대 복학생은 "대표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노리고 있는 건지 (투쟁) 방향성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수업거부 등을 부추기는 일부 강경파 대신 '조용한 다수'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면 의대 증원, 의료계 반발 등이 반복되면서 다 같이 공멸한다는 위기감에서다.
"요구조건이 거의 다 반영됐는데도 '거부를 위한 거부'만 하면 결국 의료계·국민 모두 피해를 봅니다. 정부는 복귀하겠다는 이들을 방해하는 강경파에 강력 대응하고, 의료계 선배들도 침묵하지 말고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돌아오길 원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정부·전문가·환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시점입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의 호소다.
![[단독]박단 직격한 의협 前간부 "특정인물이 모든 논의 가로막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89bb3f52-1bf8-432d-a1df-1343d23cda89.jpg)




![[신인순 대표의 조직문화 이야기] 45. 원장-직원이 Win-Win 할 수 있는 연봉협상](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4/44111_74546_6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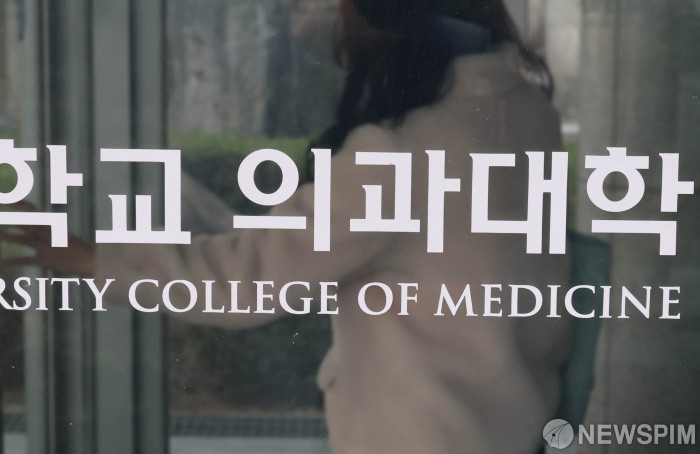
![[덴탈MBA] 수습기간 종료 어떻게 해야할까?](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4/44107_74531_48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