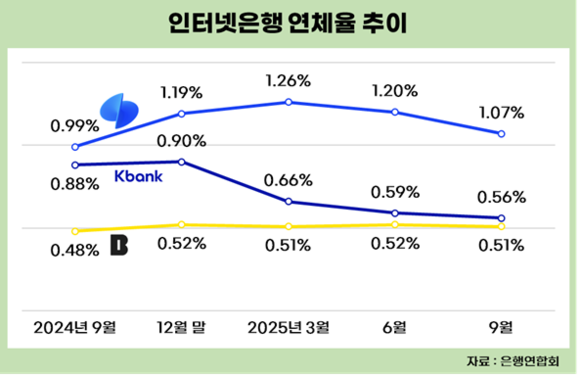대출 최고금리 상한을 도입한 미국 일부 주에서 제도 시행 이후 취약 계층의 대출 건수(계좌 수)가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했지만 되레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만 가구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미국 3개(사우스다코타·노스다코타·일리노이) 주에서 대출금리를 연 36%로 제한한 이후 나타난 변화를 추적했다. 해당 연구는 은행 대출을 제외한 페이데이론(초단기 소액대출), 할부 대출 등 고금리 비은행 소비자 대출을 대상으로 삼아 금리 상한을 두지 않은 주와 비교했다.
분석 결과 금리 상한제를 도입한 주에서는 신용점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고위험 차주의 대출 계좌 수가 약 20% 줄어들었고 대출 잔액도 평균 15~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들 차주의 연체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상환 여력이 개선됐다고 볼 만한 변화도 확인 못했다. 금리 규제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출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셈이다.
금리 상한제의 도입은 중간층이 봤다. 제도 도입 후 중간 신용계층의 대출 잔액이 신용구간별로 7~11% 증가했고 대출 계좌 수도 8~14% 늘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연체율도 하락했다. 중간층의 경우 정부의 지원 타깃은 아니다. 당국의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보고서는 “금리 상한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분석 결과 이 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의 기대와 달리 신용 취약층은 더 낮은 비용의 대출을 찾지 못했고 연체 위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