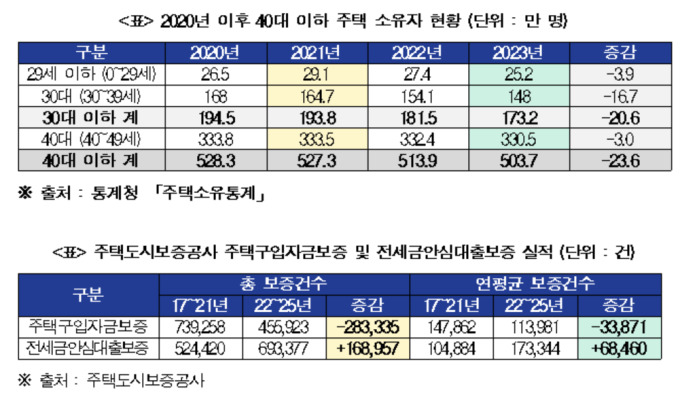서울에 거주하는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소득 격차가 4.6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11일 ‘2024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연구원 서울복지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소득이 상위 20%인 가구(소득분포 5분위)의 평균 총소득은 1억2481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가구(소득분포 1분위)의 2704만원과 비교하면 4.6배다.
표본집단 평균 총소득은 6423만원이었다. 서울연구원은 “평균값이 중위소득(5800만원)보다 높다는 통계의 의미는 저소득층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며 “다만 저소득 집단이 적게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채 중에서는 집값 부담이 컸다. 주거비 부담을 의미하는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평균 11.4배를 기록했다. PIR은 한 가구가 몇 년간 연 소득을 저축해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쉽게 말해 서울시민은 평균적으로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1.4년 동안 모으면 평균적인 가격의 내 집을 서울에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1년 소득 대비 주거임대료의 배수(RIR)는 평균 37.7%다. RIR은 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서울에서 집을 임대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벌면 이 중 37만7000원 정도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구당 자산 6억원…부채는 4500만원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시민의 생활 결핍과 빈곤 실태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7.3%는 경제적 이유로 집세·공과금을 내지 못하거나, 겨울철 난방을 포기하고,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 시민의 2.3%는 휴가·여가 활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조차 어려운 상태로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70대 이상에서 빈곤 비율이 5.3%로 높은 편이다.
생활비 지출을 비교해도 뚜렷한 격차가 드러났다. 빈곤층으로 분류하지 않은 시민(비빈곤층)의 월평균 생활비는 286만원으로, 빈곤층(115만원)의 2.3배였다. 반대로 월평균 의료비는 빈곤층이 4만2000원으로 비빈곤층(3만5000원)보다 많았다. 의료비 부담을 호소한 비율 역시 빈곤층(37.0%)이 비빈곤층(16.7%)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마음건강 영역에선, 최근 1년간 우울 증상을 느낀 응답자가 23.6%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았고(32.6%), 중장년층(25.8%)이 뒤를 이었다. 15∼29세 청년 중 취업·교육·훈련을 모두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은 4.6%로 2022년(3.6%)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연구원이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울에 거주하는 3004가구를 조사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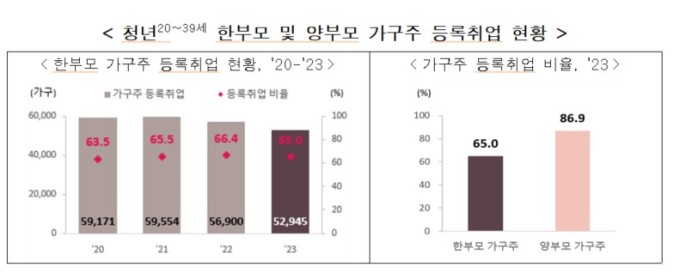
![[건축신문고] 설계공모 추정가격 1억에서 2억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해야한다](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9/10/.cache/512/2025091058036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