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이 최근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며 국내 제약업계가 시름을 앓고 있다. 20년 넘게 치매·경도인지장애(MCI) 증상에 투여됐지만, 환자 이탈과 임상 재입증 부담을 떠앉은 탓이다. 다른 치료제 역시 효능 입증이 부족한 점을 들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치매 예방·인지기능 향상 등에 주로 처방되는 약제인 콜린을 선별급여 대상으로 전환했다. 치매 환자 외에는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크게 올랐다. 복지부는 콜린이 치매 외 질환에는 임상 유효성이 부족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약사들은 반발했다. 2001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콜린에 대해 정부는 품목허가와 요양급여 등재, 급여 유지 등을 해왔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결정은 콜린이 의료현장에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임상 유효성에 대해선 새로운 내용 없이, 이미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정책 판단이 돌연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 적용과 함께 복지부는 콜린이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방액의 20%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프란체스코 아멘타 이탈리아 카메리노대 교수 연구팀과 원주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콜린이 뇌 위축 진행을 억제하고 콜린 복용군의 치매 전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각각 확인했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에 효능 입증을 위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제약업계는 입증 실패 시 요양급여 청구액의 20%라는 환수 규모도 과하다고 호소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약시장 구조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만으로는 환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콜린에 대한 임상 재평가와 선별급여 판정을 겪으면서 인지기능 개선제 시장 판도는 변화하고 있다. 업계는 10월 들어 MCI와 초기 인지 저하 영역에서는 콜린 대신 은행잎추출물 기반 약제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 경쟁력을 들어 기존 콜린 약제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셈이다.
제약사들은 효과와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와도 정책 일관성이 어긋난다고 호소한다. 레켐비 임상 3상에서 환자의 12.6%가 뇌부종·뇌출혈 등 이상 반응이 나왔음에도,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사위원회 자문 없이 빠르게 허가했다.
치매 유발 단백질을 직접 제거하는 레켐비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해외 신약에는 문턱을 낮추고, 수십년간 활용된 기존 치료제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며 아쉬움을 표한다. 현재 레켐비는 판매 1년 만에 135건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발생했다.
의료계는 급여 약제 접근성이 낮아지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급여를 축소하면 의료 시스템 밖에서 관리되지 않는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국민이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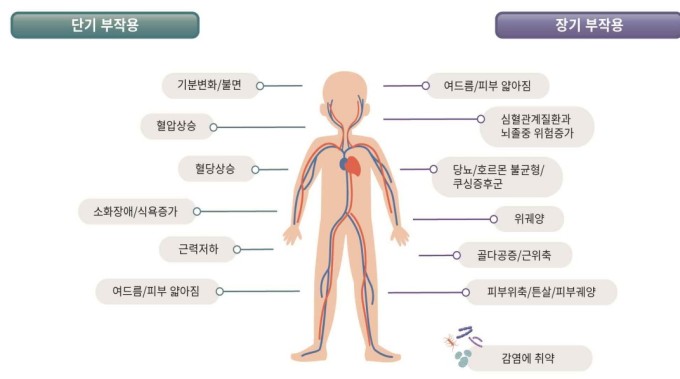

![비만 탈출하려면 위고비? '일기 쓰기' 하나로 10kg 뺀 비결 [Health&]](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c0d4fb67-7668-4834-9a64-814e2a48927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