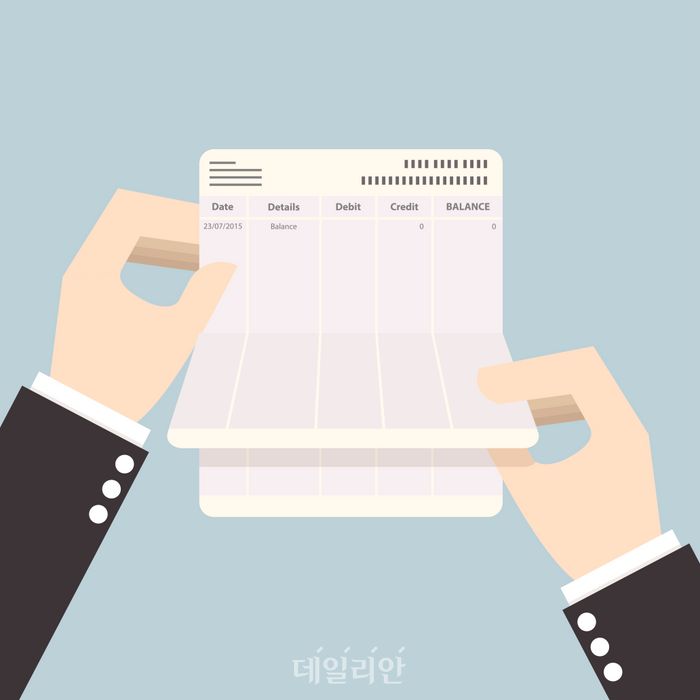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1년 새 2603억원(14.6%)이나 급증했고, 2019년부터 감소하다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펴온 결과가 이것인가.
그러나 노동부는 그 원인을 경기 둔화와 임금 총액 증가 등 경제·사회적 문제로 돌리면서 ‘임금체불 청산 실적’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체불임금 청산율이 81.7%로 전년(79.1%)보다 늘었고, 청산액(1조6697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이다. 청산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도청산액’ 1조3300억원은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전액 받았는지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체불당한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을 거쳐 500만원만 받고 진정을 취하한 때도 1000만원이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장관의 주요 활동사항’이란 이름의 A4용지 세 장짜리 참고 자료를 낸 것은 선을 넘었다.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넘겼는데, 김문수 장관과 이정식 전 장관의 ‘구두 지시’가 그렇게 효과적이었단 말인가. 김 장관이 취임한 건 지난해 8월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2023년 체불임금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자 노동부는 2024년 2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고의·상습 체불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체불임금액이 더 증가했으니,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지탄받을 만하다.
올해 역시 내수 위축과 고환율, 경기 악화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임금체불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에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임금체불 증가 추세가 꺾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안일한 자세다. 반의사불벌죄는 노동계 주장처럼 전면 폐지가 옳다. 사업주가 생계가 걸린 노동자 처지를 이용해 체불임금의 일부만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탁상행정이나 홍보쇼로 임금체불을 막을 수 없다. 제도적 허점을 고쳐 신속하고 실질적인 체불임금 구제 절차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