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산탄총’이 아닌 ‘저격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무차별적 공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특정 대상을 정밀 겨냥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10% 늘었고 피해액은 무려 91% 급증해 8545억 원에 달한다. ‘나는 네 딸’이라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성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는 사건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왜 속았느냐’며 책임을 전가한다. 이는 첨단기술과 심리 조작으로 무장한 범죄 산업의 실체를 간과한 태도다. 개인의 주의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범죄 앞에서 더는 고식지계(姑息之計)로는 안 된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입는 방어 체계인 ‘사회적 갑옷’이 필요하다.
현재의 책임 구조는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금융사와 통신사는 “고객의 승인된 거래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내부 절차만 지키면 책임을 면하는 구조 속에서 범죄 예방에 투자할 유인은 적고 도덕적 해이만 커진다. 반면 소비자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덫’에 갇혀 있다. 실제 피해액의 환급률은 33%에 불과하고 나머지 손실은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사기 발생 원인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은 최근 ‘승인된 푸시 결제(APP)’ 사기에 대해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이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는 책임 분담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기 피해를 개인의 실수로만 보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로 본다는 인식 전환이다. 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사기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우리도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통신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기 방지 책임을 명시하고, 사기 피해를 영업 리스크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 예방에 투자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의 ‘민원 해결’ 중심의 사후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다.
한국형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첫째, ‘기관 공동 책임 모델’을 법제화해야 한다. 금융사와 통신사가 사기 피해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분담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공정한 구조다.
둘째, 기술의 칼에는 기술의 방패로 맞서야 한다. 보이스피싱 정보가 산재된 상태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AI 기반 분석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하고 모든 금융·통신사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없이 범죄 네트워크를 선제 차단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 현재 심리·법률·금융 지원은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접수 즉시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사기는 단순한 금전 범죄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동반하는 복합 범죄다. 회복은 삶의 균형을 되찾는 전 과정이어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보이스피싱 대응은 더 이상 개인의 분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공정한 책임 분담과 스마트한 기술 방어, 따뜻한 피해자 지원이라는 3가지 축 위에 예방-차단-구제-재발 방지의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보이스피싱이라는 현대 범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것이다.
![[ET시론]새 정부의 보안 과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7/news-p.v1.20250807.65ff41fd1816472d905ad9b787e5c1c4_P1.jpg)
![[사기 범죄 급증]④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수법은 진화·구제율은 하락](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739256050.jpg)
![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피의자 비밀번호 제공 거부에 속수무책 [Law 라운지]](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4EG2U_1.jpg)
![[사기 범죄 급증]⑤전세사기특별법 연장에도 피해 여전...근본 대책 마련 필수](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7421345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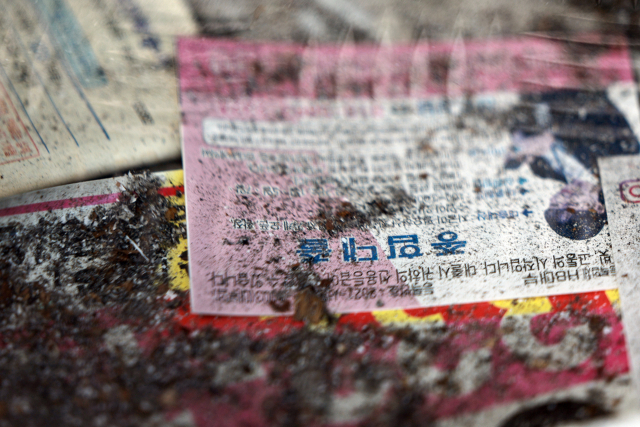
![[사설] 電金法 개정, PG사 타깃규제 문제많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8/news-a.v1.20250808.7711af434cd54934b183f4a5ae9a05c8_T1.png)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4EZ4D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