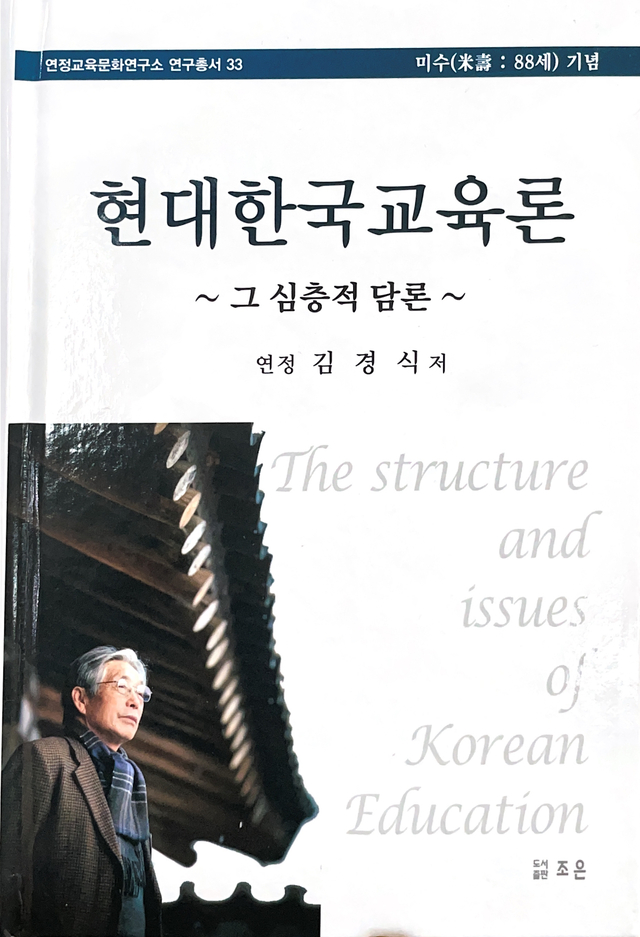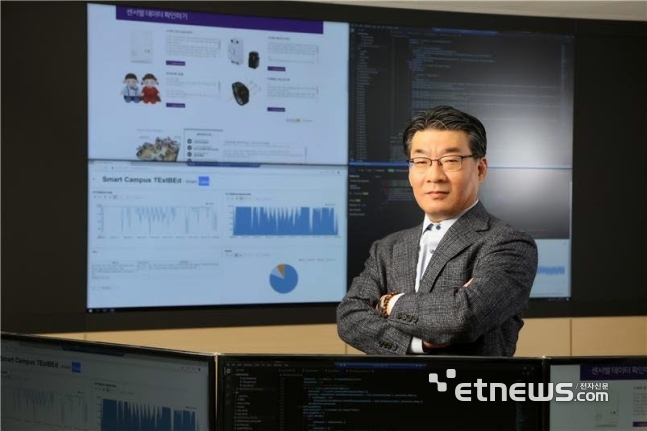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은 임제(臨濟) 선사의 말로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태를 통찰해 진실되고 온전하게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대전환 시대'에 기업들이 대졸자들에게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이나 교수의 문제라기보다 '낙후된' 교육 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다. 미국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유연한 커리큘럼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동안 우리 대학들은 아직도 사회적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직된 학사 행정제도로 인한 교과과정의 정체(停滯)이며, 둘째는 학술논문 실적만 강요하는 교수 평가제도다. 셋째로, 학생지도 및 산업동향조사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의 기능이 결핍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대학은 재정적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
이 문제들은 서로 얽혀 악순환을 반복한다. 학생은 실력보다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교수는 논문에만 집중해 '독자없는 작가'라는 자괴감 속에서 행정업무에도 치이고 있다. 대학은 재정적 한계와 각종 대학평가제도에 얽매여 문제점들을 인지하면서도 생존전략에만 골몰하는 궁색한 형편에 처해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기회는 언제나 존재한다. 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경직된 학사 행정제도를 혁신해 교육과정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교과과정을 유연하게 개편하고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상아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실용적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수평가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교수의 본분을 회복시켜야 한다. 평가에서 논문의 비중을 낮추고, 산학협력 실적,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을 강조해 실용적 교육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셋째, 행정조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학생의 진로와 심리상담 전담기구와 산업동향을 분석해 발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교적 발전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본분을 회복하면, 교수는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제자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 학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대학이 자주적 발전노력을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은 물론 사회로부터 대학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기업은 산학협력 기반 수요지향적(Demand-driven)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대학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임을 인지해 실전적 지식과 경험을 대학과 공유해야 하며, 학생이 '어느 대학 출신인지'가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역량중심 채용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자신의 소명을 명확하게 깨닫고, 각자가 '주인'으로서 진실되고 온전하게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정신이다. 교수들 또한 논문 실적의 노예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 교육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이 수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인'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선다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존재가치를 창출하는 곳이다.
이강우 동국대 컴퓨터AI학부 교수 klee@dongguk.edu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외국인 유학생 정착 돕는 문화교육](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6/20250806517619.jpg)
![[신간] 이길영 교사의 따뜻한 교단 이야기, '앗! 월급도 주나요?' 출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561760077_c5f01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