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럼의 첫 타격이 울리자, 객석과 공간이 동시에 전율한다. 몸보다 먼저 심장이 쿵쾅거린다. 기타 피드백(앰프에서 나온 소리가 기타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픽업으로 들어가 순환하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색)의 진동이 객석을 가르고, 배우의 록킹한 포효가 라이브 밴드 사운드와 맞물리며 객석을 덮치듯 달려든다. 록 뮤지컬의 강렬한 서곡(오버추어)과 첫 번째 넘버는 관객의 심신 상태와 작품의 서사 및 음악적 세계관을 빠르게 연결해주는 매개다. 무의식중에 주파수대가 동기화됐다면 작품과 관객의 물아일체는 시간문제. 감정은 더 이상 대사나 표정, 안무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로이 확장된다. 슬픔은 음향으로, 연민은 박동으로, 공감은 진동으로 바뀐다. 뮤지컬 <쉐도우>와 연극 <안트로폴리스 Ⅰ: 프롤로그/디오니소스>(이하 안트로폴리스)는 이 진동을 다시 감정으로 전환하는 감각 중심 작품이다. 비극을 재현하지 않고, 비극의 파동을 체험하게 이끈다는 점에서 이해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견디는 비극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와 아버지 영조의 비극을 타임슬립 록 뮤지컬로 재해석한 <쉐도우>(허재인 작·작사, 앤디 로닌슨 작곡, 김현준 연출, 박혜정 음악, 서병구 안무, 서숙진 무대, 정중현 조명, 장기영 음향, 정종호 영상)는 온몸을 전율케 하는 서곡으로 막을 연다. 무대를 구성하는 여러 겹 철제 프레임은 수백 년 전의 뒤주와 현재의 공연되는 백암아트홀의 시공간을 융합한 타임머신이다. 여러 레이어와 색상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재조립하는 조명디자인은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의 시간과 감정을 교차 편집하듯 오가며 불안한 청년들의 우정 연대를 직조한다. 사도(진호·신은총·조용휘 분)가 록 콘서트처럼 라이브 밴드 세션들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관객 참여를 이끌면서 시작하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아버지 영조(한지상·박민성·김찬호 분)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공포와 강압의 뒤주가 된다. 영조는 광증이 폭발한 사도를 뒤주에 가두고 역사 속 뒤주의 시간은 <옥추경>(중세 도교 경전)을 통해 청년 영조의 시간대로 타임슬립한다. 불안한 청년기를 살아가는 청년 영조와 사도는 어느새 서로에게 힘이 돼가고 작품은 버디 무비처럼 훈훈하게 전개되지만, 이내 과거의 뒤주 속에 갇힌다. 반복되는 시공간 융합 속에서 사도는 영조와의 역지사지를 깨닫는다. 비극이 온전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 부자관계인 영조와 사도의 이해와 화해의 매개는 라이브 밴드 사운드다. 감정을 시각화한 영상디자인과 연동되는 조명디자인은 사도와 영조가 내지르는 록킹한 넘버들을 통해 머리가 아닌 몸으로 공감대를 확장한다. 비극을 다시 쓰는 의식(儀式)이자 스피노자가 말한 정동(affectus·관계 속에서 발전되는 에너지의 변화)의 확장이다. 서사보다 ‘관계의 진동’을 중심에 세우니 드럼의 강타와 일렉 기타의 피드백이 비극에 국한하지 않는 감정의 공명으로 변환한다. 관객은 음악의 파동 속에서 자신의 심박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을 신체로 받아들인다. 필자 역시 뇌를 거치지 않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이었다.
신화와 동시대적 파동 사이의 탄생
연극 <안트로폴리스>(에우리피데스 원작, 롤란트 쉼멜페니히 각색, 윤한솔 연출, 임현진 번역, 임일진 무대, 김성구 조명, 이민휘 음악, 전민배 음향, 정혜지 영상, 최경훈 안무)는 또 다른 차원의 라이브 밴드 사운드를 통한 정동이다. 라이브 밴드의 진동으로 그리스의 신화와 21세기 한국의 공명을 시도했다. 기원전 5세기 에우리피데스의 <바카이>(The Bacchae)를 21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극작가 롤란트 쉼멜페니히가 각색한 작품으로 독일에서 성황리에 상연한 <안트로폴리스> 5부작을 국립극단이 한국적으로 재해석했다. 이번 작품은 그 첫 번째 시즌이다. 1막 ‘프롤로그’는 신들의 시대인 신화적 공간이자 21세기 현재 명동예술극장의 분장실을 겹쳐놓았다. 트렁크 차림으로 메이크업을 받으며 가발을 쓰기 위해 헤어라인을 정리하는 배우들과 분장사들이 무대 위를 활보한다. 사각지대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라이브캠을 통해 송출되고 무대에는 테베 이전 신화 속 인물들도 드나든다. 시공간과 무대 앞과 뒤, 연극과 영상, 라이브 밴드 공연을 모두 넘나들고 해체한 혼종적 상황이다. 배우들은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며 신화적 언어와 21세기 언어를 번갈아 발화한다. 라이브 밴드 음악과 합창을 통해 낭송은 음악으로 흡수되고 테베를 건국한 카드모스(장성익 분)와 그의 딸 세멜레가 등장한다.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디오니소스(조의진 분)의 등장이다.

2막 ‘디오니소스’는 본격적으로 국가와 도시의 형태를 갖춘 기원전 10세기 전 테베이자 스포츠카와 거대한 컨테이너, 대형 타악기가 즐비한 21세기다. 카드모스는 디오니소스의 어머니인 세멜레의 자매 아가우에(김시영 분)의 아들 펜테우스(고용선 분)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테베 여인들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며 연일 광적인 축제에 빠져들고 11명의 걸그룹 같은 코러스가 밴드 음악에 맞춰 군무와 합창을 다양한 안무로 전시한다. 앞뒤 서사는 난해하지만, 관객에게 이 코러스의 군무와 합창은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다. 여인들의 축제를 금지하고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펜테우스는 결국 신들의 분노를 사고 어머니 아가우에가 동참하는 여신도들의 오인에 사지가 찢겨 죽음을 맞는다. 작품은 이 과정을 무대 천장에 설치한 고해상도 라이브 캠을 통해 줌인·아웃 하며 자세히 대형 스크린에 영사한다. 신과 인간, 이성의 질서와 광기의 본능이 맞부딪히는 비극적 결말을 날것으로 보여주는 시도다.
윤한솔 연출은 이해보다는 감각으로, 이 기괴함과 분절을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시했다. 스크린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21세기 도시 이미지, 영상과 낭독, 라이브 밴드의 사운드가 교차하며 하나의 일관된 내러티브 대신 감정의 파편을 흩뿌려 놓는 방식이다. 소리와 이미지, 움직임이 서로를 관통하며 만들어내는 관계성을 찾아내는 과정은 숨은 그림 찾기 같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디오니소스의 광기는 이성을 침식시키는 폭력이 아니라 감정의 해방으로 재해석된다. 극적 전환은 광기의 순간이 참혹한 살인으로, 윤리적 사건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분절적 정동이 공동의 리듬으로 바뀌는 순간 관객은 단순히 감정을 ‘보는 자’에서 감정의 진동을 함께 ‘견디는 자’로 변한다. 바로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개념화한 ‘탄생(natality)의 순간’이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파괴의 뒤가 아니라 감정을 감당하는 바로 그 순간 발생한다. <안트로폴리스>는 고대 신화의 윤리를 되살리는 작품이 아니라 감정을 매개로 한 윤리의 재구성 실험이다. 윤한솔 연출의 무대에서 디오니소스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는 우리 안의 감정, 혹은 공동체의 잠재된 진동으로 나타난다. 앙상블의 군무와 라이브 밴드의 폭발적 사운드는 합창의 형식을 통해 신성 대신 집단적 정동의 회로를 복원한다. 디오니소스가 가져온 광기의 힘은 결국 파괴가 아니라 공명으로 완성된 새로운 윤리의 리듬으로 작동한다.
<쉐도우>의 록 사운드와 <안트로폴리스>의 이 파괴적 제의의 분절은 비극에 감응하는 매개라 할 수 있다. 대놓고 비극인 이 작품들처럼 비극은 매번 새로 연주된다. 그리고 그 연주는 언제나 새로운 탄생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비극 속에서도 인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진동한다. 서로의 감정을 감당하고, 다시 살아내는 능력, 그것이 이 작품들이 보여주는 ‘탄생’의 형식이자 비극 속 희망의 연대다. <안트로폴리스>는 10월 26일까지, <쉐도우>는 11월 2일까지 상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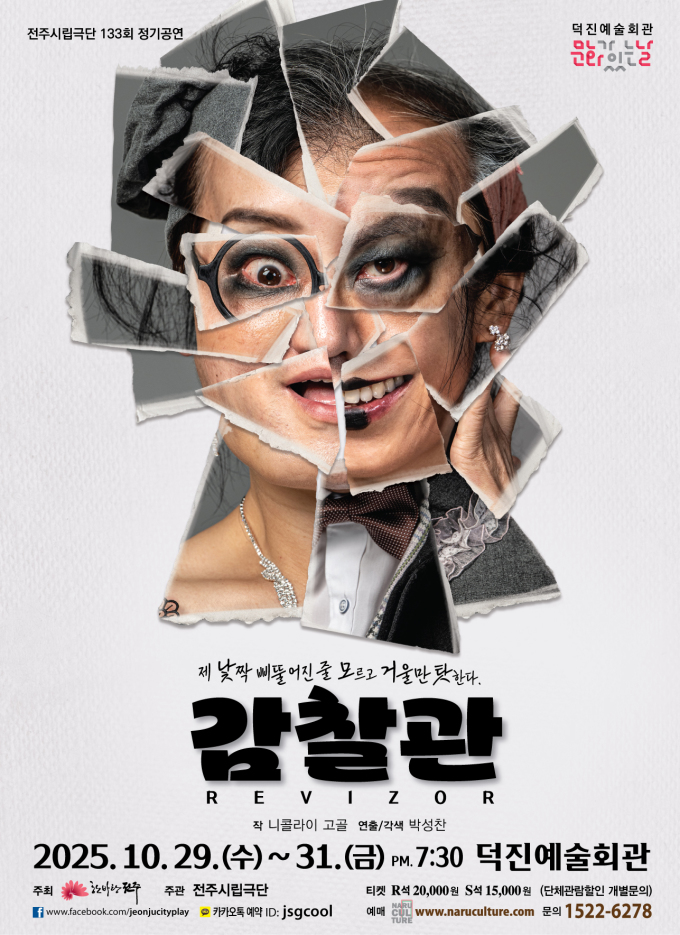




![뭉치고 갈라서고 다시 뭉친 갤러거 형제와 오아시스, 인터뷰에 담긴 성장사[BOOK]](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3f14c88e-db9e-475f-bc72-6b3d94e97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