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급증하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법률전문가들은 “신속한 대응만이 보증금 전액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신탁 전세사기’ 유형이 가장 악질적이고 복잡한 수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탁 전세사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위탁자가 이를 숨기고 세입자와 불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권한 없는 자와 계약을 맺게 되고, 보증금 전액을 날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신탁등기가 설정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미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신탁등기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A씨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퇴거를 피할 수 없었다.
문제는 신탁등기의 복잡한 권리구조를 일반 세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공인중개사 역시 신탁등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 중대한 권리 하자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탁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근저당권 설정 물건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한이지만, 담보신탁은 소유권 자체가 신탁사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한 임대인은 사실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고,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이에 대해 정종욱 변호사(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세 가지 법적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째,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둘째, 임대인의 사기행위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형사처벌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이나 권리하자 은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종욱 변호사는 "신탁 전세사기는 일반 전세사기보다 구조가 훨씬 정교해 피해자가 인지했을 때는 이미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사기 피해에는 반드시 골든타임이 존재하므로, 피해가 의심되는 즉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법적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탁 전세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갑구’에 신탁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 전에 신탁 수익자와 신탁회사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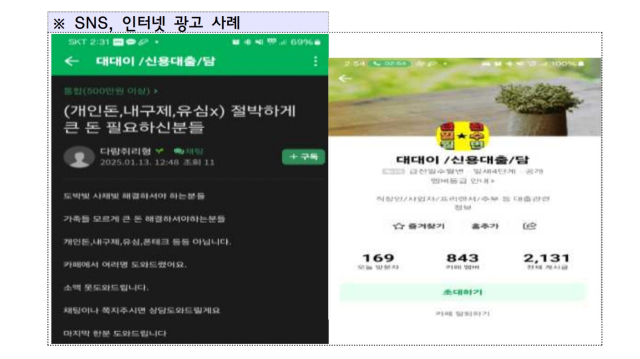


![[샷!] SKT해킹 불안한데 '미확인 피해'까지 퍼져](https://stock.mk.co.kr/photos/20250429/PYH2025042808360001300_P4.jpg)
![[예규‧판례] 심판원, 가정불화로 별거한 기간…장특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해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5632713603_e101b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