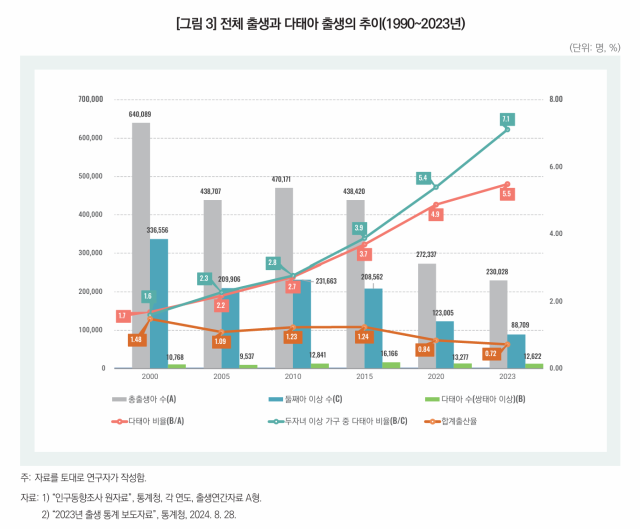“우리는 아직도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2025 생명존중 미디어포럼’에서 백종우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수석부회장이기도 한 백 교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분명 우리나라도 (자살률에)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매년 생명존중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는 자살 실태와 예방대책, 자녀 살해 후 자살 문제를 주제로 다뤘다. 한국의 자살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2004년 이래 경제협력개발국(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해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해 기준 1만4439명으로 잠정 집계돼,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태규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런 숫자에는 빈곤·분노·갈등·무력감 등 우리 사회의 모습이 비춰져 있다”고 말했다.
백종우 교수는 우리나라 자살 지표가 악화하는 이유로 “(개인을 지지해주던) 가족의 힘이 줄어든 반면, 이를 대체할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자살예방 관련 각종 제도가 정비됐음에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입원 제도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살시도자가 피가 나고 다치지 않는 이상 (응급실로) 이송 자체가 되지 않고, 경찰이 가족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소방이 자살시도자를 발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를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법이 2022년 통과됐지만, 문자로 재차 본인 동의를 구하는 탓에 동의율이 20%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반면 대만의 경우 자살시도자를 발견한 의료기관·공무원 등은 시도자 본인 동의가 없어도 반드시 예방센터에 통보해야 해, 등록율이 99%에 이른다. 백 교수는 “자살 고위험군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 체계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은 흔히 ‘동반자살’, ‘일가족 자살’ 등으로 불려왔다.

관련 발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반자살’이 아니라 ‘아동학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등으로 일어나, 사건 발생 전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사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처벌도 솜방망이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원 교수 등 연구진들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121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미수인 경우 61건 중 47건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원 교수는 “살인 혹은 살인미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자살에 대한 동정심과 가족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해자(부모)보다 살해된 아동에 초점을 맞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치료가 더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파식적] 반복되는 전공의 ‘인술(忍術)’ 파동](https://newsimg.sedaily.com/2025/08/26/2GWRZ5Q22Y_1.jpg)




![면허 소지자만 52만, “간호사가 왜 부족해?”… 병원 인력난의 속사정 [수민이가 궁금해요]](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5/202508255117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