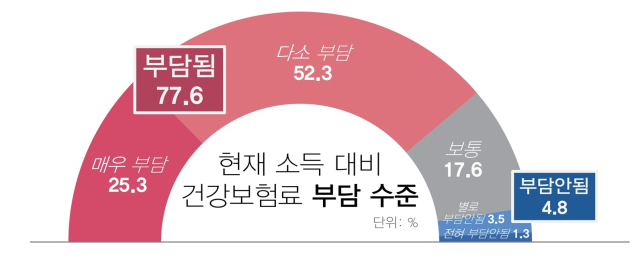1971년 6월 16일 국립의료원의 인턴·레지던트들이 봉급 인상, 공무원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처음에는 1960년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인턴 중심의 파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이경보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표를 낸 의사들을 ‘집 나간 식모’에 비유하는 등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국 대부분의 대학병원 수련의와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사태로 악화됐다. 1차 수련의 파동은 정부가 처우 개선, 의료인의 해외 취업 조건 완화 등의 유화책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다음해 예산 편성에서 수련의 처우 개선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해 9월 2차 수련의 파동이 발생했다.
당시 수련의와 전공의들은 의사이자 피교육자라는 애매한 신분 탓에 지금보다 더 열악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감내해야 했다. 수련의들 사이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술(仁術)’이 아니라 참는 기술인 ‘인술(忍術)’을 배우고 있다는 자조가 나왔을 정도다. 대학병원들은 경영 수지를 맞추느라 값싼 수련의·전공의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당시에는 전문의가 되더라도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1970년을 전후로 주요 의대 졸업생들이 대거 미국행을 택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정준호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지난해 논문에서 “수련의들의 처우에 대한 쟁점들은 미완의 문제로 남아 2014년 하반기에는 내과를 중심으로 한 전공의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의정 갈등 사태도 우리 의료 체계의 취약성을 또 한번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는 매번 전공의들을 앞세워 역대 정부의 의료 개혁 시도를 무산시키고 있다. 또 자신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대한 전공의들의 환멸이 커지면서 지방 병원이나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라도 수련 환경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면허 소지자만 52만, “간호사가 왜 부족해?”… 병원 인력난의 속사정 [수민이가 궁금해요]](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5/202508255117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