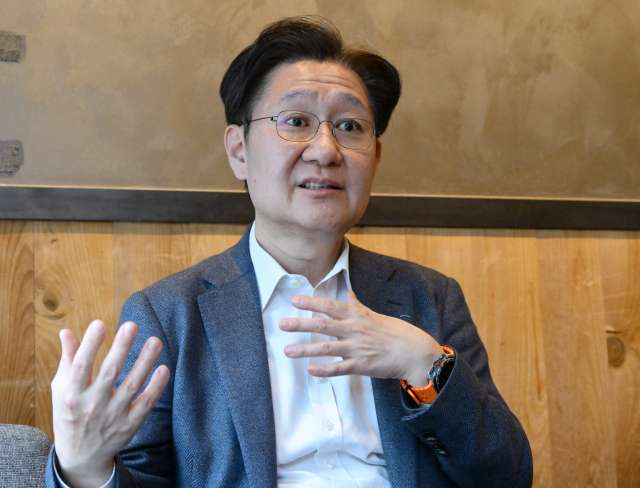김길웅, 칼럼니스트

손은 뇌의 명령을 실행하는 최종기관이다. 일하고. 먹고, 마시며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제일선의 도구다. 손 없는 일상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손의 활동은 창의력과 표현력을 작동해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손 없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그것만으로도 손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글 몇 줄 끄적이다 멈추고,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아 유심히 바라본다. 80평생을 사노라 세파 속에 무수한 일들을 감내하며, 고통을 겪어 온 성실하고 도타운 최전방의 전사들이다. 열 손가락을 가볍게 쥐고 있지만,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억척스러웠나. 일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해내려고, 그래야 그 성과로 성공적인 자락에 나를 올려놓을 수 있다고 깜냥 다해 땀을 쏟았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회상의 공간에 고개를 쳐들어 눈을 빛내고 있다.
내 손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눈앞의 사물을 사생해 색을 올려 미술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어렵잖을 것 같은데도 아름다운 한순간을 카메라에 포획하는 눈썰미도 없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거나 바이올린의 현을 울려 좋은 악음(樂音)을 빚어내는 기예도 지니지 못했다. 무얼 만드는 공작술도, 연장을 잡고 집을 짓는 목수의 야무진 손매도 갖지 못했다. 서예를 하고 싶었는데 실기하는 바람에 축에 끼어보지도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 내 손은 작은 희망의 끈마저 붙들지 못한 채 내려놓고 마는 원체 한심스러운 존재로 낙인찍혀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글을 쓰려고 덤비는 손들 축엔 끼이려나. 그것도 쉰의 나이에 등단해 시와 수필을 쓰는 손으로 백수건달은 가까스로 면했을까. 교단에서 정년 퇴임한 후에도 글을 쓰는 손으로 거듭나 내 인생의 황혼을 글을 쓰면서 매조 지으려 벼르는 중이다. 젊은 시절에 못다 한 창작에의 욕구를 어지간히 채워나가는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충만하다. 자그마치 겪거나 느끼지 못하던 열락(悅樂)의 경지다.
내 책상 앞에 53권의 작품집을 두 줄로 올려 놓았다. 지역 문단의 시인 작가들의 개인 작품집으로 내 작품 해설이 실린 것들이다. 시 수필 시조 아동문학 등에 걸쳐 있는데, 내가 문학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는 영역이다. 간간이 이 작품집들을 눈으로 어루만지며, 작품 해설을 쓰던 때를 더듬곤 한다. 실은 해설에서 평설로 진입한 것인데, 남의 작품을 평하는 것처럼 지난한 작업도 없을 것이다. 호평도 혹평도 안되는 게 그 일이다. 호평은 자칫 자만에 빠지게 할 것이고, 혹평은 자기 작품에 자부심을 갖지 못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리그릇 다루듯 살얼음 디디듯 숨죽여가며 공들여 쓴 글들이다. 열정이 있었으니 가능했을 것이다. 어간, 내 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어느 작가는 “손은 오랜 세월 나를 대변해 왔다. 긴장하면 움켜쥐고, 슬프면 늘어뜨렸다. 간절할 때 두 손을 모았고, 기쁠 때 손뼉을 쳤고, 거절할 때 손사래를 쳤다.”고 했다. 공감한다.
비록 내 손이 나를 대변해 오지 못했다 해도, 늘그막에 글줄이나마 쓰고 있으니, 된 게 아닌가.
내 손에게 감사해야겠다.

![[중앙 시조 백일장 - 4월 수상작] 냉혹한 생존현실 잘 그려, 꾸준한 습작의 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e9d0ead1-7358-471f-b4e9-a350670726bd.jpg)
![[교육칼럼] 감사(感謝)](https://dynews1.com/news/photo/202504/601852_266446_205.jpg)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밤에 우리 영혼은](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7272839652_0b173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