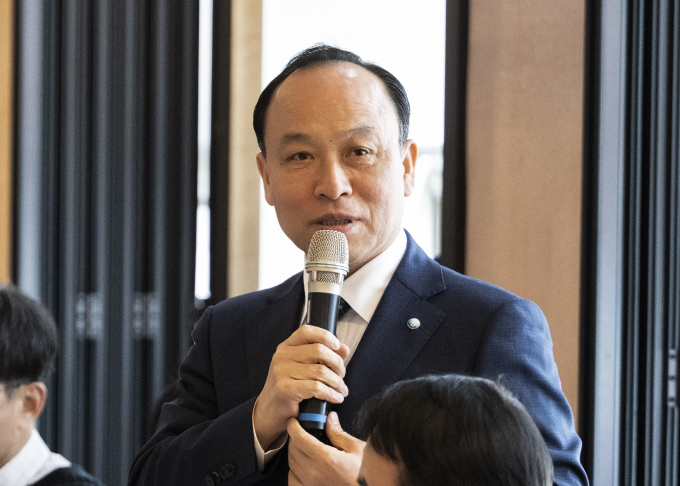린치핀(Linchpin). 수레나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다. 이 핀이 없으면 바퀴가 빠져, 수레나 자동차를 운영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린치핀’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명해졌다. 그래서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외교적 의미로 확장해 쓰이기도 한다.
원전 이용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2023년 말 25개국 정상이 모여 ‘2050년까지 원자력 용량을 지금의 세 배로 늘리기’로 합의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다. 지난해 열린 제29차 회의에선 6개국이 추가로 동참했다.
원전 이용 확대에 따라 농축우라늄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핵연료 제작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은 우라늄-235 비율을 높이는 농축 공정을 거쳐 만든다. 그런데 최근 수요 증가로 인해 지난해 우라늄 농축 서비스 가격이 2018년 대비 5배나 치솟았다. 여기에 농축도가 높은 우라늄 수요도 발생했다.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핵연료 교체 주기는 대형 원전보다 긴 30~40년이다. 이 기간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 농축도를 5~20%까지 높인 고순도 저농축우라늄을 쓴다.
그런데 시장이 불안정하다. 농축우라늄은 농축도에 따라 핵무기 원료 물질로 사용될 수 있어 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은 러시아·중국·프랑스 등 제한된 수의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 기술 장벽이 높아 신규 시장 진입도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농축우라늄 시장에서 큰손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수요 증가에 맞춰 농축우라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도 농축우라늄의 안정적 수급 체계 마련이 절실해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2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4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3기의 대형 원전과 1기의 SMR이 추가된다. 국내 전력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이들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농축우라늄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핵연료 공급사인 센트루스와 맺은 농축우라늄 공급계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간 이뤄진 최초의 원자력 협력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양국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전 이용 확대를 위한 린치핀을 제대로 꽂았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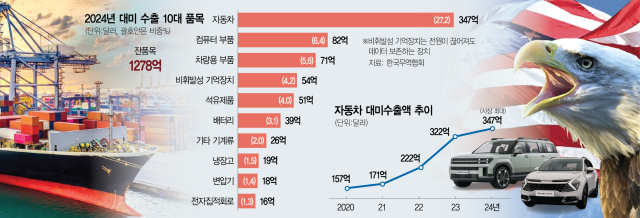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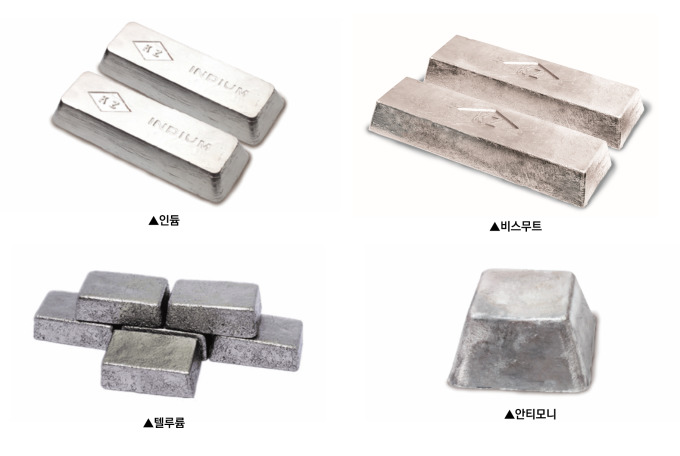
![[트럼프發 관세전쟁] HBM 美 수출 늘어나는데…반도체도 타격 불가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1/news-p.v1.20250211.efb60745e2f04599880188314e8046d0_P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