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엔 정치적 논리가 기존 질서나 시장경제, 상식을 빗겨 압도할 때가 있다. 우버나 타다 논란이 그랬고, 지금도 중소기업 혜택을 누리려 우산을 벗어나지 않는 피터팬신드롬이 엄존한다.
통신시장 역시 그렇다. 알뜰폰이란 엄연한 시장과 이용자가 존재하지만, 경쟁 이외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대기업이란 이유로 그들이 운영하는 알뜰폰 자회사들은 전파사용료 납부 같은 '책임과 역할'만 떠맡다시피 한다. 다른 중소 규모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사실상 무임승차에 가까운 사업을 영위한다.
문제는 알뜰폰도 엄연한 시장이란 점이다. 가령, KT의 알뜰폰 자회사인 KT엠모바일은 지난 1분기 전파사용료로 19억9600만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이는 이 기간 알뜰폰사업자 전체가 낸 전파사용료 총액 60억3800만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입자 170만명을 보유한 1위 사업자라고 하지만, 1위 업체라해서 해당 사업자 전체가 내는 전파사용료 33%를 내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징수에 가깝다.
반면, 이통3사 자회사가 아닌 여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1분기에 51억원 가량 전파사용료를 면제 받았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중소·중견 사업자들에게 전액 감면해주던 것을 올해 20% 부과 의무만 지도록 했지만, 이는 누가보더라도 생색내기에 가깝다.
여기에 먼저 언급한 정치적 논리가 덧대진다. 국회는 아예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렇다면, 시장은 있으되 경쟁은 무의미해진 것이고, 가입자는 존재하되 서비스 혁신과 혜택은 등한시될 수 밖에 없다. 경쟁이 경쟁 답게 이뤄지지 않고 징수에 가까운 부담을 져야하니, 가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통신이 아무리 규제산업이라곤 하지만, 그 잣대가 알뜰폰 영역까지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중소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진흥과 육성책을 아무리 내본들, 그 효과는 사업자별로 자율 경쟁으로 내놓는 요금이나 서비스 혁신으로 유발되는 긍정효과를 절대 넘어서지 못한다. 왜 경쟁이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놓고, 정치 논리로 푸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책당국이나 정치권은 왜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인 LG헬로비전이 해당 사업자 이익단체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서 탈퇴하려고 곰곰히 되씹어보길 바란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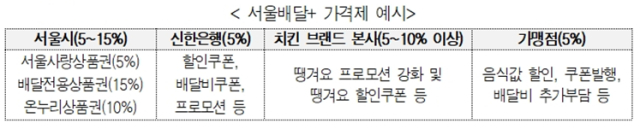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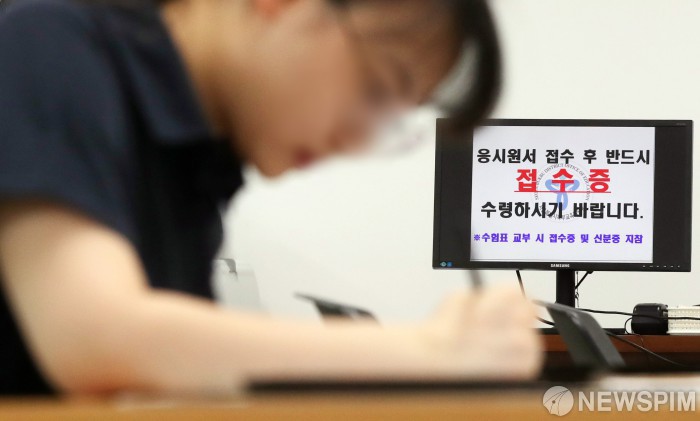

![[단독] “백종원 믿었는데…” 더본코리아 점주들, 집단소송 움직임](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4/2025050450528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