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9월 뜬금없이 유출된 삼성전자 기술연구소 내부 CCTV(폐쇄회로TV) 영상에 전 세계가 들썩였다. 외계인이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제품 개발에 매진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가벼운 농담 정도로 여겨지던 '삼성 외계인 납치·고문설'의 실체가 확인된 순간.
물론 고도의 마케팅이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글로벌 가전 전시회 'IFA 2013' 개막 직전 언팩 행사를 열고 신제품 '갤럭시노트3'와 스마트워치 '갤럭시기어'를 띄울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익살스러운 콘텐츠를 풀어 단숨에 시장의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가져왔다.
삼성이라 가능했던 시도가 아니었나 싶다. 탁월한 선구안과 추진력으로 유명한 이건희 선대 회장이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던 시기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던 이들이었으니. 어찌 보면 홍보를 빌미로 삼성만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과시한 것으로도 비친다.
하지만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현재 삼성전자 사업장과 구성원의 머릿속에서 '외계인'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듯하다. 혁신과 도전정신은 사라지고, '과연 지금도 우리가 최고냐'는 회의감과 불안, 익숙해진 패배에 모두가 강하게 짓눌린 모양새다.
'3분기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이라는 성적표 한 장에도 삼성전자는 한없이 작아졌다. 사실 단일 기업 중 한 분기 10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남기는 곳은 전세계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내로 국한하면 삼성전자뿐이다. 그럼에도 AI(인공지능) 트렌드가 만들어낸 이 좋은 흐름 속에 더 벌어들이지 못하고 기대를 저버렸다는 데 자책하며 소비자와 투자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반도체 소방수' 전영현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의 입에선 드디어 '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사과문이 전영현 부회장 명의로 나왔다는 데서 확인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현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반도체다. 주력인 이들 사업의 부진이 조직에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데 시장이나 임직원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삼성 반도체는 올해 영 신통찮다. 2년 만에 찾아온 회복 국면 속에 좋은 제품을 만들지도 제대로 팔지도 못하며 돌연 상승궤도에서 이탈했다.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는 HBM3E 12단 제품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높은 벽에 가로막혔고, 가장 잘 만드는 D램도 6세대(1c D램) 양산을 고민하다가 SK하이닉스에 추월을 허용하며 체면을 구겼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터질 게 터졌다고들 한다. 뒤처진 기술력과 1% 부족한 영업 마인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경영진의 보신주의로 조직이 곪을 대로 곪았는데, 역설적으로 호황기에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전언이다.
직원의 말을 종합하면 이 '총체적 난국'은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3~5년 연구개발 투자를 등한시 한 경영방침이 기초체력을 갉아먹었고 영업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구성원들은 증언한다.
실제 삼성전자는 김기남 전 부회장(현 종합기술원장) 시절 비용 절감을 명분 삼아 새로운 기술이나 소재 등도 최대한 도입을 늦추고 연구부서 예산도 대거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HBM 개발이 늦어졌을 뿐 아니라 인력 상당수도 경쟁사에 빼앗겼다.
그 결과 현재 삼성전자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수율이 대표적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 직원은 자신이 파악하기로 1c D램의 경우 수율이 한 자리에 불과하며, 이재용 회장의 역작이라는 파운드리 역시 그 숫자가 30%에 수렴한다고 주장했다.
패착은 영업력 악화로 이어졌다. 기술이 부족하다보니 거래처가 원하는 조건이나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은 탓이다. 결국 삼성전자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 제때 자금을 투자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은 스스로도 자신들의 제품을 외면한다는 데 있다.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에 채택되지 않는 게 이를 방증한다. 과거 삼성전자는 갤럭시S 22 시리즈에 엑시노스 2200을 탑재했다가 발열과 성능 저하 논란에 휩싸이자 차기작부터 다시 퀄컴 스냅드래곤으로 선회했다. 지금은 우리나라 등 일부 시장에서만 엑시노스를 교차 탑재하는 수준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하고 있다. 개발 중인 신제품 갤럭시S 25에도 스냅드래곤이나 디멘시티가 엑시노스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인식이 짙다.
이렇다보니 직원 사이에선 삼성전자가 쇠퇴기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소니나 노키아, 모토로라도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 삼성전자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경영진은 여전히 귀를 열지 않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시중에 판매된 휴대전화 15만대를 회수해 삼성전자 구미공장에 운동장에 쌓아놓고 임직원 2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른바 '애니콜 화형식'이다. 당시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자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그리고 이는 훗날 삼성전자 '갤럭시 신화'의 밑거름이 됐다.
현 시점 삼성전자의 모든 구성원이 되새겨야할 장면이 아닌가 싶다. 조직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문제를 확인했다면 과감히 털고 앞으로 나가야 할 때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재용 회장은 과연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 그 대상이 '직원의 열정'이라는 허무한 무언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리사 수, 나델라, 이재용의 10년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https://newsimg.sedaily.com/2024/10/13/2DFJXV4TGM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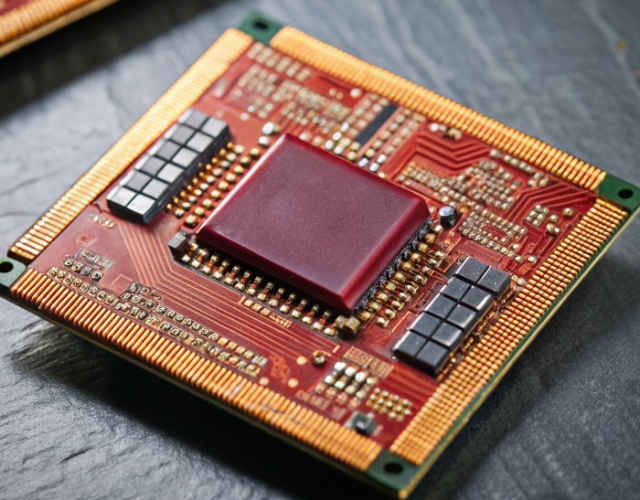
![[기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산업구조 전환](https://img.newspim.com/news/2024/10/14/2410141408008140_w.jpg)


![강소기업의 ‘이 나라’ 멈추면 벤츠·BMW도 없다...‘히든챔피언’ 폐지 한국은 중기육성 의지 있나 [기자24시]](https://wimg.mk.co.kr/news/cms/202410/14/news-p.v1.20241014.ac066b9c7fc1488a83e6575f24801fb8_P1.jpg)


![[ET시선]클라우드 '원팀'이 필요하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10/16/news-p.v1.20231016.6ef7faaf461e40379abae86f117b2e96_P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