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전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은 중국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수립했다. 당시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을 설립해 중국과의 연구 교류를 위해 칭화대를 방문한 필자는 이들이 집성한 책자를 선물로 받았다. 대단한 비전과 전략이 담긴 책자도 아니어서 중국 공산당의 일상적인 선언으로 이해했다.
다음 해인 2016년 봄 중국 제조업의 중심인 광둥성의 선전을 중국과학원 초청을 받아 방문했다. 당시 선전은 세계 1위의 드론 기업으로 부상한 DJI 때문에 고무되어 있었다. 화웨이 본사가 있는 이 도시가 세계 1위가 된 드론 스타트업을 내세워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다. 이런 이유로 선전은 창업 경험이 있거나 실용적 연구를 하는 해외 학자들을 천인계획을 통해 유치하고 있었다. 필자도 이런 초청을 받았지만 사양했다. DJI도 선전에 인접한 홍콩과기대 리저샹 교수의 지도를 받은 프랭크 황이 설립한 회사다. 중국에서는 성끼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워야 할 점이다.
중국, 전세계 상품 3분의 1 생산
고도화된 ‘규모의 경제’ 압도적
6월 출범할 새 정부가 할 일은
제조와 AI 접목해 경쟁력 키워야

오바마 정부 말기였던 2016년 봄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수면 아래에 있었다.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리저샹 교수는 미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한가운데인 팔로 알토에 DJI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되고 DJI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사라졌다.
DJI 방문 후 선전의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사 BYD가 생산한 세계 최초의 전기 택시를 시승했다. 테슬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선전의 BYD에 대한 지원은 확실했다. 선전시는 버스도 BYD 전기버스로 모두 대체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2011년 창업한 CATL이 세계 제일의 배터리 기업이 되었지만, 당시는 BYD가 중국 제1의 배터리 기업이었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을 앞설 때였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전기차와 그린 에너지 생태계의 기본 요소인 배터리 산업에서 압도적인 패권 국가가 되었다. 우선 전 세계 배터리의 75%를 중국이 생산한다. BYD는 전기차 생산량에서 테슬라를 앞질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물론 독일과 일본, 한국의 자동차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 CATL과 BYD 등은 완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셀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했다. 기술력과 특허도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공과대학에 대한 우선적 지원 정책 때문에 배출되는 수많은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을 채우기 때문이다. 이들은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채굴, 정제, 부품 생산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례로 BYD와 CATL은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이미 자원을 선점했다. 트럼프 정부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높은 관세율은 인도네시아를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보는 미국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 개혁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18년 봄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중국 산업을 세계 최고로 이끌 사명을 진 중국 제1의 칭화대학에 대한 국제 평가를 시작했다. 필자를 비롯해 이 국제평가에 참여한 해외 학자들 앞에서 칭화대 교육부총장이 말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추격자였지만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 서양과 다른 중국의 공산당 지배 구조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허난성의 정저우는 역사적으로 황허 문명의 중심이자 중국의 동서와 남북 고속철도망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다. 이 도시는 애플의 위탁 생산기업인 타이완의 폭스콘이 아이폰의 80%를 생산하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145% 초고율 관세는 아이폰에 바로 적용된다. 애플은 생산 시스템을 관세가 낮은 인건비가 비슷한 인도로 옮기거나 고도의 자동화를 통해 미국으로 가져와야 하지만,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자동화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투자를 고려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장과 공급망을 늘려왔다. 전 세계 상품의 3분의 1을 제조하는 중국의 제조 역량은 미국과 일본, 독일, 한국 합친 것보다도 많다. 그 결과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매년 1조 달러에 이르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차적으로 무역 적자를 줄이고 관세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과 제조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방 국가들이 제조패권국가 중국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미국 조선업의 예에서 보듯이 제조업이 밀리면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방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총성 없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어차피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두 세계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패권국이 되어버린 중국의 고도화되고 있는 규모의 경제를 당할 수 없다. 미국에 부족한 제조업을 미국이 앞서 있는 AI와 휴머노이드 기술을 흡수해 고도화함으로써 우리만의 경쟁력을 살려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마침 미국 실리콘밸리에 중국이 밀려난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것은 6월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다.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명예교수(초대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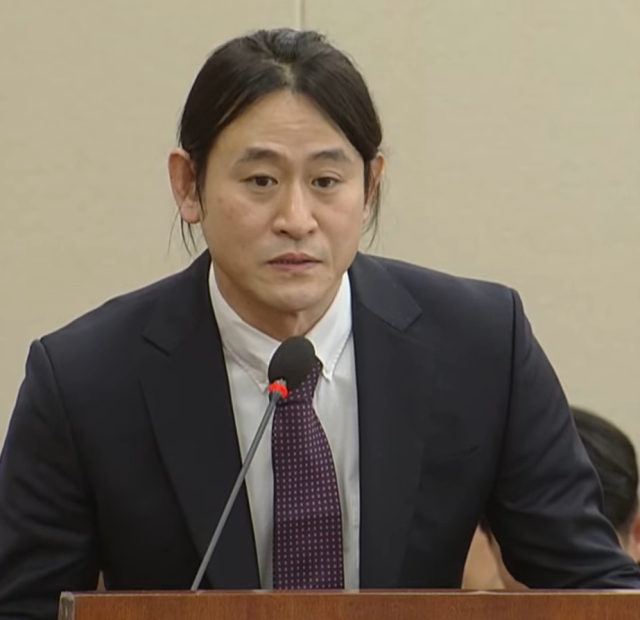
![[인터뷰] 쿼라니움 "양자 기술 준비,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528_60988_2447.jpg)
![[AI 인재(上)] "AI 3대 강국 제시했지만"…투자 '뒷걸음'에 인재 유출 '속앓이'](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434032601_54c20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