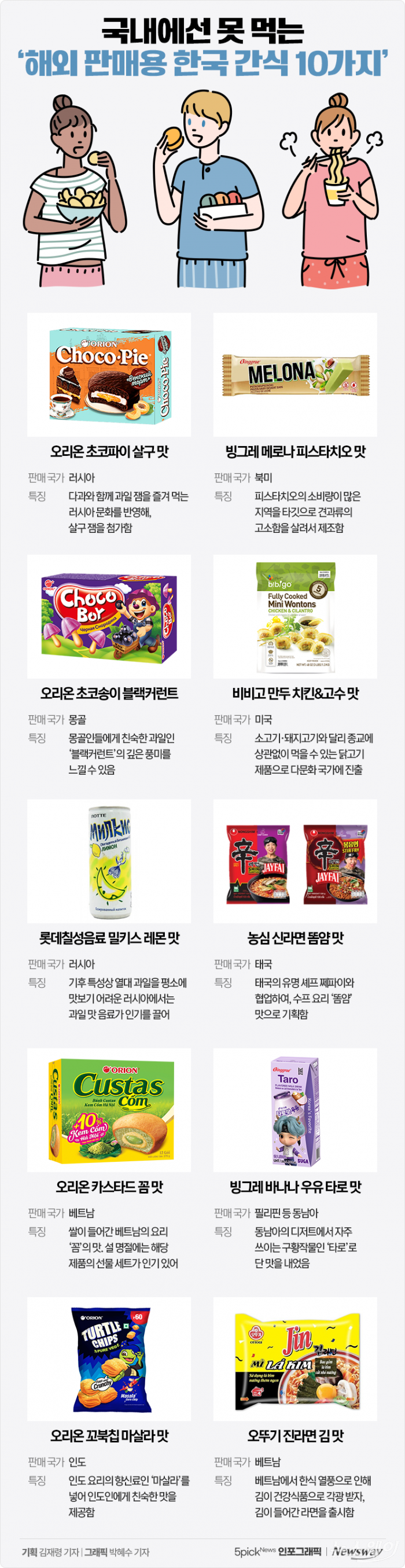“오이채·무·참버섯·석이·표고·송이·숙주나물은 생으로 하고, 도라지·거여목·박고지·냉이·미나리· 파·두릅·고사리·승검초·동아·가지·날꿩고기를 삶아 실처럼 찢어놓으라. (중략) 간장으로 볶거나 섞어 큰 대접에 놓고 즙을 뿌리되 알맞게 하여, (중략) 도라지와 맨드라미 붉은 물 들여서 하고, 없거든 머루로 물들이면 붉나니라. 이것은 부디 갖은 색을 다하란 말이다.”
이 글은 조선시대 여중군자(女中君子) 장계향(張桂香, 1598∼1680)이 1670년경 지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요리책 ‘음식디미방’에 나온다. 음식 이름은 ‘잡채(雜菜)’다. 한자로 여러가지 재료를 섞은 음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면이 들어간 잡채와는 다르다. 350여년 전 요리법이라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여러 책에 실린 잡채 요리법에도 당면은 보이지 않는다.
당면(唐麵)은 한자로 중국의 국수란 뜻이다. 중국인은 당면을 ‘펀탸오(粉條)’ 혹은 ‘펀쓰(粉絲)’라고 부른다. 고구마나 감자 전분에 뜨거운 물을 붓고 풀처럼 묽게 반죽한다. 반죽을 저으며 40℃ 정도 되는 더운물을 더 붓고 치댄다. 국수틀에 눌러 뽑은 가락을 끓는 물에 넣었다 건져 식힌다. 이를 햇볕에 말리면 당면이 완성된다. 1920년대초 황해도 사리원시 등지엔 조선인이 운영한 당면공장이 있었다. 화교가 주인인 중국음식점에서 조선인 손님은 실처럼 가늘게 썬 돼지고기를 채소, 익힌 당면과 함께 식용유에 볶은 ‘차오러우(炒肉)’라는 메뉴를 ‘잡채’라고 부르며 즐겨 먹었다.
그러자 조선인 가정에서도 당면을 넣은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리법은 중국음식점과 약간 달랐다. 방신영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 교수가 쓴 ‘조선요리제법’ 1921년 판에는 도라지·미나리·황화채·돼지고기·표고버섯 등을 실처럼 길게 썰어 기름에 볶은 다음, 삶은 당면을 넣어 버무려 만든다고 적혀 있다. 중국음식점 잡채가 재료를 한꺼번에 볶아낸다면 조선식 잡채는 볶은 부재료에 당면을 버무리는 방식을 택했다. 1930년 3월6일자 ‘동아일보’ 5면에는 송금선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가정과 교사가 소개한 잡채 요리법이 실렸다. 이 역시 방신영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가 강조한 대목은 일본식 간장을 넣고 버무리면 맛이 더 좋다고 한 점이다. 오늘날 잡채를 만들 때 조선간장이 아니라 양조간장을 사용하는 역사가 그즈음부터다.
잡채가 한국화된 결정적 사건은 1937년 7월7일 일본이 중국 동북지역을 침략한 중일전쟁이다. 1937년 9월20일자 ‘동아일보’ 1면 칼럼 ‘횡설수설’은 “중일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성(지금의 서울) 시내 중국음식점이 8할 이상 폐·휴업!”이라고 보도했다. 중일전쟁 전 경성에 있던 중국음식점 수는 294곳이었는데 겨우 50여군데만 남은 것이다. 칼럼 필자는 “우동·탕수육·잡채는 고만두고 그렇게 흔하고 천(賤)하던 호떡조차 맛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원래가 조선인의 식성에 맞고 또한 대중적이라 많이도 먹던 것이 일시에 절영(絶影·그림자조차 완전히 없어짐)되매 애식자(愛食者·즐겨 먹는 사람) 때때로 생각함도 무리가 아니겠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먹고 싶으면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해방 이후 당면잡채는 한식의 으뜸이 됐다. 2021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엔 ‘japchae(잡채)’가 등재됐다. 외국인도 한식 잡채를 맛있게 먹는다는 증거다. 수백년 동안 길게 썬 온갖 색 재료를 즙에 무쳐 만들던 잡채는 불행한 식민지 시기에 중국과 일본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글로벌푸드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래도 변하면 안되는 본질은 장계향이 강조했듯, ‘갖은 색’ 재료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잊지 말자.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음식 인문학자


![[오늘의 언박싱]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제로슈거 커피믹스’·한솥도시락, ‘제.많.덮’ 2종 外](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6097_1738542943_m.jpg)
![[기자의 눈] 한식의 고급화는 경험 너머의 체험](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04/144d5cc9-fc8b-400d-a455-0475c9b7f8e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