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열, 시대를 쓰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었지만,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지 1년이 되어 간다.
요즘도 햇살이 이우는 저녁 무렵이나 울적할 때면 술 생각이 가끔 나지만 가족들의 성화나 의사의 강력한 경고를 떠올리면 참아야 한다. 한창 술 마실 때는 달랐다. 정신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을 봐야 술 마신 것 같았다. 술 마실 일이 안 생겨서 안 먹지, 술 먹으면 안 된다 싶어서 안 먹은 적은 없다.
1980년대 중반에 이미 그때까지 마신 소주의 총량을 계산하면 8t 트럭 한 대 분량, 모든 주종(酒種)을 합치면 웬만한 풀장은 채울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10대 중반부터 제법 마시기 시작했으니 20년간 마신 술이 그렇다는 거였다.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름 그럴듯한 계산법이 있었다. 모주꾼이라는 호칭을 마다치 않다 보니, 소주병이 아니라 소주병 뚜껑만 모아도 8t 트럭 한 대는 된다는 오보(誤報)가 나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마셨다면 몸이 남아났겠나. 아무튼 그 많은 격전을 치르고도 술통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80년대 이천 작업실 떠들썩한 술자리

전성기는 80년대 후반이었다. 내가 이천에 작업실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86년, 87년 무렵에는 한번 시작하면 며칠씩 계속된 떠들썩한 술자리가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일종의 사육제(謝肉祭) 같았던 그 술자리를 같이했던 사람들로 선배들 패로는 김원일·김주영, ‘아베의 가족’을 쓴 전상국 같은 이들이 있다. 각자 한 가락씩 하는 중견 작가들로 예닐곱 명쯤이었다. 내 또래로 김원우·박영한·김성동·윤후명·유익서 등 주로 ‘작가동인’ 활동을 함께했던 이들이 찾아왔다. 훗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쓴 소설가 이윤기, 후배 작가들로 하일지·심상대·박상우·이순원·구효서, 98년 부악문원을 문 열기 한참 전부터 내 작업실을 지키며 습작하던 최용운·엄창석·박석근 등 이른바 대사형(大師兄)들까지 많을 때는 스무 명 남짓 술꾼들이 모였다.
술은 막걸리. 마을 할머니 중에 막걸리를 담그는 분이 계셨는데 쌀 한 말을 맡기면 막걸리 네댓 말이 나왔다. 안주는 개장국을 가끔 준비했는데,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작업실 마당에 커다란 솥을 걸어놓고 끓였다. 막걸리 다섯 말이면 80~90L쯤이니 술꾼 스무 명이 2~3일 실컷 먹을 양의 술과 안주였다.
막걸리를 단지째 갖다 놓고 며칠씩 마시다 보면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막걸리가 떨어지면 ‘진배기’라고 해서 물을 덜 타 보통 막걸리보다 알코올 도수가 4~5도 높은 막걸리를 구해다 마셨는데, 그럴수록 사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술자리 유행어 중 하나가 술 잘 먹는 작가가 글도 잘 쓴다는 거였는데, 모두 글 잘 쓰고 싶었던지 뻗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새마을 주택이라고 부르던 농가 주택을 개량한 당시 작업실에 작은 방 두 개를 덧댔는데, 인사불성인 사람들을 눕혀 놓는 영안실, 그보다는 덜 취해 여전히 술 욕심을 부리지만 더는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몰아넣는 회복실로 활용했다.
개장국 솥 이름은 ‘귀천욕부’
나는 개장국을 끓이는 솥에 장난삼아 ‘귀천욕부(歸天浴釜)’라는 한자 이름을 붙였다. ‘하늘로 돌아갈 때 목욕하는 솥’이라는 뜻이었다. 지금은 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으로 제한하지만, 당시에는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 식용 문화를 비판할 때였다. 한 번은 르몽드 기자이기도 한 프랑스 시인이 찾아왔다. 그는 한자를 웬만큼 아는 사람이었는데 귀천욕부의 뜻이 알쏭달쏭한 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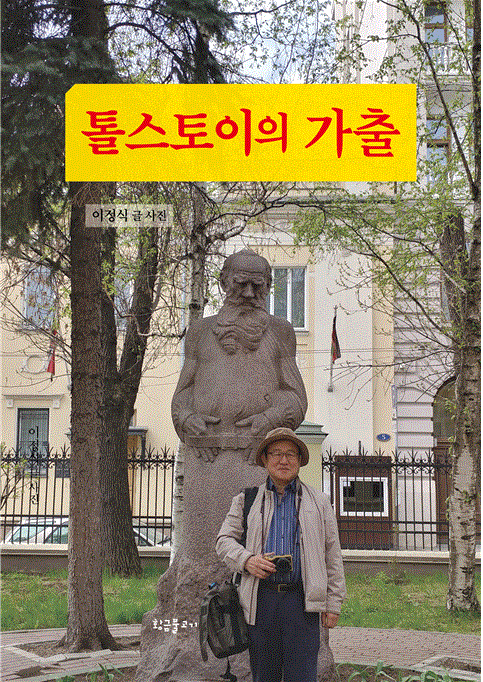




![[Lite] 🌋 분노, 어떻게 하는 거더라?](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422465/83757_17115237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