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피고인, ‘자살’이라는 단어를 열 번만 연이어 외쳐보세요.
2007년 2월 7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3부 재판에서 재판장이 뜬금없는 주문을 했다.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혀 기소된 피고인은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재판장의 권유가 몇 차례 이어진 뒤에야 그는 주문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자살자살자살자살...
그의 낭독이 끝나자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이 외친 ‘자살’이 우리에겐 '살자'로 들립니다.
법정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피고인의 방화는 자살을 위한 수단이었다. 카드빚 3000만원을 갚지 못한 처지를 비관한 끝에 해서는 안 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재판장의 발언은 이어졌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책을 읽어 보고 난 뒤에나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신문 지상을 통해 한때 세간에 널리 회자했던 이야기다. 지금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때 그 재판장이 문형배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 ‘살자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탄핵심판 인용)과 ‘살자’(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으리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까, 반대할까. 여기 한 법관의 도발적 장담이 있다.
장담의 근거는 무엇일까. 탄핵심판 결과를 조금이라도 점쳐본다는 차원에서 문 재판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자.
‘어른 김장하’, 빈농의 자식을 법관으로 만들다
그의 초년은 위인전 구조 그대로다. 문 재판관은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너무 가난해 친척들로부터 낡은 교복과 교과서를 물려받으면서 겨우 중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빈농의 자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등학교는 쉽지 않은 장벽이었다. 그때 ‘귀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법관 문형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때 그가 밝힌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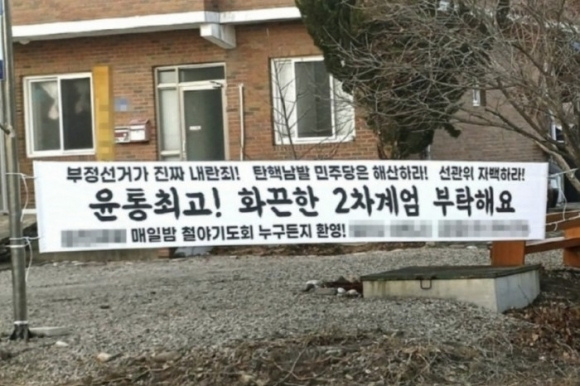

![[속보] 尹측 "대통령, '체포하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9/8531b7a3-d34e-4dba-8003-c5b176db3290.jpg)

![뻔하지 않은 독립운동 뮤지컬, ‘스윙데이즈_암호명A’ [D:헬로스테이지]](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11038_1442968_m_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