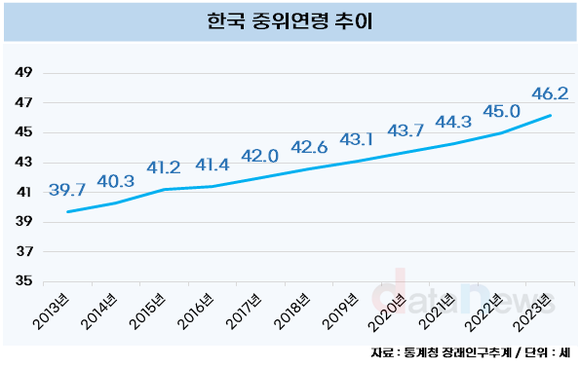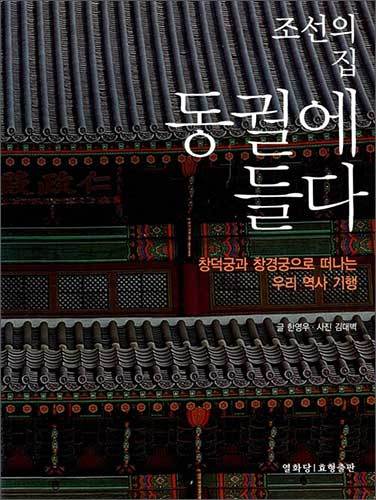“지방소멸이라는 말 좀 제발 안 썼으면 좋겠다. 사라질 동네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방사능 폐기장에서 키우는 느낌이다.” 지난달 28일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에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이 소개한 지역의 한 젊은 부부의 말이다.
‘지방소멸’은 일본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에 내놓은 책 <지방소멸>에서 처음 쓰였다. 한국에도 유행이 됐다. 각종 ‘지방소멸 지수’가 만들어졌다. 2021년에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강남, 광진, 관악, 마포만 생존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작 원조 격인 <지방소멸> 책에는 ‘소멸지수’라는 말이 없다. 2040년까지 20대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 자치단체 896개를 ‘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뿐이다. ‘소멸’이라는 말이 충격을 주지만, 지역은 사라지지도 않는다. 감사원 보고서에서 100년 뒤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았던 전남 고흥조차도 인구추계상 2117년에 여전히 1만9184명이 산다.
이 연구원은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이 인구감소가 아닌 인구이동이라고 말한다. 특히 청년층 인구가 지역에서 계속 유출되는 반면, 서울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방소멸> 역시 인구감소는 반드시 오지만 대도시만 살아남는 ‘극점사회’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쿄를 두고 ‘인간을 소비하는 도시’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사람들을 빨아들여서 지방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 나라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킨다”면서 “그런 곳에 젊은이들을 더 모으려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소멸시키려는 음모”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도쿄권의 면적이 전국의 3.6%인데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산다고 한탄하는데, 전국 대비 면적이 0.6%인 서울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산다.
인구이동이 문제임에도, 각종 ‘소멸지수’는 출생률이나 20~30대 여성의 숫자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산출한다. 지표로 지자체 간 줄 세우기 해 봤자 결국 서로 간 인구 빼내기 전쟁이 될 뿐이다. 이 연구원은 “일원적 수치로 단순화된 순위는 의미가 없으며 대응 방안을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순위 매기기를 좋아하는 한국 사회에서 주목받는 건 지표뿐이다. ‘소멸’ 지역 당사자들은 상처만 입는다.
<지방소멸>은 ‘지방중핵도시’를 육성해서 인구유출의 방어·반전선을 구축하자고 말한다. 한국의 지자체들은 청춘남녀의 ‘만남 주선’ 열풍에 빠져 있다. 공무원까지 동원했다고(경향신문 10월30일자 8면 보도)도 한다. 그런 안간힘까지 비난하고 싶진 않다. 다만 지역이 보람 있게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일까 하는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가 ‘산업 가부장제’라는 개념으로 지적했듯이 지역에는 여성이 커리어를 쌓아나갈 만한 일자리가 남성에 비해서도 부족하고, 경력 단절도 당연시 여겨진다. 일자리를 곧 ‘시민권’이라고 여기는 2030 여성들에게 지역은 ‘탈출’해야 할 곳이 돼 버렸다. 청년층 인구 유출의 핵심 고리 중 하나다. 지방소멸 지수와 만남 주선 성공률 계산만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수치 없이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수치만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다.”(<팩트풀니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