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학 사회는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이 지식 전달 기관으로서의 '왕' 역할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됐다. 대학 재정 위기도 대학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지만 대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학은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온라인 교육과 대안고등교육의 성장은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물론 대학이 취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부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졸업생들이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런 대학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현실이 진실'인 것이다.
교육혁신의 수혜자는 학생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중 하나는 교과목 수강을 위한 강의실이 아닐까. 강의혁신이 이루어져야 교육혁신이 가능한 이유이다.
학부 졸업 후 졸업생들은 대부분 사회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진출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사회진출경쟁력을 갖춘 졸업생은 질 좋은 취업, 대학원 진학, 창업, 사회 혁신가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이 가능하다.
ICT 발전과 함께 클릭 한 번이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시대이다. 어느 전공이든 졸업생들이 사회진출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해외 유수의 대학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실제(real-world)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대학 중 모든 전공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기반 학습(PBL) 교육을 대학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학이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대학이다. 1976년 설립 이래 문제 기반 학습은 마스트리히트 대학 교육의 중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문제 기반 학습의 유럽 창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최근 연구 주제 또는 기업 및 기관에서 제시한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교육 원칙은 전통적인 대학 교육과 다른 학습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교과목을 수강하는 동안 학생들은 소규모 팀으로 나뉘어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지식을 제공하고 동기 부여를 강화하며 21세기 노동 시장에 필수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 혁신이 대학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세계대학 평가를 살펴보면 2024 THE 평가에서 136위인데 한국 대학 중 이 순위 보다 높은 대학은 3개 대학이다. 2024 QS 평가에서는 256위인데 이보다 순위가 높은 한국 대학은 7개 대학이다.
마스트리히트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이지만 설립 당시부터 모든 전공에 PBL을 도입시켰기 때문에 PBL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기본이다. PBL 의무화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국 대학에서 마스트리히트 대학처럼 PBL을 모든 전공에 적용하도록 할 경우 교수자의 자율성을 훼손시킨다는 명분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학생들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규제'도 필요한 것이다.
필자가 2017년 만든 IC-PBL(Industry-Coupled Project/Problem-Based Learning)도 강의혁신을 위한 산업연계 교육혁신플랫폼이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어져 많은 재정 투입이 요구되며 일부의 학생들이 접하고, 재정지원이 끊기면 종료되기를 반복하는 특별프로그램이 아니다. 일반 교과목 강의에서 사회(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강의내용, 강의방법 혁신이 이루어져야 재정 부담 없는 지속 가능한 강의 혁신이 가능하다.
산(産)은 이공계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 전공과 관련된 기관(기업)을 의미하며, 사회 전체를 내포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IC-PBL을 적용 못 할 전공은 없다. 어느 전공이든 간에 학생들이 졸업 후 본인의 전공과 연계되어 진출하고자 하는 기관(기업)과의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대학에서 산학연계 교육을 추진할 때 비이공계 교수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필자가 공대 출신이라 산(産)을 강조한다는 것이었다. 음악산업, 문화산업, 예술산업, 스포츠산업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느 전공이든 학생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질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대학의 당연한 책무이다. AI가 사회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AI와 연계된 강의 혁신이 필요한데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겠는가.
강의혁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자는 없을 것이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며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하고 현란한 구호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문제는 강의실에서 강의 혁신을 실천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강의 혁신을 통해 진정한 교육혁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지속 가능한 교육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대학의 존재 이유이다. 강의혁신 없는 교육혁신 구호는 허상일 뿐이다.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전 한양대 총장) wskim@hanyang.ac.kr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 한국산학협력학회장, 제15대 한양대 총장을 거쳤다. 현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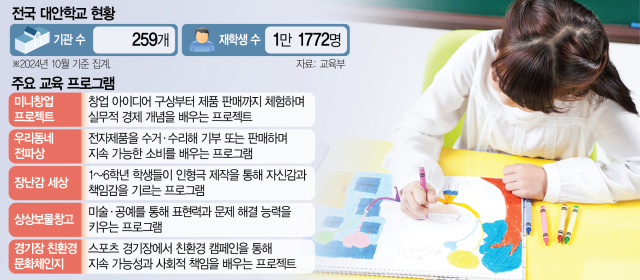
![[이종호칼럼] AI교과서, ‘개천의 용’ 키울 발판 삼자](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509481.jpg)
![[에듀플러스]“첨단산업 인력 양성, 학과 분류 정책 변화 필요해”](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31/news-p.v1.20250131.fc3efd8fdb624d8e91404df4ba973ade_P1.png)
![효율성 높은 AI 개발 시대 개막… 신입 직장인 기회와 도전 공존 [AI PRISM*주간 신입 직장인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2/02/2GOTARGDZB_1.jpg)

![“양자컴 기술력 뒤진 韓, 응용 분야에 더 투자해야” [세계는 지금]](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30/20250130511211.jpg)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22〉혁신의 기술 시대를 여는 서막(하)](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31/news-p.v1.20250131.bf1398c8e2ef448cab173c5b4897ca47_P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