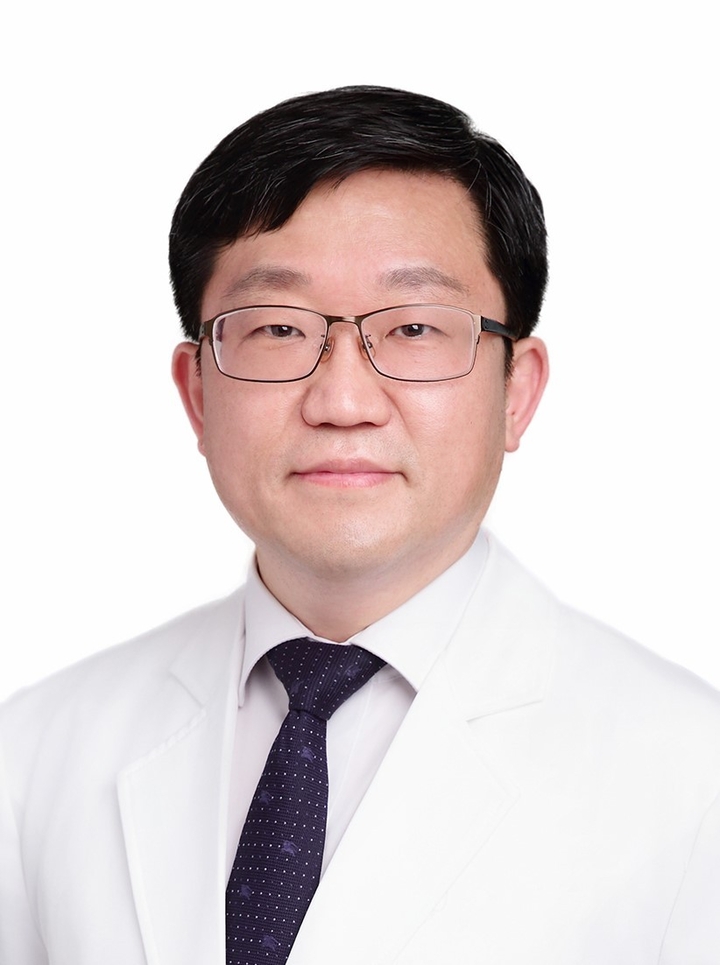노후 주거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어디서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임종. ‘사망하기 직전’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의미하며,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녀가 곁에서 지켜보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오늘날 의료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임종 과정은 상상하기 힘들다. 의료 기술의 발전,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 공동체 약화, 시장 논리, 죽음 회피라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결과다. 특히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죽음조차 관리·치료·연명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임종 과정이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가 아닌 ‘의료적 사건’이 된 것이다. 이제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어 병원·요양시설 등 전문 공간에서 상품과 서비스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린 시절 마주했던 할머니의 임종 장면이 떠오른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동네 의원 의사가 왕진을 와서, 임종이 다가왔으니 가족들을 부르라고 한다. 그렇게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숨을 거두셨다. 대문에 ‘상중(喪中)’이라고 쓰인 조등이 걸리고 마당에 천막을 치고 상을 치렀다. 건강하게 지내다 큰 고통 없이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삶을 마감하셨다. 지나고 보니 할머니의 죽음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죽음의 모습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풍족하지만 ‘죽음의 질’은 나빠진 것이 분명하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도 집에서 지켜드리고 싶다. 집은 어머니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돌봄의 사회학>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의 저자인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네 가지 재택 임종의 조건을 제시했다. 본인의 분명한 의사, 간병 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 이용 가능한 지역 의료·간호·돌봄 자원, 마지막으로 임종과 장례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와 돌봄 자원이 제한적이고, 가족이 직접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무게도 만만치 않다. 이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호스피스 이외 병원 밖 임종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몇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한다. 첫째,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치료가 아닌 ‘돌보는 의료’의 공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임종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정하고, 집에서도 의미 있는 이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택 임종을 가족의 선택이나 부담으로만 두지 않는 사회적 책임이다. 재택의료 및 돌봄의 확충, 돌봄자 지원 제도,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누구도 혼자 마지막을 맞지 않도록 돌봄 사회의 길로 나가야 한다.
‘어디서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마지막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죽음을 삶에서 분리해 병원과 시설에 맡겨온 지금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다. 한 사람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일이며, 임종을 ‘의료적 사건’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으로 되돌려놓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새로운 사회적 과제다.

![[전문가기고] 치매 조기예측,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시작된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3/news-p.v1.20251023.8d7ad36e64a74baf9403c42434f1f557_P3.jpg)

![[신간] 늙고 혼자여도 괜찮은 곳... '나이 들고 싶은 동네'](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0825502460.jpg)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손잡고 ‘존엄사’ 택한 90대 부부 [수민이가 궁금해요]](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10231.jpg)
![양한광 국립암센터장 “국립암센터, 치료 넘어 국가 암 정책 선도… 핵심 축은 ‘인재’” [세계초대석]](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5151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