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중국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위성데이터로 위성 기반 지구 관측 데이터를 통해 일대일로 7,000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제 학술지 국제 디지털 지구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Earth)에 발표된 이 연구는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7,000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성 트렌드를 최초로 분석했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제안한 국제 경제 협력 구상으로, 하나의 벨트(육로)와 하나의 도로(해로)를 통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프라·무역·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연구진은 위성 기반 지구 관측(EO) 데이터를 활용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도시 변화를 추적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1번 목표(SDG 11)에 해당하는 ▲토지이용 효율성(LUE, SDG 11.3.1)과 ▲인구가중 미세먼지(PM) 노출도(PPM, SDG 11.6.2)를 평가했다.
연구 결과,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전체 도시의 30.6%는 토지 이용 효율성이 개선된 반면, 24.3%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공기질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도시의 67.8%에서 PM2.5 노출이 2000년보다 증가해, 도시 확장이 곧 대기오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도시들에서는 예외적인 패턴이 포착됐다. 도시 중 22.6%는 토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질이 오히려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 것. 연구진은 이를 “공간 확장과 대기오염의 탈동조화(decoupling)”라고 평가하며, 효과적인 정책 개입과 도시계획의 차별성이 반영된 사례로 주목했다.
그러나 남아시아 지역은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이 지역 도시의 38.2%는 도시 확장과 공기질 악화를 동시에 경험했으며, 일부 도시의 2020년 기준 연평균 PM2.5 농도는 53.9㎍/㎥에 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5㎍/㎥)를 10배 넘는 수치다.
연구팀은 도시별 LUE와 PPM 변화를 기준으로 8가지 도시 개발 유형으로 분류하는 2차원 진단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분류는 도시 성장과 환경 부담 간의 상충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지속 가능성 정책 진단과 SDG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는 유럽연합과 유엔이 개발한 도시 공간 자료(GHS-BUILT-S), 인구 그리드(WorldPop), 1km 해상도의 글로벌 PM 데이터셋 등 정량화된 EO(지구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도시 경계는 GHSL-OECD의 기능적 도시지역 정의를 따라 설정돼 장기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토지이용 효율이 낮은 ‘축소 도시(LUE < 0)’들이 공기질 개선에는 실패한 점도 지적됐다. 단순한 인구 감소만으로는 구조적 전환 없이 환경 노출을 줄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도시별 LUE와 PPM 변화에 따라 8개의 도시 개발 유형으로 분류하는 2차원 진단 프레임을 개발했다. 이는 도시 성장 패턴과 환경 노출 간 상충 관계를 시각화해, 지속 가능성 진단 및 SDG 모니터링에 실질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나 지역에서도 EO 데이터를 통해 도시 단위 SDG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진은 “컴팩트한 도시 설계와 대기질 관리,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결합한 통합 전략이야말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위성 기반 데이터가 도시정책의 실질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BRI 지역을 아우르는 이번 연구는 단일한 ‘성장’ 개념이 아닌, 질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도시 전략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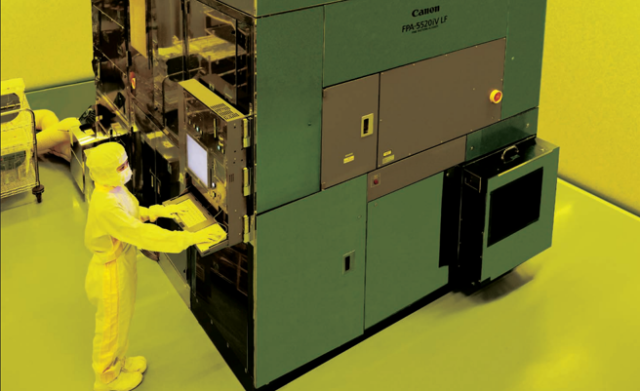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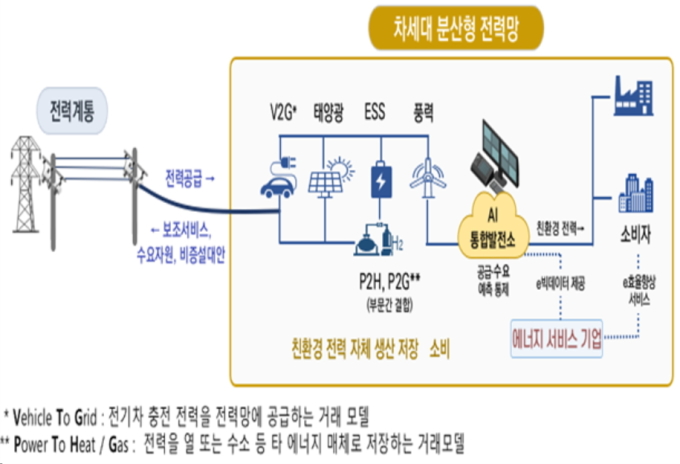

![[녹색 전환] 에너지 전환과 숫자의 착시](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802/p1065568436105251_951_thu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