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해 금융사기 대응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자 구제를 위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자율배상제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금융사기 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 2023년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19년(6720억원)에 비해 7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피해자수도 5만372명에서 1만1503명으로 줄어 77.2%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자수가 급감한 것과 달리 1인당 피해액은 1708만원으로, 4년 전(1334만원)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 중 최고 금액이다. 금융당국·금융권·통신사의 지속적인 예방 노력과 제도개선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자체는 감소했지만 개별 피해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의 피해 금액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검찰·금융당국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4515건에서 3850건으로 전년 대비 15% 줄었지만, 70대 이상의 피해 건수는 177건에서 315건으로 오히려 78%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또는 이체 시 30분간 거래 지연 ▲이체 시 상대방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며 입금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한 지연이체서비스 ▲은행에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전화·문자메시지의 공식 발신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예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자율배상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자율배상제도는 금융회사가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자의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은행권에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지역 농·축협,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됐다.
자율배상제도는 자신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배상 금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아직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신청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율배상제도의 대국민 안내를 강화하고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발생 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외국인 근로자, 60대 이상 고령층 등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류현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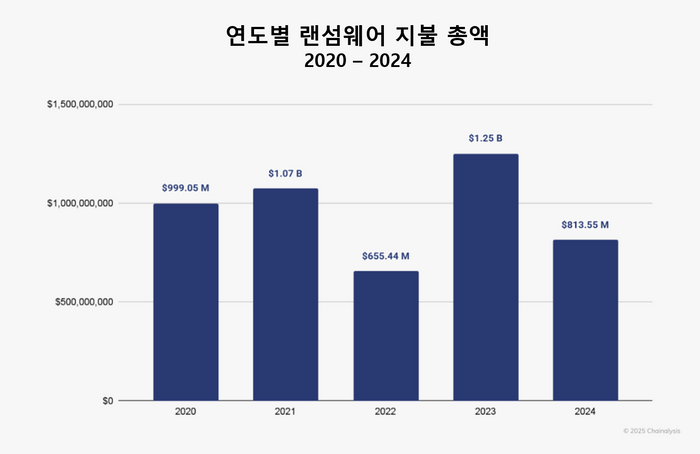



![[기자의 눈] 금융 당국의 '헛다리' 혁신](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4WYVC2_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