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다. 2024년 기준 세계 5대 특허 강국 중 국제특허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PCT) 성장률 1위, GDP 대비 자국민 특허출원 1위 등 수치로는 이미 '상위권'에 올라섰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 하나가 따라붙는다. “그 많은 특허는, 결국 무엇을 바꿨는가?”
연구개발(R&D)과 특허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연구는 논문과 특허로 귀결된다.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연구, 보호하지 못하는 특허. 문제는 '총량'이 아니다. 문제는 '연결'이다. 지식은 쌓였지만, 그 지식이 시장으로 흐르고, 전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고리의 중심에, 특허 전략이 놓여 있다. R&D, 혁신성장, 특허전략, 우리는 이제 이 셋을 따로 볼 수 없다.
첫째, 가치 있는 특허를 창출하는 R&D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출원이 아니라 '권리화'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특허는 등록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회피 가능한 특허, 무효에 취약한 특허는 오히려 기업의 전략적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해 권리 안정성이 높은 돈 되는 특허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대형 R&D 과제에는 사전 IP 전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현재 첨단전략산업법, 전략기술육성법 등에 특허의 전략적 조사·분석이 의무 요건으로 포함돼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IP 전략 포함'이 아니라 '핵심 특허 대응 로드맵' '경쟁국 IP 네트워크 분석' '회피 설계 전략' 등 실질적인 사전 정보 분석과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는 연구개발의 낭비를 줄이고, 기술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
셋째, 각 부처의 R&D 예산 내 일정 비율을 특허 전략 수립에 배정해야 한다. IP는 연구의 부수 결과물이 아니라, 선도 전략의 시작점이다. 특허 기반 기술 기획, 선행기술 회피, 활용 전략 수립, 기술 포트폴리오 구성 등 지식재산을 전략 자산으로 다루는 체계가 예산 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특허의 '질'이 올라가고, R&D의 방향이 뚜렷해진다.
넷째, 지식재산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각 부처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진행하는 R&D 프로젝트가 IP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구성되고 조율돼야 한다.
자본과 인력 규모에 구조적 한계를 지닌 우리나라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천·핵심특허 확보에서 시작해, 사업화와 수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허가 R&D의 출발점이 되고, 다시 산업 성장의 성과로 환류되는 이 순환구조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실질적 수익률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민간 스스로가 특허 전략을 내재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해주는 '분석'이 아닌, 기업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 기관의 전문성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전략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차례다. 특허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 R&D와 혁신성장을 잇는 전략적 교차점, 그 자리에 '특허 전략'이 있어야 한다.
임달호 충북대 교수·IP중점대학사업단장 dalholim@cbnu.ac.kr
![[ET시론]추격·추락·추월의 대전환 시대, '기술사업화 모멘트'](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6/news-p.v1.20241126.eeeac18ff60f4aa59b89dffd59a06faa_P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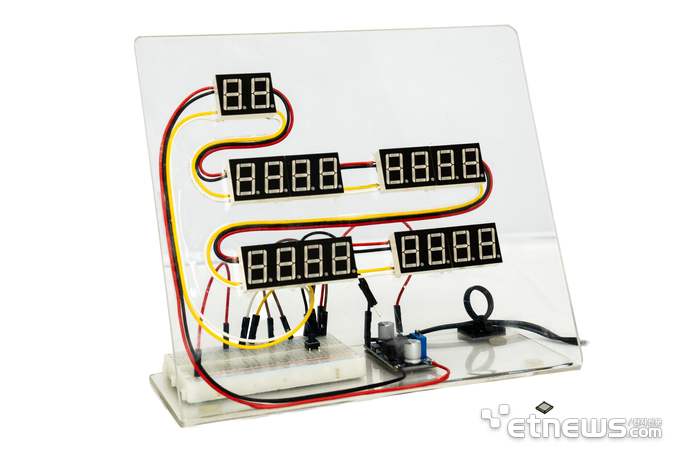

!["‘애니판 틱톡’ 만든다" 네이버웹툰 '승부수'…"조달 자금 M&A에 투자한다더니" 상장사들 ‘공수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E0HDW0_1.jpg)
![[비즈 칼럼] 치열한 미래 에너지 패권,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 강화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6bbe4afd-a373-4f9b-ac68-ba79bcf7ac49.jpg)
![[기고] ‘기술유출 못 막는 산업기술보호법’ 왜 방치하나](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519484.jpg)
![[사설] 국가AI센터, 정부가 통크게 책임져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8/news-a.v1.20250508.1aa6fc71c5b6448c889610bc1b504ec9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