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10월에 환도성(丸都城)의 간주리(干朱理)가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서기 557년,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양원왕 13년에 나오는 기록이다. 앞서 소개한 칠숙과 석품의 반란보다 기록이 더 적다. 삼국사기는 신라 쪽을 제외한 기록이 유독 적은 편이라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형편이다. 전후 과정과 누가 어떻게 진압했는지, 그리고 진압 이후 잔당들과 가담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기록 역시 존재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추측이라고 부르는 상상의 영역으로 다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능한 영역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자.

당시 고구려의 분위기는 상당히 암울했다. 광개토태왕부터 시작된 고구려의 전성기는 안장왕의 승하와 더불어 막을 내렸다. 특히, 안원왕의 사후 왕위를 둘러싼 외척 간의 내전에 가까운 충돌로 인해서 사망자만 약 2천 명에 달하는 참사가 벌어진다. 충돌을 벌인 세력은 안장왕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의 집안인 추군과 세군 측이었다. 추군 측 세력이 승리하면서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인 평성이 왕위에 올랐다. 학자들은 이때의 충돌을 단순히 왕위 계승을 둘러싼 두 집안의 충돌로만 보지 않는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 불거진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성과 국내성 세력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려고 든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도의 이전은 굉장히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백제의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는 평양으로 천도한 장수왕의 탄압으로 대신들과 호족들을 살육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고구려를 염탐하러 왔던 거칠부의 정체를 간파한 고구려의 승려 혜량은 고구려의 정사가 어지러워서 곧 멸망할 것 같으니 나를 데리고 신라로 가달라는 부탁을 했다. 양측의 세력 충돌과 인명피해에 대한 기록은 일본서기에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백제 본기의 기록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평양으로 천도한 장수왕의 탄압으로 인해 국내성의 귀족세력들은 일시적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시간이 흘러서 고구려의 왕권이 약화 되자 다시 고개를 든 것으로 보인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원한은 오랫동안 간직하는 인간의 특성 때문일지 아니면 빼앗긴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약한 희망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승리한 추군 측은 평양성을 기반으로 한 세력일 것이고, 패배한 세군 측은 국내성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외척 집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2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의 숫자다. 이 정도면 부상자까지 포함한 사상자는 거의 만여 명에 가까웠을 것이고, 동원된 양쪽의 병력은 그 이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먼 훗날이긴 하지만 이의민을 죽이고 최씨 무인 정권 시대의 문을 연 최충헌과 그의 동생 최충수가 개경에서 충돌을 벌인 적이 있었다. 양쪽이 동원한 병력이 각각 천여 명이었다는 점은 추군과 세군의 병력 동원 규모가 단순히 집안끼리의 무력 충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어쨌든 추군측 세력이 승리하면서 양원왕이 즉위했지만 혼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측 기록을 보면 오늘날의 국무총리 격인 대대로의 자리를 놓고 귀족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고, 왕은 궁궐의 문을 닫고 지켜보다가 승리한 쪽을 대대로에 임명했다고 나온다. 이렇게 임명된 대대로가 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봤을지는 불보듯 뻔하다, 왕권이 약해지면서 추군으로 대표되는 평양성 귀족세력들의 힘은 점차 커졌고, 패배한 세군측의 국내성 귀족세력들은 점점 더 탄압을 받고 약해졌을 것이다.
간주리의 난은 바로 그 시점에서 일어났다. 국내성이 아니라 환도성이라고 꼭 집어서 언급된 것을 보면 그곳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것으로 보인다. 환도성은 국내성의 북쪽에 있는 산성으로 전투가 벌어지면 이곳에서 적을 막았다. 반역이라는 표현을 보면 무력 충돌이 벌어진 건 확실해 보인다. 간주리는 반란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름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인물인 지에 대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란을 이끌 정도였다면 전현직 관리나 장수로 추정되지만 그랬다면 관등을 언급했어야 했다. 홍경래나 이재수 같이 평범하거나 미천한 신분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지점이다. 한발 더 나아가자면 평양성 귀족 세력들의 가혹한 탄압과 수탈에 맞서서 국내성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고, 간주리가 지도자로 추대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반란을 이끌어서 주모자로 이름이 남을 정도였다면 신분에 상관없이 주변으로부터 나름 능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끝은 비참했지만 말이다.
간주리의 반란은 짧게 한 줄로 끝났고, 실제 반란 역시 오래 끌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란은 대개 국가가 흔들리고 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반란이 일어나서 평정되었다는 것은 기쁘거나 좋아할 일은 아니다. 나라의 사정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고구려는 간주리의 난을 평정하고 백여년이 지난 후 멸망했다. 연개소문의 큰아들 연남생이 당나라에 투항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이때, 연남생과 함께 당나라에 항복한 성 중에는 국내성도 포함되어 있다. 평양성과 국내성 사이의 갈등이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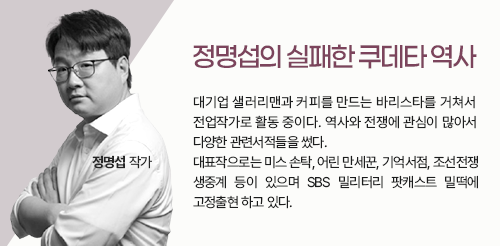
정명섭 작가


![[시론] 지금 성조기를 흔들 때가 아니다](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220/p1065622550167852_180_thum.jpg)

![[북스&] 김정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2FGF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