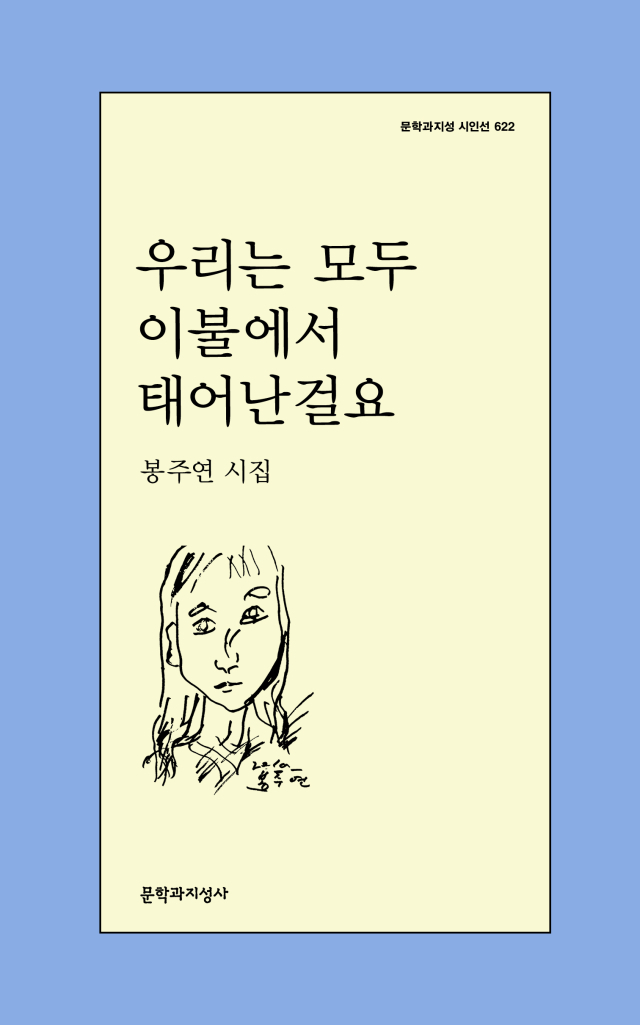올봄 서귀옥 시인의 첫 시집이 출간되었다. 2012년 ‘김유정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니, 무려 13년 만에 선보인 시집이다. 소설책만큼이나 두툼한 시집을 펼쳐 들고 우선 목차부터 훑었다. 쉰여섯 편의 시가 들어있었다. 손가락을 꼽으며 수치로 환산해 보았다. 한 해에 4편씩 쓴 셈이었다. 적어도 너무 적은 과작(寡作)이었다. 한 편 한 편 음미하며 읽다 보니 ‘분홍꽃댕강’처럼 무수히 구겨진 종이의 잔해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그것은 시의 탑(塔)이었고,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쓰디쓴 쇄신의 맛’(「리프레시」)이었다.
시인의 시집에서 주목한 것은 법과 시의 만남이었다. 시인은 ‘시인으로 살아보겠다고 법무사 사무장 관두고 만학을 결정’했다고 「유머」에 썼다. 이후로 시인은 법과 담을 쌓고 시와 사귀었다. 시처럼 말랑말랑하고 서정적인 장르에 도끼처럼 쇠붙이 냄새가 나는 법의 접목이 가능할까. 누가 보기에도 시와 법은 어울릴 수 없는 조합 같았다.
시인의 시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는 시적 화자들이 등장한다. 법과 무관하게 살고 싶어도 다양한 이유로 법망에 걸려드는 것이 인생이었다. 법 없이 시를 써 보겠다는 무구한 생각을 시인은 일찌감치 접었을지 모른다. 시인의 시는 법의 해석 안에서 웅숭깊어졌다.
「집이 날아갔다는 말을 들었다」에서 경매 법정을 빠져나오던 한 남자는 ‘집이 날아갔어!’라고 중얼거린다. 경매로 넘어간 집이 ‘지번을 가진 새’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집이 새처럼 날아서 새 번지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경매는 해체가 아니라 재생이었다. 시인은, 한 가족을 낳고 기른 집이 한때 성행했던 시절을 뒤로 하고 날갯짓하는 것을 본다. 또한, 갑자기 날아온 공에 맞아 집을 날려버린 남자의 처지에 공감한다. 시인은 ‘공도 진심에 닿으면 한 번쯤 좋은 곳으로 날아간다’(「공들」)는 믿음에 힘입어 집이 좋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바람을 잡는다.
「모자는 많고 죄는 다양해요」와 「법정에 가요, 쇼핑하러」는 연작시처럼 읽힌다. 시인은 ‘죄지은 사람과 죄지을 사람은 모자를 눌러쓰는 버릇’이 있다고 말한다. 모자의 종류만큼이나 범죄가 다양한 것은 물론이다. ‘죄를 덮는 덴 모자만 한 것’이 없기에 모자를 쓴 사람들은 ‘죄를 고르기 위해’ 쇼핑하듯 법정에 간다. 그곳에는 ‘오늘만 사는 이들’이 있다. 시인은 불운을 물려받은 이들에게 법정에 즐비한 죄를 내보이며 ‘살 거야? 말 거야?’라고 다그친다. 살고 싶다는 게 ‘사치의 욕구인 이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간다. 그러나 막다른 길에도 퇴로는 있다. 「위너」에서 시인은 ‘얼어붙지 않으려고 멍을 옮겨 달고’, ‘좀 더 유연해지려고 구겨지며’ 그저 살기만 하자고 손을 내민다. 루저와 잉여일지라도 가로등 폭죽을 터뜨리면서 자축하며 살자고 한다. ‘제 꿈의 보폭과 속도로 시차를 수련하면서’(「미래는, 내가 이름 붙여준 나의 골든레트리버」) 저마다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렇게.
시인은 「좋은 인상」에서 ‘내 시가 곧 죽을 사람의 마지막 한 끼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시인입니다’라고 썼다. 그런 마음으로 쓴 시 쉰여섯 편을 읽고 나니 며칠을 안 먹어도 될 만큼 포만감이 느껴졌다. ‘뻔하고 엽기적이어도 한 번씩 눈물 나게 웃어’ 달라는 당부대로 킥킥대기도 했다. 나도 시인처럼 우주를 따돌리고 혼자가 된 듯 가벼워졌다.
황보윤 소설가는
전북일보와 대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설집 <로키의 거짓말>, <모니카, 모니카>, 장편소설 <광암 이벽>, <신유년에 핀 꽃>이 있다.
기명숙 작가, 박래빗'i의 예쁨' 장은영 작가, '사춘기, 우리들은 변신 중' 장창영 작가, 멜리사 마인츠 '깃털 달린 여행자' 김근혜 작가, 김란희 '금딱지와 다닥이' 김영주 작가, 김경숙 '오늘 또 토요일?' 최기우 작가 – 정창근'남사당의 노래' 이영종 시인 - 유종화 시집 '그만큼 여기' 최아현 소설가-권진희 '언제라도 전주' 이경옥 동화작가-로이스 로리 '기억전달자' 오은숙 소설가-시몬느 드 보부와르 '아주 편안한 죽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주 #혼자 #시인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