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난개발에 관리 부실이 더해져 발생하는 인재(人災)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심 개발을 중단하거나 막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싱크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 류동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싱크홀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오해를 10문 10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1. 땅 밑에서 싱크홀이 생기는 과정은?
매설물 파손 과정에서 지하수 흐름이 변하고 토양이 유실된다. 이때 생긴 ‘빈 공간’이 붕괴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하수관 파손이나 굴착 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흐르면서 흙을 끌고 갈 때 지하에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 공간이 커지다가 도로가 무너지면 싱크홀이 된다. 아스팔트 아래에는 다층 구조가 있다. ‘노상-기층-포장층-매설관-지하 공간’ 등이 층층이 존재한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싱크홀로 이어질 수 있다.
Q2. 포트홀을 싱크홀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들은 어떻게 다른가?
포트홀은 표면만 깎인 것이고 싱크홀은 땅 아래까지 무너진 것이다. 포트홀은 주로 아스팔트 노면의 마모와 균열로 발생하며 깊이가 얕고 작다. 반면 싱크홀은 지하 공동 형성 후 지표면까지 붕괴된 현상이다.
Q3. 싱크홀이 잘 생기는 지역이 따로 있나?
지질이 약한 충적층 지역, 하천 변, 인프라가 밀접한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특히 하천 주변에는 느슨한 흙층이 많고 상하수관이 밀집된 도심도 위험 요소가 많다. 다만 단순히 땅이 약한 곳에서 싱크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강한 기반암 위에서도 매설물 파손이나 지하수 흐름 변화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
Q4. 지하 개발이 많으면 싱크홀이 잘 생기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굴착이 지하수 흐름을 바꾸면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개발 자체가 아닌 지하수 흐름 교란, 매설물 노후화, 토립자 이동이 복합되며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Q5. 싱크홀은 매해 증가하고 있나?
꼭 그렇지 않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차이가 있고 장마나 홍수가 발생하면 다음 해 싱크홀이 더 자주 생기는 것으로 유추된다.
Q6. 싱크홀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지표면의 특징이 있나?
아직 단단히 굳지 않은 퇴적층은 토사 유출이나 침하 위험이 높다. 이러한 특성의 지반은 포항·경주 등 동해안 지역에 많으며 굴착 시 2차 재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Q7. GPR 탐사는 싱크홀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
GPR은 얕은 지층에는 효과적이지만 점토나 습한 지반에서는 탐사 깊이가 제한된다. 다른 탐사 기법과 병행해야 정확성이 높아진다.
Q8. 신도시 등 새로 개발된 지역은 안전한가?
오래된 지역은 상하수도관이 노후돼 위험 요소가 많지만 신도시나 개발 중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최근 고층 건물 건설로 땅을 깊게 파거나 지하주차장·지하철 등을 만들 때 지하수 흐름이 갑자기 바뀌면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Q9.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복구하나?
꺼진 공간을 메우고 지반을 다지며 필요시 매설물을 교체한다.
Q10. 지하상가나 지하철 등 지하 개발을 줄이거나 막아야 하나?
지하 공간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자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하 공간 개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지질 정보, 데이터 통합, 과학 기반 예측 체계가 동반된다면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상기후로 산불 대형화… ‘진화’ 매몰 말고 ‘복원’ 고민해야” [세계초대석]](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513827.jpg)
!['괴물산불' 공포 커지는데…지휘체계는 오락가락[양철민의 서울 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LFXTQY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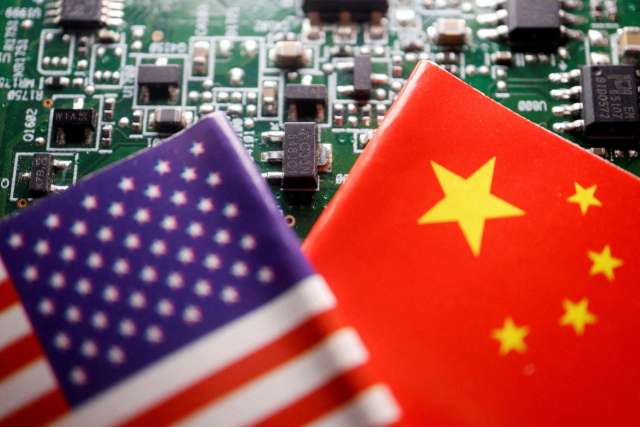
![[전문가 기고] AI 시대, 진주성 촉석루에서 배운 교훈](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7/news-p.v1.20250507.5b8b44818ea2458d863b8c7e8bbaddcf_P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