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웅, 칼럼니스트

나뭇가지에 걸어도 잔다는 아잇적엔 누웠다 하면 잠에 곯아떨어졌다. 잠이 안 온다고 베개 탓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베개가 무슨 죄인가. 편안히 자라고 목을 받쳐 머리를 안정시키는 쾌적한 장치인걸. 어른이 돼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건이 썩 좋지 않던 군대 내무반에서도 상황에 쫓겼지, 베개 탓을 하진 않았다. 출장이다, 여행이다 여인숙에서 모텔과 호텔로 전전했지만, 베개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투덜댔던 일은 기억에 없다. 친구 집이나, 이따금 친구들과 어울리던 야산 풀밭에서도 엎어지면 잠이었다. 자리에 몸을 던지면 곧바로 가라앉던 꿀맛 같던 잠이다. 한데 60줄에 접어들면서 탈이 생겼다. 그렇게 잘 오던 잠에 균열이 온 것이다. 불면이라는 민감한 이 변화는 그것도 내 방이라는 특정 공간에서만 나타났다. 자리에 들면 눈만 멀뚱거리는 게 베개가 문제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아내에게 주문했다. 솜을 넣되 많게 적게 조절하거나 주기적으로 높낮이를 바꾸거나 하는 식이었다. 선친 생시에 여름밤 마루에 누워 있는 나를 보고 한 말이 있었다. “‘고침단명(高枕短命)’이라 했으니, 목침을 모로 세우지 마라.” 몇 번인가 환기시키던 그 말이 잊히지 않는다. 잠이 안 오는 밤이면 귓전에 내리곤 한다.
팔베개를 할 때도 있다. 덩달아 몸을 새우처럼 구부리기도 하지만 금세 팔이 저려 역효과다. 편히 자려다 팔을 주무르는 군일 거리만 만든다. 간청할수록 달아나는 게 잠이다. 종국엔 신경이 더 예민해지면서 베개로 파고들게 된다. 내 베개는 라텍스로 쿠션이 좋다. 이거다 싶어 머리를 맡기고 있다. 한데 웬 호사인가. 머리를 깊이 묻으면 탄력으로 가벼운 율동감이 느껴져 편안하더니, 오래잖아 거부감이 왔다. 딱딱하다 지나치게 물렁물렁해도 맞지 않다. 여름에는 삼베 베갯잇을 올리고, 겨울엔 두꺼운 타월을 덮어 대충 견디지만 시원찮다. 내게 쾌적한 베개는 세상에 없는가.
글을 쓴다고 책상에 오래 앉거나 정원을 손질하거나 텃밭에 삽질로 두둑을 올린 날에는 지친다. 몸이 지치면 베개 타령이 나오지 않는다. 씻고 눕자마자 딴 세상에 연착륙해 있다. 생각해 낸 게 저녁 걷기운동이다. 숨을 몰아쉬며 돌아와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하자는 것이다. 효과를 봤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처방전이 되진 못한다. 곧바로 베개 타령이 나온다. 누구는 잠자리에 누워 음악을 듣는다 하고, 눈 감고 명상에 든다고도 한다는데, 내겐 취향이 아니다. 모를 일이다. 내가 베개에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지.
눕자마자 스르르 숙면의 세계로 노 저어갈 작은 배 한 척 있었으면 좋겠다. 노 젓다 노곤하면 뱃전에 기대어 잠들게. 찰랑찰랑, 아득히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평화의 물결 소리. 그렇게 새 아침을 맞을 것이다.
어머니 품처럼 안온한 베개는 어디 없을까. 요즘 간간이 잠 안 오는 밤이면 슬그머니 이불 밖으로 나온다. 불을 켜고 책상머리에 앉아 자판에 두 손을 얹는다. 결국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쓰자, 시가 됐든 수필이 됐든 무슨 담론이 됐든 쓰자. 그러고 나서 내 베개에 코를 박자. 웬 베개 타령이 그리 길었던고.

![불면증만? 잠자기 전 스마트폰 보면, 세포 죽는 이 장기 [건강한 가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07/86ca6487-203e-4526-8853-7828036be89f.jpg)
![[데일리 헬스] 설인아, 지독한 불면증에 5년간 복용 '수면제'...'수면유도제'와 차이는](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5640613_1404721_m_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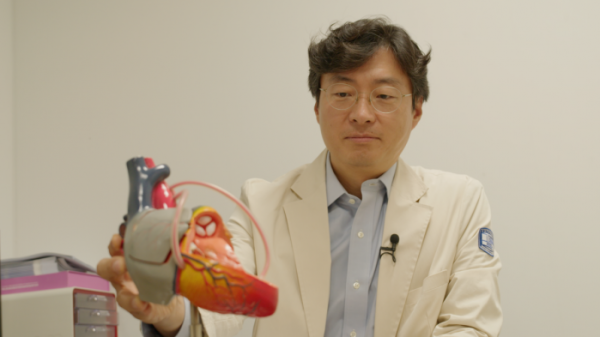

![작년 200만명이 치료받은 이 병…"환절기엔 감기로 착각" [건강한 가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06/10934a72-bc26-4a73-a1ed-fee85d712e5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