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산업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테크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8%에서 2030년 1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기초연구 예산은 1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 같은 확대 기조를 향후 5년간 가일층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국의 기초연구 예산 대폭 증액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 근본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중국은 이미 주요 산업 10개 가운데 7개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거나 세계적 기업을 배출했다. AI 논문 수와 특허 출원은 압도적 1위이며 드론은 글로벌 시장의 70%를 장악했다. 로봇 산업에서는 한국을 크게 앞섰다. 반도체 분야도 화웨이 등이 조만간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내놓는 등 발전 속도가 위협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31조 1000억 원이던 R&D 예산이 지난해 26조 5000억 원으로 15%나 삭감됐다. 올해는 29조 7000억 원으로 다소 회복되기는 했지만 예산 삭감이 남긴 후과는 너무 컸다. 과학자의 구직급여 신청은 30% 이상 급증했고 정부 부처별 연구과제 수백 건이 축소됐다. 미래를 고민하던 인재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여기에다 ‘반도체특별법’마저 관련 기업들의 기대와 달리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이 빠진 채 반쪽 법안으로 전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17일 개최한 ‘한미 혁신 생태계’ 세미나에서도 우리나라의 AI 투자 속도가 미국·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이제라도 금산분리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중국은 매년 배출되는 1200만 명의 대학 졸업생 중 상당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우리는 더 강력한 국가 지원책을 세워 고질적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다.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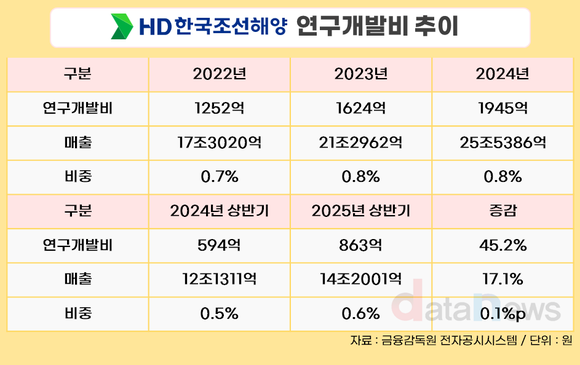
![中, 5년 앞섰다…SMR 경쟁, 이미 승부 났나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0/18/2GZ841F868_1.jpg)
![[단독]첨단인재 1000명 모신다더니…'톱티어 비자' 지금까지 3명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a7b69749-2ef1-4fc1-922c-2c1d7600e689.jpg)

![[2025 국감] 광물 수입의존도 99%인데 7%만 재활용…자원 안보 '구멍'](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048595640.jpg)
![[GAM]2026년 AI 생태계 구축 본격화② '제2성장' 기대 '中 샤오펑'](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