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자본시장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공시 전 정보 유출’이다. 유상증자(유증), 공개매수 같은 뉴스가 나오기 하루이틀 전 영문 모르게 주식 거래량이 폭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대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미공개 재료가 사전에 누출되고, 이걸 이용한 세력이 공식적인 공개 전에 주식 매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법률에서 부당 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당국은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적발·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 진정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이런 행위를 바로잡는 일일 것이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의 유증 공시를 놓고 ‘기습 공시’ ‘돌발 공시’ 논란이 불거졌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사전에 주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논평도 나왔다.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권 차입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소액주주들은 주당 가치가 희석돼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사안을 보다 차분하게 들여다볼 측면도 있다. 국내에서 유증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설명하는 사례는 없다. 사전에 설명하는 것은 공시 위반이 돼 공시 전에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는 불가능하다. 보통은 유증 발표 이후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두 달가량에 걸쳐 주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미국 보잉이 243억 달러 유증을 진행하면서 “자금 부족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및 대규모 자본 조달 필요성을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보잉 사례는 주주 배정이 아닌 기관투자가 등을 상대로 했기에 일반 주주에게 참여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미국에는 장래 여러 번에 걸쳐 발행될 증권에 대해 미리 하나의 신고서에 작성·제출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일괄등록제도’가 있다. 보잉은 이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미국에도 공정공시 제도가 있어 사전에 선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공정공시 위반이다.
기업은 기업마다 사정이 있다. 한화에어로가 기수주한 31조원의 선수금은 부채로 잡혀 있다. 기존의 부채에 더해 추가 차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추후 사업 입찰에 불리할 수 있다. 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보다 유증이 유리한 의사결정일 수 있다.
유증은 주식 수가 늘어나므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반대로 신규 투자자들에게 진입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주식 시장은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기업의 장기적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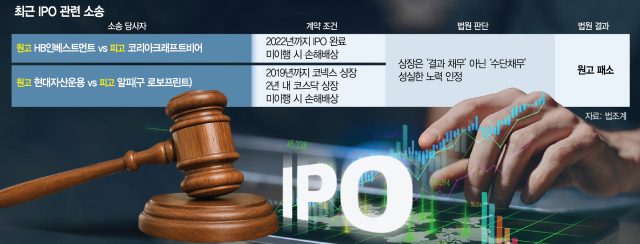

![[경제산책] 법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미칠 영향은](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3/29/.cache/512/20250329500044.jpg)

![[Corporate] 미국의 포이즌필 판례와 한국의 포이즌필 도입 논의](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3/85485_31179_155.jpg)

![트럼프 '관세폭탄' 터지기도 전에 車부품사 '휘청'…공매도 재개 앞두고 투자자 대응 '차별화'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ETNJX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