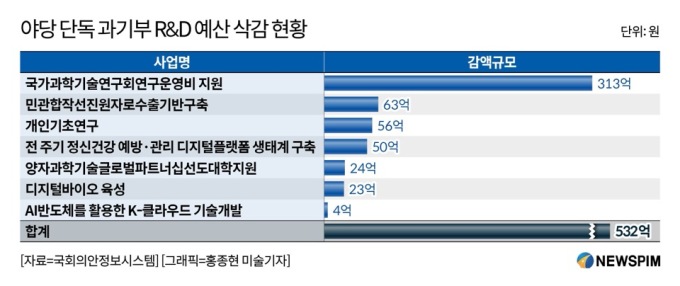연 5조원 규모 예산이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기술이전에 투입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20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기술 사업화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과학기술계 오랜 숙제를 꼽자면 기술사업화가 가장 먼저 언급된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방향'을 통해 공공부문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그간 부진했던 기술사업화 성과를 두고 질책의 대상에 오르는 것은 늘 출연연이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서는 중장기 대형 R&D 대신 단기적 연구 성과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하소연한다.
이러한 상충은 결국 예산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동안의 대부분 출연연 기술의 기술성숙도(TRL)는 평균 5단계 이내로 대학의 연구조직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TRL 평균(2~3단계) 보다 조금 높은 정도다.
기술사업화 전문가들은 이 같은 TRL 수준으로는 사업화 수요에 이를 수 없다고 진단한다. 결국 TRL 수준을 높이기 위한 스케일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과기계 오랜 과제인 기술산업화 또한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부 지원이나 출연연 예산만으로 TRL 6단계 이상 R&D 예산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최초 연구기획 단계부터 시장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R&D 맞춤형 별도 예산 확대가 요구된다.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도 확보돼야 한다. 별도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가 부재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이전 후 연구자와 교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R&D 성과와 혜택 최대화를 동시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TRL 스케일업 예산과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정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