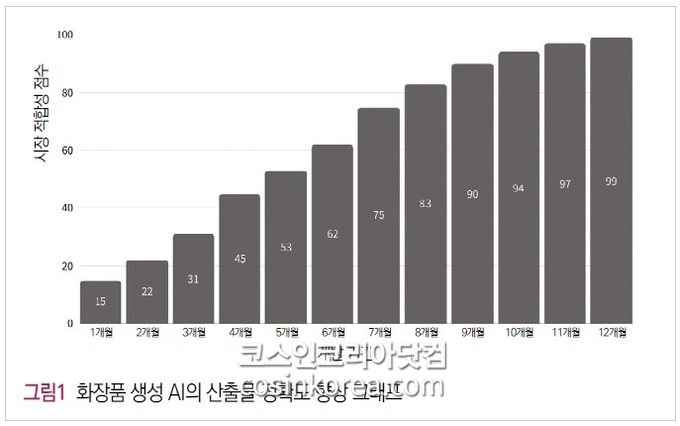“한국에는 글로벌 수준의 정보기술(IT)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IT를 헬스케어 서비스에 접목한 사업 아이템의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국가 산업 전략 측면에서 정부가 국가신약개발재단(KDDF)처럼 연구개발(R&D)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능성 있는 초기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정보라(사진) 스틱벤처스 상무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디지털 치료제가 20개를 돌파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기업이 없다보니 역량 있는 초기 기업들도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디지털 치료제란 특정 질환의 치료·예방이 목적인 소프트웨어(SW) 기반 의료기기다. 주로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질환을 치료한다.
정 상무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 업계에서 아직 성공 사례가 나오지 못한 이유를 크게 두 개 꼽았다. 그는 “신약보다는 덜하지만 기본적으로 임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데 신약 개발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편”이라며 “신약 개발 도중에는 기술수출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치료제에는 이처럼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이 없는 것도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선별 급여 제도를 열어주고 있지만 보험 단가가 너무 낮고, 비급여로 상품화할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 기대한 매출과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업계도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정 상무의 시각이다. 그는 “국내 시장은 의료 접근성도 높고 인공지능(AI) 기술 접목으로 디지털 치료제의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기존 페이퍼 기반의 치료법을 단순히 디지털로 바꾼 경우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에스알파테라퓨틱스가 게임 형태 소프트웨어로 어린이들의 안구를 운동시켜 근시 진행을 늦추는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틈새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투자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장사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 운용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 운용을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상장사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운용사들이 등장하면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업계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