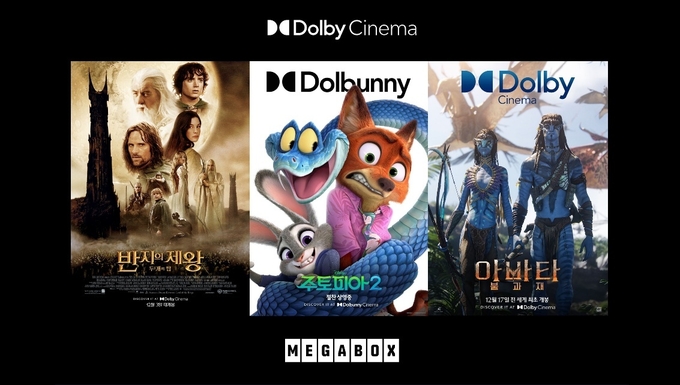올해 한국 영화가 부진을 겪은 가운데 지난 5월 칸 영화제에 일본 영화가 6편이나 초청된 사실은 적지 않은 자극을 던졌다. 특히 최근 일본 독립영화계는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메가 흥행작의 등장으로 산업적 비평적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일본 독립영화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를 찾은 키마타 준지(나고야 미니시어터 ‘시네마스코레’ 설립자)와 아담 토렐(배급사 ‘서드 윈도우 필름즈’ 대표)은 그 배경을 ‘미니시어터’와 탄탄한 인디 생태계에서 찾았다.
키마타 준지 대표는 “일본은 영화 제작의 문턱이 굉장히 낮다”며 일본 독립영화 제작 환경의 특징으로 “낮은 진입장벽”을 들었다. 매우 적은 자본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일본 독립영화계에서는 일반적이며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다양한 작품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영화계는 크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상업영화와 그 외 저예산 영화를 일컫는 ‘인디즈’, 그리고 감독과 스태프가 사비를 모아 만드는 ‘자주영화’로 나뉜다. 흔히 말하는 독립영화는 인디즈와 자주영화를 말한다. 제작비는 일반적으로 1000만~2000만 엔(약 1~2억 원) 수준에서 많게는 4000만~5000만 엔(약 4~5억원) 규모로, 대학생의 졸업작품부터 예술영화까지 모두 인디의 영역에 포함된다.

아담 토렐은 일본 시장의 특수성으로 ‘초저예산 영화의 극장 개봉이 가능한 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300만~500만 엔(약 3000만~5000만 원)으로 만든 영화가 흔했다”며 “그런 작품조차 극장에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일본 독립영화의 가장 큰 특징”라고 설명했다.
토렐은 영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현대영화 배급사인 ‘서드 윈도우 필름즈’(Third Window Films) 설립자로 전 세계적인 흥행작인 <카메라를 멈추면 안돼!>, <사무라이 타임슬리퍼> 등 다수의 일본영화의 월드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 개봉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는 3000만 엔 규모로 제작돼 전 세계 판매에 성공했고, 최근 일본을 강타한 <사무라이 타임슬리퍼>는 감독이 자동차를 팔고 적금을 깨 마련한 2600만 엔으로 만든 초저예산 영화다.
일본 독립영화계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미니시어터’다. 일본 전국에 약 80곳 존재하는 단관 미니시어터는 인디영화가 장기 흥행으로 입소문을 기대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200석 이하 규모의 이 극장들은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운영하며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공간이자 젊은 감독들의 작품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관문이기도 하다.
키마타 대표는 “일본에서는 영화가 완성되면 보통 20~30개 미니시어터에서 상영이 가능하다. 어렵지 않게 개봉할 수 있어 저예산 영화도 관객을 만날 기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1983년 나고야에 ‘시네마스코레’를 세우게 된 과정도 소개했다. 일본 좌파 영화의 대표적 감독인 와카마치 코지의 제안으로 설립된 이 미니시어터의 이야기는 영화 <청춘강탈: 아무것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2>에도 담겼다.
미니시어터는 상영 기간에서도 멀티플렉스와 다른 방식을 취한다. 일반 극장은 흥행이 부진하면 일주일 만에 상영이 끝나지만 미니시어터에서는 기본 3주 정도 상영한다. 좋은 영화라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관객이 늘며 상영관도 확대된다. 이 구조 속에서 학생영화, 실험영화, 신인 감독의 작업이 자연스럽게 발굴되는 것이다.


일본 독립영화의 성공사례도 미니시어터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8월 도쿄 이케부쿠로의 미니시어터 ‘시네마로사’ 1개 관에서 개봉한 <사무라이 타임슬리퍼>는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중견 배급사 GAGA가 배급에 참여했고 전국 380여관으로 뻗어 나가며 1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올해 3월 기준, 10억 엔가량의 수익을 거뒀고 일본 아카데미상 작품상까지 받는 기염을 토했다.
최근 일본 독립영화계에서는 젊은 감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마구치 류스케(1978년생), 미야케 쇼(1984년생)를 비롯해 영화 ‘전망세대’로 올해 칸에 초청된 단즈카가 유이 감독은 1998년생이다. 한국이 여전히 60년대생 거장 중심 구도라면 일본은 젊은 세대로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다.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 평등한 배급과 상영 기회, 미니시어터를 중심으로 한 팬 커뮤니티가 맞물리며 일본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고 그중 일부는 상업영화로 이어지는 도약의 길을 밟는다. 거대한 자본은 없지만 ‘작게 시작해 크게 성장하는 힘’을 갖춘 일본 독립영화의 생태계는 지금도 조용히 다음 세대의 감독들을 길러내고 있다.

일본 독립영화계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키마타 대표는 중예산(한국 기준 약 6~10억 원대) 작품이 거의 없어 상업영화와 인디즈 사이의 ‘허리’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환경 역시 열악하며 ‘열정페이’ 관행도 여전히 잔존한다. 노동시간 규제 등 현장 보호 장치는 한국보다 늦게 도입되는 중이다.
토렐 대표는 일본 영화계의 고질적인 해외 수출의 소극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20년 전부터 해외 비즈니스와 수출에 준비돼 있었다. 포스터, 홍보, 협상 방식 모두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다”며 “반면 일본은 대규모 상업영화조차 내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가 상대국의 시스템을 부러워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영진위를 중심으로 독립영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탄탄하다. 반면 일본은 자본의 지원은 적지만, 미니시어터 중심의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팬데믹 이후 일본 독립영화계가 빠른 복원을 보인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창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위기 속에서도 ‘작게라도 계속 만드는 생태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독립영화가 문화 다양성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의 경험은 앞으로 더욱 긴밀한 교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일본 독립영화의 재도약은 결국 “작은 곳에서 자라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헬로컬처] 식스도파민 “AI가 벽을 무너뜨리는 순간 프레임은 무대로, 관객은 진짜 참여자가 된다”](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249/art_17648332301321_5307fe.jpg?iqs=0.9725146015629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