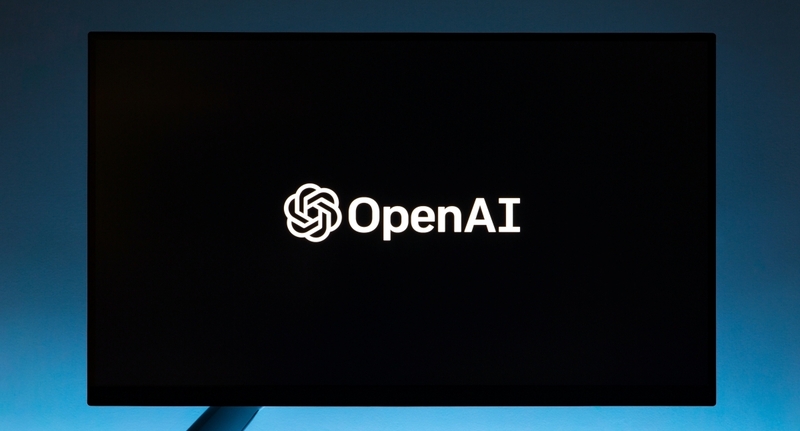집단 간 혐오와 양극화가 도를 넘고 있다. 집단 간 대립과 갈등 양상이 불신과 적대시를 넘어 상대 집단과 소속된 사람들을 폄훼, 배척, 공격까지 하는 실정이다. 주로 온라인 게시판과 댓글을 통해 상대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혐오 표현을 퍼붓고 있다. 절라도, 개쌍도, 홍어, 흉노(지역 근거), 절뚝이, 무뇌아(장애), 페미, 맘충(성별), 짱개, 개남아(인종), 개독교, 땡중(종교), 똥꼬충(성 정체성), 개검, 검새(직업), 틀딱, 급식충, 잼민이(나이), 빨갱이, 좌좀, 극우 꼴통(정치 성향).
문제는 이런 혐오 표현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집단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분노와 공포를 담은 내용일수록 전염성이 강한데,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추천해 혐오와 양극화를 조장한다. 집단 간 혐오와 양극화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언론의 취재 보도 관행이 대중들의 혐오 표현과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언론계에는 출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면 ‘일단 쓰고 보자’ 정신이 만연되어있다. 이것이 노리는 것은 선정성에 기대어 오직 클릭 수를 늘리는 것이다. ‘클릭 저널리즘’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얻으려는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우리 언론은 객관적 보도라는 이름을 내세워 진실성 검증 없이 특정 정보원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큰따옴표(“ ”) 헤드라인은 독자의 흥미와 주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진실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객관적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언론의 명백한 책임 회피이다. 연구에 의하면 취재원의 부정적 감정을 인용하는 비율이 긍정적 감정을 인용하는 비율보다 2.8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큰따옴표 헤드라인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큰따옴표 헤드라인이 무례한 댓글을 더 많이 유도하는데, 특히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과 공격 댓글을 더 많이 부추긴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 언론은 정치인 등 유명인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글을 기사화하거나, 수용자의 관심을 끌 만한 게시물을 찾아 이를 기사화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셜 미디어 게시글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비하, 혐오 표현 등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언론이 그들의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이다.
언론은 집단 간 혐오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서구 언론에서 시작한 ‘컨스트럭티브 저널리즘’(constructive journalism)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저널리즘은 기존의 갈등 보도가 갈등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관점 중심의 보도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대안적 보도 방식이다. 이 저널리즘은 6대 요소를 강조한다. 해결책, 미래 지향성(무엇을 할 것인가), 포용성 및 다양성(더 많은 목소리와 관점), 힘 돋우기(피해자와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다양한 질문), 맥락 설명하기, 공동 창조(대중의 참여 유도) 등이다. 언론은 사회의 모든 집단이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단 간 혐오 #양극화 #언론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



![[단독]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가수 오윤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6/30/30001000228_12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