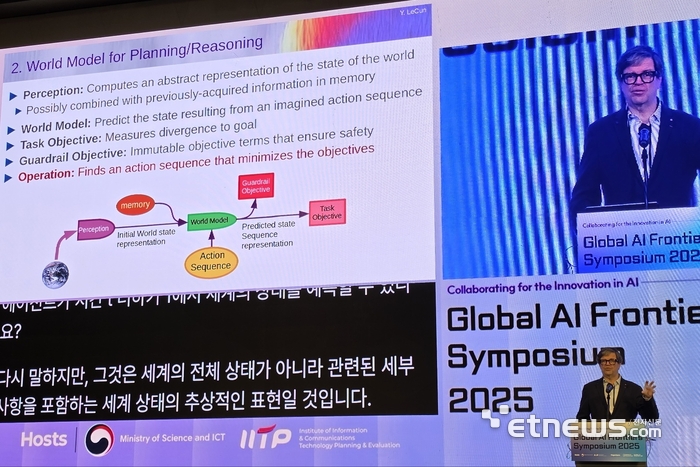산에는 30m 높이의 나무들이 빽빽이 자라 있다. 경사는 가파르고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나뭇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 제인 구달(사진)이 1960년 7월 16일에 도착했던 곰베의 모습이 그랬을 거라고, 같은 곳에 도착한 동물 생태학자 사이 몽고메리는 생각한다. 몽고메리는 영장류 연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세 과학자, 제인 구달, 다이앤 포시, 비루테 갈디카스의 삶을 추적하고 있다.

환경보호 운동가, 침팬지를 안고 있는 사람, 머리가 하얗게 센 여성. 제인 구달 하면 떠오르는 단순한 이미지들은 제인 구달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침팬지가 도구를 제작해서 사용한다는 구달의 발견도 이제는 오래된 상식이 됐다. 대신 몽고메리는 『유인원과의 산책』을 통해 제인 구달과 다른 두 여성이 동물행동학에 만들어낸 전환점을 비춘다. 그것은 탐구 대상으로부터의 철저한 분리와 단기적인 관찰 및 실험을 원칙으로 삼던 ‘과학적 태도’에 대한 전면적 거부이다. 그들은 영장류와 친해짐으로써 학문적 성취를 이뤄냈다. 때로는 탐구 대상을 대상화하는 대신 기꺼이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구달이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다.
구달은 침팬지를 측량하지 않았고 이론의 잣대를 가져다 대지도 않았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지도교수는 구달의 방법론에 당혹스러워했고 학술지 편집부에서는 침팬지들을 이름 대신 ‘그것’으로 지칭하기를 요구했으나 구달은 자신의 방법론을 지켰다. 곰베에 도착했을 때부터 늘 구달은 그랬다.
“제인은 그날 밤 노천에서 잠을 자면서 아무런 실험도,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연구는 오직 신뢰만을 무기 삼아 접근했다. 제인은 침팬지가 침묵하는 그녀를 자신들 삶으로 받아들여 주기만 바랐다.” 이는 비단 영장류 연구에만 필요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제인 구달의 명복을 빈다.
김겨울 작가·북 유튜버
![[사이언스] 지구 자기장과 산소 농도의 미스터리한 관계](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606-74551-sample.jpg)
![[오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연극 '헤다 가블러'를 섹스 영화 버전으로 본다면](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408928639_d63ed1.png)
![[ET시론]'온화한 특이점'과 '타입Ⅰ' 문명을 위한 인프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4/news-g.v1.20251024.9aa2c37a687a454085c4e3edf07d6efc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