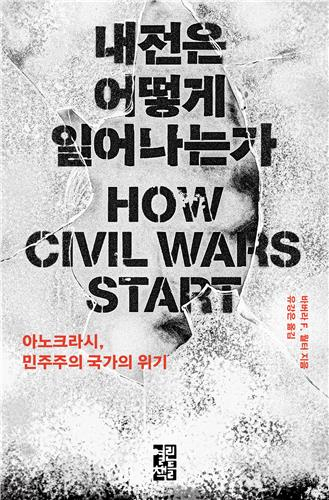
흔히 내전이라고 하면 군복을 입은 군인이 장갑차에서 내려 시민을 총칼로 억압하는 쿠데타를 상상한다. 하지만 현대의 내전은 오프라인에서만 벌어지진 않는다. 내전을 일으키는 이들은 그늘을 들락거리며 게시판과 암호화된 네트워크에서 소통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미리 저항 계획을 세우고, 특정 지역을 장악할 전략을 마련해 혼란과 공포를 조성한다.
수십 년간 내전, 정치적 폭력, 테러리즘 분야를 탐구해 온 바버라 F.월터는 그의 책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사회적 분열을 조명하고, 파벌화와 극단주의를 심화 시키는 요인을 조명한다. 분석의 결과는 ‘공포’다. 그는 오랫동안 탄탄한 민주주의를 유지해 온 미국, 유럽의 국가들이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닌 ‘아노크라시(Anocracy)’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아노크라시는 이를테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위기와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저자는 견고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국가들이 독재국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려고 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단지 미국, 한국 등 특정 몇몇 국가가 아니라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사다리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 이같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건전한 민주주의의 요구보다 앞세우면서 일자리, 이민, 안전 등에 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이용해 지지를 확보한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권력을 자신의 수중에 집중 시키려고 한다. 대의제 선거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시민들에게 독재적 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려고 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같은 사례들을 종합해 “민주주의가 위기에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졌다는 믿음은 오판이었다”고 지적한다. 가짜 정보를 양산하는 소셜미디어가 시민간 갈등을 증폭하고 가짜뉴스와 극단주의적 담론은 사회 분열을 키운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전의 초기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전은 ‘특정 집단의 정치적 배제’ ‘제도의 약화’ ‘소셜미디어를 통한 분열의 확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 네 가지 징후를 보여주며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내전의 조짐이 보일 때 시민사회는 연대하고, 정치인들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갈등이 쌓여 내전이 되기 전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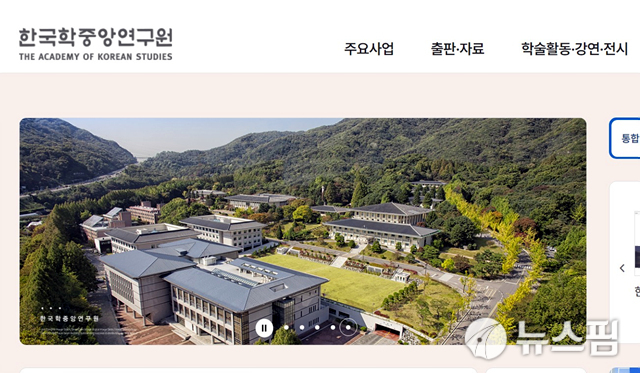
![[북스&] 현대 유럽을 만든 전후 5년의 폭력](https://newsimg.sedaily.com/2025/01/24/2GNTH81CKQ_1.jpg)
![[북스&]독소전쟁 생존자 증언으로 본 전쟁의 본질과 독재 체제의 폭력성](https://newsimg.sedaily.com/2025/01/24/2GNTH0U3J3_1.jpg)



![[설 명절 차례상 화두] '난데 없는 계엄 폭탄' 반찬 삼아 열띤 토장으로](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23/.cache/512/202501235802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