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계(天界)에서 내려와 사람들 곁에 앉아 함께 이야기하고 웃는 부처들이 있다. 너무 친근해서 인간의 더러움, 무지, 비열함까지도 받아들일 것 같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부처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조선의 이런 부처를 두고 “민중에게는 이처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 생활을 같이 하며 의지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신상(神像)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다.

◆아기의 미소, 나한
창령사 나한상을 처음 본 건 국립민속박물관의 한 전시회에서였다. 전시장 한 켠에, 딱히 강조된 것도 아닌 채 두 점이 나란히 서 있었다. 정말 사랑스런 미소를 가진 석상이었다. 수줍은 듯 웃는 아기의 얼굴이 꼭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식간에 반했다.
‘나한’, 혹은 ‘아라한’은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은 존재다. 불법(佛法)을 따르며 열심히 수행하면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의 평등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증거다.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성자이나 신에 오르는 것은 유보한다. 중생을 위해서다. 나한이 광배나 천의(天衣),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지 않는 이유다. 신단(神壇)에 위치하지만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은, 성(聖)과 속(俗)이 공존하고, 때로 그 경계를 넘나든다. 한반도에서 나한신앙은 고려 태조6년(923) 중국으로 갔던 사신이 오백나한을 가져왔고 이후 나한재에 국왕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여럿 전할 정도로 성행했다. 억불정책을 이어갔던 조선시대에도 왕실 신앙의 일부로 지속됐다.
나한상은 부처상, 보살상에 비하면 만듦새가 자유롭다. 제작 당시의 인식, 작가의 의도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됐다. 그래도 대체적인 특성은 있다. 중국, 일본의 나한은 엄숙하고, 위엄있는 모습이다. 부처, 보살에 버금가는 위력, 위엄, 신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나한은 표정이 다양하며 인간적이다. 놀라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한다. 무리를 이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있다. 친근감, 생동감이 넘친다. 인간적 면모는 조선후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창령사 나한상은 꼭 그렇다. 동글동글한 신체, 아이의 그것에 다름 아닌 미소가 특징이다. 심통이 난 것 같고, 근심이 큰 듯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넘치게 사랑스럽다.

◆소년의 얼굴, 부처
회사 근처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 학생들을 자주 본다.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고, 사뭇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뚱하기도 하다. 다양한 모습이지만 10대 특유의 미숙함과 순박함, 언제라도 툭 불거질 것 같은 장난기를 장착한 건 누구라도 같다. 그래서 예쁘다.
국립중앙박물관 3층 조각·공예관에 나란히 전시된 불두(佛頭) 세 점에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완연하다. 특히 가운데 자리잡은 부처는 볼과 턱에 적당히 살이 올라 복스러운 얼굴에 눈과 입의 웃음을 더해 소년미가 완연하다. 10세기 고려 때의 불상이다.

불상은 아니지만 일본의 ‘하니와 비늘 갑옷을 입은 무인’(무인 하니와) 5구는 소년미도 볼 만하다. 하니와는 고대 일본 특유의 대형 무덤인 ‘전방후원분’ 주변에 두었던 조형물이다. 무덤의 주인인 최고지배자의 지켜주는 존재다. 그래서인지 10대의 얼굴임에도 어딘지 처연하고 비장하다.
지난해 도쿄국립박물관은 특별전 ‘하니와’을 열어 도쿄, 군마현, 지바현, 나라현과 미국 시애틀미술관의 5구 모두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았다. 가장 인기를 끈 전시물이었다.

◆섹시한 중년, 관음
불·보살상을 두고 섹시를 운운하면 불경스럽다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들이 있다. 윤왕좌(輪王坐), 유희좌(遊戱坐)의 보살상이 꼭 그렇다. 윤왕좌는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 그 위에 오른손이나 팔꿈치를 올려 놓고, 왼손은 곧게 내려 지면을 지탱하는 자세다. 불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한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자세다. 유희좌는 윤왕좌와 비슷한 데 한쪽 다리를 대좌 밑으로 곧게 내리고 있어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윤왕좌 보살상의 대표다.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에 전시 중이다. 보관이 높고 화려하고, 몸 전체에 장신구를 걸쳤다. 신체도 육감적인 매력이 또렷하다. 원간섭기(13세기 후반∼14세기 초) 고려에 유입된 티베트 불상의 영향을 읽을 수 있는 요소라고 한다.
금박이 벗겨져 까매진 얼굴은 섹시함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겠으나 금색 몸통과의 대비가 강렬하다.

유희좌인 일본 야마토분카간 소장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섹시함도 못지 않다. 수월관음도는 측면을 잡은 것이 많은 데 야마토분카간 수월관음도는 관람객을 응시하듯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특이하다.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고 있어 말을 걸려는 듯한 느낌도 든다. 가늘게 뜬 눈, 세련된 수염, 날씬한 몸매는 ‘간지나는’ 중년의 남성을 떠올리게 한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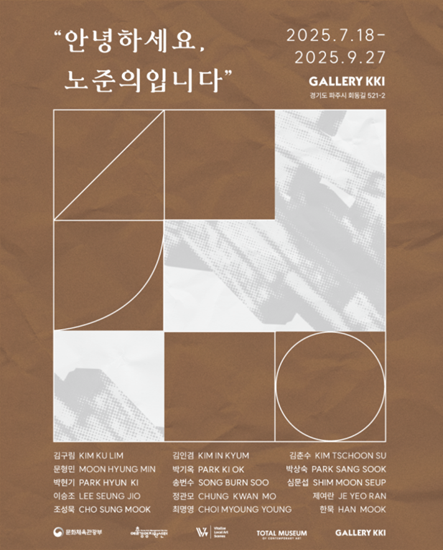

![[아침보약] 안 괜찮아도 괜찮아](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0569529604_0a539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