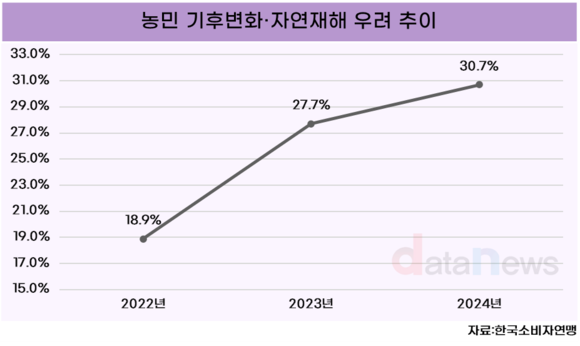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쌀 생산 감축을 골자로 한 쌀 산업 개편 대책이 영농 현장과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윤곽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고품질 쌀 생산체계 전환’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재배농가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면적을 줄이도록 하고, 그 이행을 직불금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고품질 쌀 생산체계 전환은 다수확 품종 대비 수량이 적은 고품질 벼 재배를 늘려 생산과잉을 막고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양정당국은 연말쯤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고질화된 쌀 과잉구조를 사후 ‘시장격리’가 아니라 사전 ‘생산 감축’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는 양정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대한 ‘각론’ 차원의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8만㏊ 벼 재배면적 감축부터 그렇다. 이는 올해 재배면적(69만7713㏊)의 11.5%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기본직불금 수령 농가만 대상으로 해 여기다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농가를 포함하면 감축면적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벼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론적으로는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고, 상승한 가격이 생산량 감소분을 메워준다는 것인데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생산량이 급감하면 쌀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 눈치를 보는 물가당국이 밥쌀용 수입쌀을 늘리거나 비축미를 방출하는 등 쌀값 안정에 나선다면 결국 벼 재배농가만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고품질 쌀 생산체계 전환도 마찬가지다. 농가들은 당위성인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크다. 고품질 생산체계는 수량보다는 품질 중심의 양정체계로 전환을 의미하지만 낮은 품종 브랜드화와 겉도는 쌀 등급제 등 현장은 정책 의지와 거리가 너무 멀다. 농가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더라도 가격 차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김대중정부에서 시작된 고품질 쌀 대책이 2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결국 생산감축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정책과 현장 사이의 온도차를 만들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정밀하고 촘촘한 쌀 산업 개편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