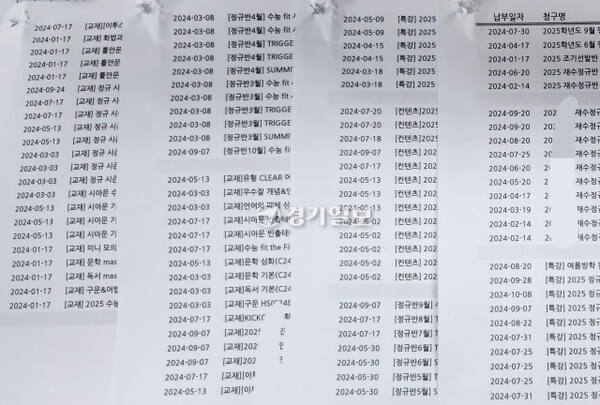김길웅, 칼럼니스트

취직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초조할 것이며, 군대 간 아들의 첫 휴가를 손꼽아 가며 갓 쉰에 이른 젊은 엄마의 기다림은 얼마나 애탈까.
호사스러운 기다림도 적잖다. 가을 타는 소녀는 바람에 잎이 구르기를 기다리고, 멋진 코트를 꺼내 입고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눈 펑펑 쏟아지는 겨울을 기다리는 중년도 있을 것이다. 오래 고향을 등진 사람은 환향의 그날을 학수고대할 것이고, 아담한 집 한 채 이고 살아봤으면 하는 사람은 우연만 해 읍내에 조그만 마당이 있는 집 지을 날을 ‘바를 正 자’를 채우며 기다리고 기다릴 것이다.
사랑하는 혈육이 실직으로 방황할 때, 직장 하나 생겼으면 하는 기다림은 이거야 죽을 맛이다.
지난해 봄부터 여름, 가을로, 시나브로 절기는 무르익어 가는데, “이곳이다.” 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앞뒤가 꽉 막혀 눈 둘 데라곤 없이 암담할 때, 이런 기다림 속에 끄집어낸 말이 하나 있다. 개연성이다. ‘머잖아 되겠지.’ 그렇게 상정해 놓는다. 하지만 그건 어림짐작일 뿐 될 듯 될 듯 되지 않는다. 어디 한 군데 문이 열릴 듯한데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가 개연성인데, 겪는 사람에겐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개연적 판단이라는 말도 쓰인다. 주개념(主槪念)과 빈개념(賓槪念)의 관계가 다만 가능하다는 사실만을 나타내는 판단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취업이 실현될 수는 있다’는 따위다. 어디까지나 ‘될 수 있다’다. 명료한 전망이 없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 아니,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양자를 절충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도 반반일 것 같은데 반일 수도 있고 반이 아닐 수도 있다.
상사화는 꽃이 진 뒤에야 잎이 돋는다. 꽃과 잎은 만나지 못한다. 둘에게는 만날 개연성이 없다. 꽃은 꽃대로, 잎은 잎대로 제 시절을 누리며 피고 진다. 만날 수 없음의 필연, 개연성이 배제돼 버려 필연인가. 연둣빛 순은 검푸른 암록의 빛을 띠며 낙엽의 계절로 진행한다. 자연의 법칙은 예외가 없다. 아침마다 연못은 긴장으로 설렌다. 밤새 잠에 곯아떨어졌던 수련이 배시시 꽃을 연다. 그 확실함, 눈 비비며 새벽이 오는 순간, 연못은 두근거린다. 으레 수련이 필 것을 알아 기다리고 있다. 그 정확성 앞에 숨을 몰아쉬는 것이다.
기다림, 그러나 그의 기다림엔 개연성이 없다. 새벽은 오게 돼 있었고, 수련은 피어나게 돼 있었다. 수련의 개화는 필연이다.
몇몇 제자에게서 희망적인 언질을 보내왔다. 이순이 목전에 이른 실력자들이다. 사제간의 추억이 살아날 것에 기대어 오랜만에 가슴이 뛴다.
“알아보겠다.” 혹은 “되지 않겠나.”라며 나를 고무시켰고, 나는 시종 기다렸다.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그보다 되지 않겠나 했으니까. 너끈히 보름쯤 지나면 잘될지도 몰라. 한 달이 지났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답이 오겠지….
기별이 없다. 그래도 기다린다. 개연성이 있으니까. 일이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시도 놓지 않고 있다. “알아보겠다.”, “되지 않겠나.”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있다. 그들을 믿어야지.

![[인터뷰] 격동의 역사 현장에서 앞섰고 다쳤고, 다시 일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이선호 위원장](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102/p1065616211538430_170_thu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