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노래 ‘아파트’(APT.)가 K팝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열린 MTV 비디오뮤직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 상을 받은 것이다. ‘강남스타일’로 전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싸이도, 글로벌 팬덤을 자랑하는 방탄소년단(BTS)도 받지 못했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노래의 인기 덕분에 국내에선 윤수일의 ‘아파트’가 발표 42년 만에 재소환됐고, 대표적인 콩글리시(한국식 영어)인 아파트의 의미 또한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됐다.
공포·스릴러의 배경 된 K아파트
영끌·층간소음 등 문제의 온상
집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로제의 노래에서 아파트는 젊은 남녀가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는 낭만적인 공간이지만, 한국 영화 속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 뒤틀린 욕망이 넘실대는 음습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모두가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꿈을 꾸고,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값을 지키기 위해 영혼마저 파는 ‘아파트 공화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공간적 배경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인간 군상의 욕망과 이전투구를 부추기는 또 다른 주인공처럼 그려진다.
지난 7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84제곱미터’ 덕분에 ‘영끌’의 의미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 원룸 보증금, 대출금, 중간정산 퇴직금에 어머니의 밭까지 팔아 장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지키기 위한 주인공의 눈물겨운 분투는 공개되자마자 전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년 전 개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드림팰리스’는 각각 대지진과 미분양이란 ‘재난’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거울처럼 비춘 작품이다.
지난해 개봉한 독립영화 ‘한 채’의 설정은 더욱 파격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두 가족이 위장 결혼을 하고 어색한 동거를 하는 스토리다. 아파트 한 채 장만하겠다고 과연 저런 짓까지 할까 싶지만, 위장 전입, 임신 진단서 위조, 허위 입양 등 아파트 청약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는 현실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영화 ‘럭키, 아파트’에선 노인이 고독하게 숨져갔음에도 주민들이 애도나 반성은커녕 아파트값 떨어질까 숨기기에 급급하다. ‘84제곱미터’ ‘백수아파트’ ‘노이즈’ 등의 영화들에서 층간 소음이 외부에 알려질까 주민들이 전전긍긍하는 것도 아파트값 하락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층간 소음이 공포·스릴러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된 건, 층간 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불화가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현실을 투영한다.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마지막 숙제’에서 초등학교 같은 반 아이들을 갈라놓는 건 민영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임대 아파트에 사느냐 여부다.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민영 아파트 통학로는 아이들 사이의 마음의 벽을 더욱 높게 만든다.
이쯤 되면 한국의 아파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도 모자라 온갖 불법도 서슴지 않고, 소통 없이 지내던 주민들이 아파트값을 지킬 때만 똘똘 뭉치는 나라. 로제의 ‘아파트’ 흥행 이면에 감춰진 우리의 자화상이다.
여기에 더해,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수난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올여름 살인적 폭염 속에서 어떤 아파트 주민들은 전기료가 아깝다며 경비실에서 선풍기를 치우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이러다 아파트 경비원의 한 서린 공포물까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영화 ‘한 채’의 주인공들은 범죄의 대가를 치르고서 아파트보다 더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집이 아니라 가족이란 사실이다. 영화의 영어 제목이 ‘하우스(house)’가 아닌 ‘홈(home)’인 이유다.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아파트 브랜드 광고 한 편이 삭막한 현실에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고단한 하루 일과나 여행·출장, 병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을 가족들이 반겨주는 내용의 광고다.
광고는 아파트의 럭셔리한 이미지, 호화로운 생활, 첨단 기능 같은 걸 과시하지 않는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애와 정(情)을 푸근한 선율의 배경 음악(김창완의 ‘집에 가는 길’)과 함께 비출 뿐이다. ‘오늘도 집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카피는 집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운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다.
“아파트가 무슨 죄야? 결국 사람이 문제지”라는 ‘84제곱미터’의 대사처럼, 문제는 아파트를 향한 그릇된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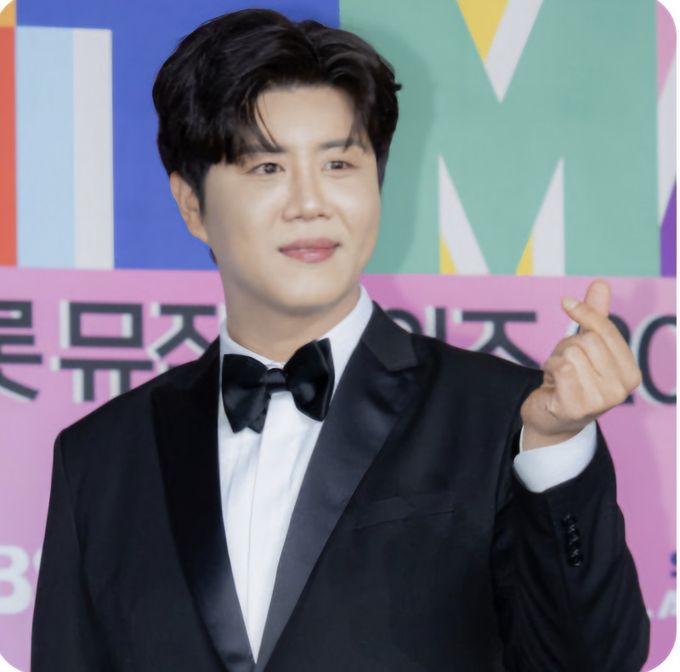

![[오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변해야 사랑이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8987262408_ee2f6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