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이모작 나선 중장년
‘경단녀’ 중장년, 내일센터 문 두드려
IT분야 진출 등 자신 역할 다시 찾아
생애 직장 떠난 뒤 직업훈련 평균 연령
2022년 55.8세서 2024년 54.9세로 줄어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와 소통법’ 강의를 듣는데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행동이나 말도 이젠 하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도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죠.” 소프트웨어 개발사 어니컴에 입사한 조혜은(47) 책임은 8년 공백 뒤 지난해 5월30일부터 다시 출근길에 나서게 된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입사 전 우려가 무색하게 그는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출근길에도 감사함을 되뇐다”며 “7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

2001년 충북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조씨는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거쳐 2010년 스마트폰 제조업계 2위였던 팬택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6년 차인 2016년 회사가 휴대폰사업을 축소하면서 조씨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나왔다. 구조조정 대상자로 퇴직하게 된 셈인데 이참에 5살 딸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40대 중반에 들어선 그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라는 꼬리표를 떼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고 싶었다고 한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 문을 두드린 이유다. 그는 앱 개발자 경력을 살려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MZ세대와 소통법’ 같은 소양교육도 이때 받았다. 그 뒤 재단과 연계된 기업인 어니컴에서 면접 제의를 받아 최종 입사에 성공했다.
40대 이상 대상으로 한 당시 프로그램에 조씨와 함께 교육을 받은 중장년 여성은 총 16명, 그중 11명이 어니컴을 포함한 5개 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업했다. 임은경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 책임은 “중장년 중에서도 여성은 정보기술(IT) 분야에 진입이 어렵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를 깨부순 성취”라고 했다.
실제 중고령(46∼75세) 여성은 생애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둔 뒤 경력 단절 기간(39.9개월)이 남성(4.9개월)보다 훨씬 길다. 한국퇴직자총연합회가 2023년 고용부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한 ‘고령퇴직자 재취업 및 직업훈련 욕구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퇴직한 46∼75세의 첫 번째 직장생활 시작 연령은 평균 24.3세였고, 이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의 퇴사 연령은 43.6세였다. 근속 희망 연령은 퇴사 연령보다 한참 뒤인 평균 72.7세로 나타났다.
조씨처럼 중장년에 접어들어 다시금 일하고자 하는 인구는 향후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3일부로 한국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다.

생애 직장을 떠난 뒤 새롭게 직업훈련에 나선 이들의 평균 연령은 어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폴리텍대학교 신중년특화과정 입학생들은 평균 54.9세로 2022년 55.8세, 2023년은 55.1세에서 매해 낮아졌다. 2차 베이비부머가 지난해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 가운데 미리 ‘인생 후반 직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병주(66)씨도 두 번째 직업을 위해 배움에 뛰어든 중장년이다. 23학번으로 한림성심대 바리스타제과제빵과에 입학한 이씨는 이달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씨는 1978년 고등학교 졸업 뒤 45년 만에 학생으로 돌아가 누구보다 치열한 2년을 보냈다고 밝혔다. 입학은 바리스타제빵과로 했지만, 그가 취득한 자격증은 전통주, 수제 맥주, 와인 소믈리에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종류만 14개에 달한다.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 덕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매일 아침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수업 중간 쉬는 시간이면 무조건 빈 강의실을 찾아 들어가 하루 100개 스쿼트를 채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씨도 조씨와 같은 ‘경단녀’였다. 남편과 함께 출판 사업을 했던 그는 39살에 셋째 아들을 임신하면서 세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양육에 전념키로 했다. 그는 “딸 둘을 키우며 일하는 건 괜찮았는데 세 명부터는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해 그 길로 아이만 키웠다”며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니 내 일을 다시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바리스타의 세계에 마음이 뺏긴 그는 배움이 너무 즐거워 전문대 입학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이씨는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한눈에 답이 싹 보일 때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회상했다. 카페 창업을 목표로 입학한 그는 시간을 두고 바리스타로 취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재미’를 동력으로 삼는 건 조씨도 마찬가지다. 그가 받는 연봉은 8년 전과 비교해 70%에 그치지만, 업무 만족도는 훨씬 더 높다는 설명이다. 8년 전 직장에서 업무에 치일 때마다 여느 직장인들처럼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곱씹던 그는 이제 ‘누구보다 오래 일하고 싶다’는 새 목표를 갖게 됐다.
조씨의 업무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QA) 서비스다.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쓸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지 등을 검사하는 일을 한다. 그는 “예전에는 일해야 하니까 억지로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일을 오래, 더 잘하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공지능(AI) 용어 등을 공부한다”며 “공부와 일이 연결되니 너무 재밌다”고 부연했다.
조씨가 바라는 건 본인 또래 여성들이 다시금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는 “주변에 아이 학부모들만 봐도 ‘저 경력에 왜 집에 계시지’ 하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내실화가 더 이뤄지고 홍보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 참여 유인도 확대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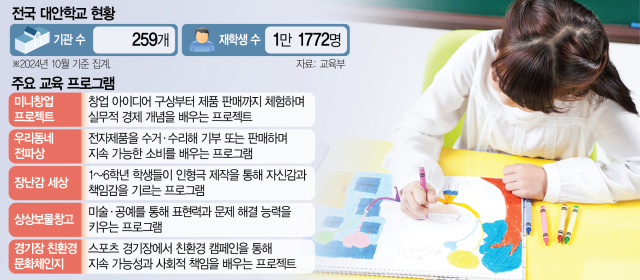


![[소년중앙] 질풍노도 청소년기 기쁨·불안·설렘·짜증 속 마음건강 지키려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4adbc576-d401-4e15-9647-983392a727c9.jpg)
![[단독]아픈 엄마-두살 동생 돌보는 초1 유진이...이런 아이 2.4만명 ['어린 가장'의 눈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1e4b6994-94b6-496b-97cb-23a55f2f2396.jpg)